
멀리 스웨덴 노벨위원회에서 날아온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대한민국을 온통 축제 분위기로 만들며 ‘한강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K-문학이 K-팝, K-푸드, K-드라마 등 이른바 ‘K-컬처’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의 반석 위에 올려진 대한민국 문화적 영향력은 이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또 다른 노벨 경제학상 소식이 한국을 재조명하고 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정치·경제 제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대런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 교수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에게 수여된다. 수상자들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공동연구에서 남한의 경제적 성공이 북한과 달리 ‘착취적 제도’가 아닌 ‘포용적 제도’를 발전시킨 결과로 분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연구의 핵심은 권위주의적 독재를 통해 다른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특정 계층의 배를 불리는 ‘착취적 제도’가 아닌,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적 재산권 보장과 민주주의 등 ‘포용적 제도’가 정착된 곳에서 한 국가의 성공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포용적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재능에 걸맞은 직업과 소명을 추구할 자유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에서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포용적 제도가 지배하는 곳에서 창업 기회와 노동 생산성 확대는 가시화되며 ‘창조적 파괴’를 통한 기업의 혁신은 배가된다.
그렇다고 포용적 경제 제도가 모든 이해 관계자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한정적인 자원과 소득을 쟁취하기 위한 당사자 간 이해와 권력 갈등은 필연적으로 있기 마련이다. 결국 누가 이 갈등의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운명은 결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권력이 얼마나 착취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 또한 갈리게 된다. 특권층을 위한 착취적 체제는 열린사회(The open society)를 거부하는 ‘적’이다. 그래서 다원적 권력 분산이 구조적으로 닫힌사회(The closed society)에서 한 나라의 성장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에서 칼 포퍼(Karl Popper)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은 포용 사회의 철학적 사유와 연결되어 있다. 포퍼는 인류 문명의 전개 과정을 ‘열린사회’와 ‘닫힌사회’ 간의 충돌과 투쟁의 역사로 파악하고 있다. 열린 사회는 전체주의와 대립하는 개인주의 사회이며, 사회 전체의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차적, 부분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점진주의 사회이다. 이와는 반대로 닫힌사회는 국가가 시민 생활 전체를 통제하며 개인의 판단이나 책임을 무시하는 사회이다. 포퍼는 열린사회를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사회라고 정의하면서 전체주의적 닫힌사회를 경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지만, 작금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상황 악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의 덫이 되고 있다. 민생을 위한 합의와 토론보다는 국민을 이념적 지형으로 갈라치기 하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하는 불통과 독선의 정치가 마치 닫힌사회로 회귀를 조장하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라는 포퍼의 외침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다. 우리 모두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합리적 토론과 타협이 가능한 포용적 열린사회가 진정 언제나 다시 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낙관<독일 쾰른대 사회학박사/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로터리]문화주도성장을 말하기 전에](https://newsimg.sedaily.com/2024/10/30/2DFRQ4VGT1_1.jpg)
![[ET대학포럼] 〈194〉대전환의 시대, 산업기술정책과 산업 R&D의 임무](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30/news-p.v1.20241030.52f8799aa8eb4be5b7c74aa3af62c75a_P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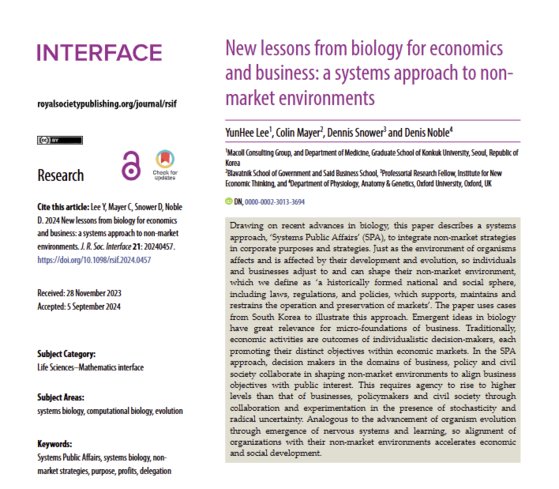

![“韓 자동차 관세 철폐로 수출 탄력 … 니켈 中의존 해소 기대” [2024 세계아세안포럼]](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0/2024103051611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