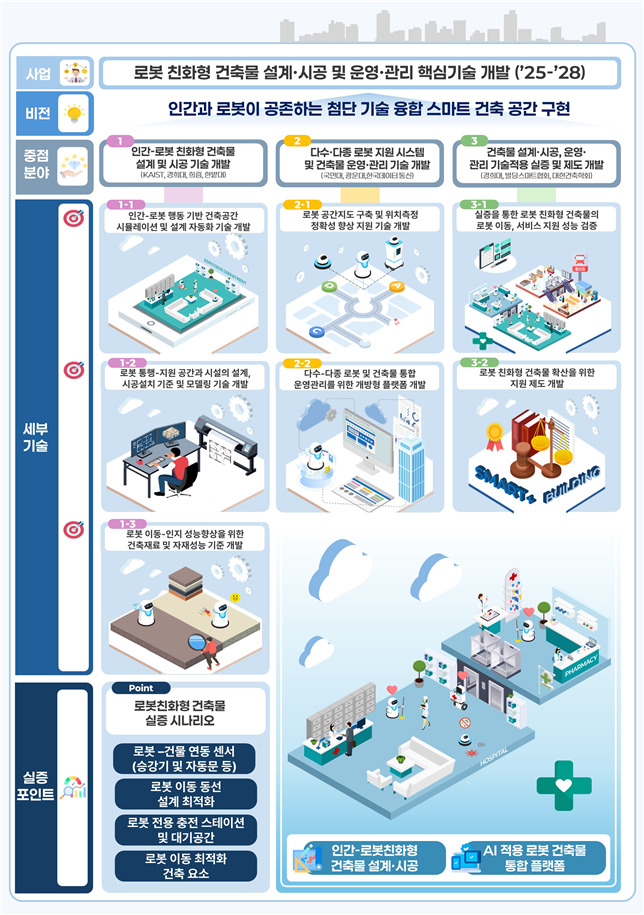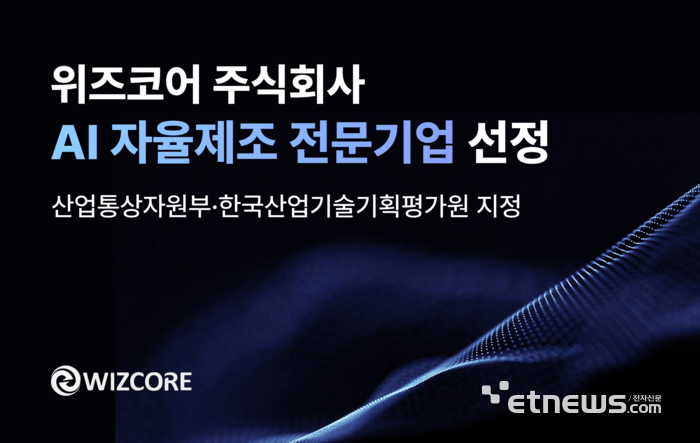정부가 올해 시행 5년차를 맞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인공지능(AI) 분야 등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중심을 벗어나 AI까지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면서 공공 내 다양한 디지털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은 2020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공공에서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신기술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도입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서비스형 인프라(I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클라우드 주요 서비스 공공 도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제도 시행 후 이 시스템을 이용한 공공 내 클라우드 도입도 증가했다.
2020년 10여개에 불과하던 등록 서비스는 최근 기준 600여건까지 늘었다. 이들 서비스를 채택한 공공의 계약건수도 1800여건에 달하고, 계약금액은 6000억원(누적)을 넘어섰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이 본격 자리잡기 위해 올해 여러 개선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AI 서비스 등록 확대를 유도한다.
현재 AI 서비스는 SaaS 서비스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선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받아야 한다. AI 기능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다보니 CSAP 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을 꺼리는 AI 기업이 있다.
정부는 AI 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원할 경우 SaaS가 아니라 '융합서비스' 항목에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CSAP를 받지 않는 대신 꼭 필요한 보안 요건 등을 마련해 이를 준수할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시범 도입 단계인만큼 이 과정에서 발견된 보안 추가 조치 사항 등도 살펴봐 하반기 본격 시행 전에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AI 서비스 등록이 이어질지 기대된다.
현재 이용지원시스템 내 SaaS 서비스는 160여개 등록됐지만 AI 서비스는 11개에 불과하다. AI 관련 다양한 서비스가 등록될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한 공공 내 AI 민간 서비스 도입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밖에 선정 심사 기간 단축과 확산을 위한 관련 조치도 이어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서비스 등록 시 기존에는 평균 50일 기간이 소요됐지만 최근 선정 심사항목을 정비해 절반 이상 단축시켰다”며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요건에서 지식재산권 요건을 삭제하는 등 더 많은 서비스가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관련 개선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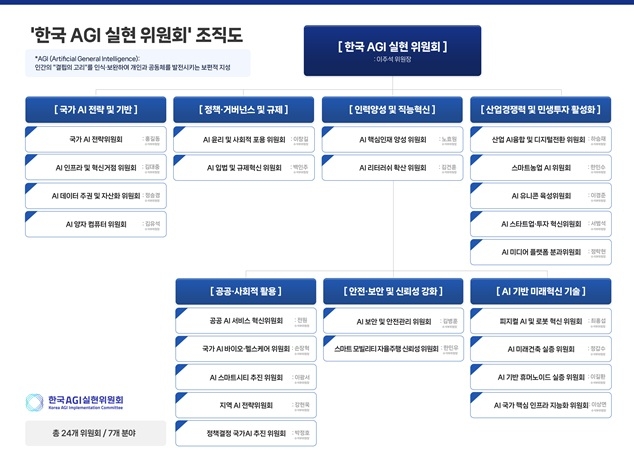

![[에듀플러스]북아이피스,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 사업 2년 연속 선정](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7/news-p.v1.20250527.f56bbc5cf12f4e1894c9e2dd31475518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