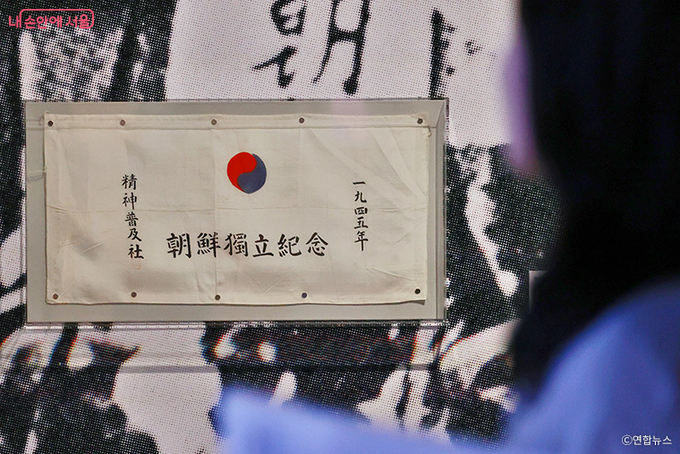희정당, 대조전, 경훈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덕궁의 내전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부부인 순종과 순정효황후가 생활하던 공간이다. 이곳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된 후 3년 간의 공사를 통해 재건됐는데, 이 때 전각 내부 대규모 벽화가 함께 제작됐다. 여섯 명의 화가가 전통적인 궁중화법으로 너비가 최대 8m가 넘는 기념비적 대작을 그렸다. 눈에 띄는 부분은 조선시대 궁중화가들과 달리 ‘근사(謹寫)’ 즉 ‘삼가 그려 올린다’는 표현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남겨 화가로서 개인을 드러내는 근대적 면모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14일 개막하는 <창덕궁의 근사謹寫한 벽화> 특별전에서는 근대 화단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그럴듯하게 괜찮은’ 창덕궁 벽화 6점이 처음으로 일괄 공개된다.
이번에 한데 모은 그림들은 높이가 각각 180~214cm, 너비가 각각 525~882cm에 달하는 대작들로, 크기 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벽에 직접 그린 것이 아닌 비단에 그린 후 종이로 배접하고, 이를 벽에 부착한 ‘부벽화(付壁畵)’이다. 각 건물의 대청 동쪽과 서쪽 벽 상단을 가득 채워 위엄과 아름더움을 더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이들 벽화는 100여년 동안 내전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세월의 풍파를 겪었다. 국가유산청은 벽화를 떼어내 2014년 대조전 벽화, 2016년 희정당 벽화, 2023년 경훈각 벽화의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원본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각 내전 전각에는 모사본과 영인본을 설치했다.


순종의 접견실이었던 희정당 벽화 ‘총석정절경도’와 ‘금강산만물초승경도’는 한국 최초의 사진관을 운영하기도 했던 해강 김규진(1868~1933)이 그렸다. 그가 직접 금강산을 유람하며 그린 밑그림(스케치)을 바탕으로 그려낸 대작이다. 금강산은 궁중회화로서는 새로운 소재인데,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영험한 산으로 여겨지면서도 일제에 의해 관광지로 활발히 개발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다.


왕과 왕비가 거처하는 내전의 중심 공간인 대조전 동쪽 벽에는 정재 오일영(1890~1960)과 묵로 이용우(1902~1952)가 합작한 ‘봉황도’와 황제의 어진화가로 발탁되었던 이당 김은호(1892~1979)가 그린 ‘백학도’가 마주보고 있다. 태평성대와 부부의 화합을 상징하는 봉황과 십장생 중 하나인 학은 궁중회화의 단골 소재였다. 전시에선 김은호가 ‘백학도’를 구상하며 제작한 ‘백학도 초본’도 최초로 공개된다. 이들은 1911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미술교육기관인 서화미술회 출신으로, 조선왕조 마지막 화원 화가였던 심전 안중식 등으로부터 전통 화법을 배웠다.


휴식처인 경훈각을 장식한 심산 노수현(1899~1978)의 ‘조일선관도’와 청전 이상범(1897~1972)의 ‘삼선관파도’ 역시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다. 역시 안중식의 제자였던 이들은 속세를 벗어난 신선경을 묘사했다. 장수를 상징하는 선계의 복숭아와 거북을 든 동자, 서로 나이를 자랑하는 세 명의 신선들이 등장하여 황제 부부의 장수와 평안을 기원하는 그림임을 알 수 있다.
벽화를 감상한 뒤에는 미디어아트 ‘근사한 벽화, 다시 깨어나다’를 통해 금강산의 절경과 봉황과 백학의 상서로운 날갯짓, 영생을 누리는 신선의 세계를 실감 영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전시는 10월1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