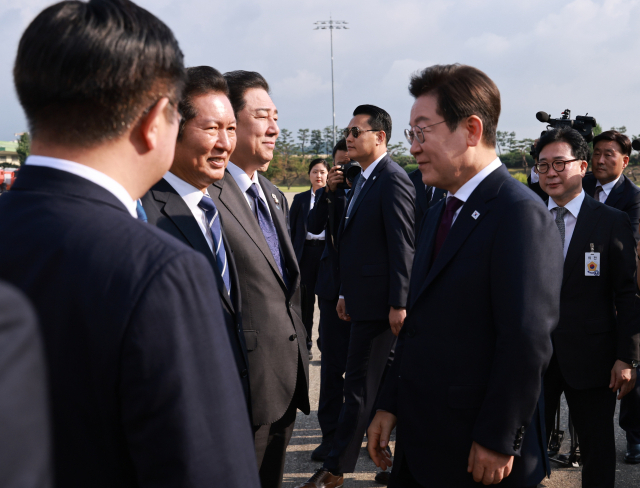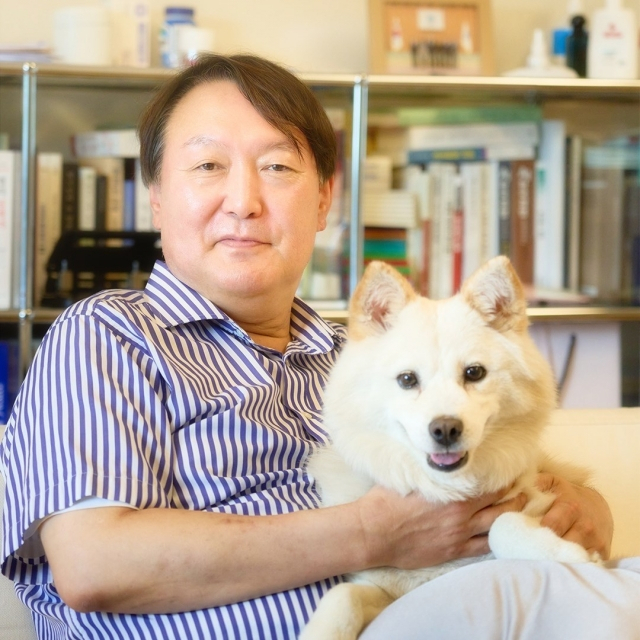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포츠 무대를 정치 연장선으로 활용하며 세계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추첨 행사를 워싱턴 D.C. 케네디센터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제축구연맹(FIFA)과 밀월이 드러났다. 미국프로야구(MLB)·UFC·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도 그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5일 디애슬레틱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대중 장악”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정치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 사이에서 미국 스포츠계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원래 월드컵 월드컵 조추첨의 유력 개최지는 라스베이거스였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도 추첨 행사가 열린 상징적인 무대였고, 미국축구협회와 개최 도시 관계자들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최종 발표는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FIFA 잔니 인판티노 회장과 함께 “추첨은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현재 케네디센터 이사회 의장이다. 그는 ‘반(反)미국적 공연은 없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이사 18명을 교체했고, 자신의 참모와 측근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심지어 공화당 일각에서는 케네디센터를 ‘트럼프센터’로 개명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트럼프의 스포츠 활용은 월드컵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취임 이후 대통령 체력검정(피트니스 테스트) 부활과 함께 스포츠·영양·체력 위원회를 재가동하며 정책 차원에서도 스포츠를 전면에 세웠다. ‘움직이지 않는 미국 청소년을 깨운다’는 명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위원회 구성원이 WWE 스타 트리플 H, 골프 선수 브라이슨 디섐보, 아이스하키 커미셔너 게리 베트먼 등 트럼프와 친분 있는 인사 위주라는 점에서 정치적 색채가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는 피트 로즈 명예의 전당 입성 논란에도 개입했다. 1989년 도박 스캔들로 영구추방된 로즈가 사망 후에도 복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MLB가 규정을 바꾼 배경에는 트럼프와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의 백악관 회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언론은 이번 월드컵을 두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월드컵’이라 부른다. 추첨 행사를 정치 연설 무대로 바꾸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국경 장벽·총기법 등 정치 현안을 늘어놓는 트럼프의 행보 때문이다.
트럼프의 스포츠 활용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지지자들은 “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단합과 애국심을 고취한다”며 긍정적으로 본다. 9·11 테러 직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야구장 시구처럼 정치와 스포츠가 어우러져 국민에게 힘을 준 사례는 미국 역사에 남아 있다. 비판적 시각도 많다. 스포츠가 정치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다. 백악관에서 클럽 월드컵 트로피를 직접 들어올린 장면, UFC를 백악관 잔디밭에서 개최하겠다는 발언, 프로 구단 명칭 논란에 개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스포츠 사회학자 해리 에드워즈 교수(UC버클리 명예교수)는 “정치와 스포츠는 늘 얽혀 있었지만, 트럼프 시대에 그 경계가 더욱 흐려지고 있다”며 “그의 접근 방식은 지지자에겐 힘을, 반대자에겐 불편함을 안긴다”고 평가했다. 디애슬레틱은 “2026년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FIFA가 함께 만든 거대한 정치 무대가 될 것 같다”며 “그 무대가 미국과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트럼프가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속보]트럼프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만남 기대"](https://newsimg.sedaily.com/2025/08/26/2GWRVVXBAY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