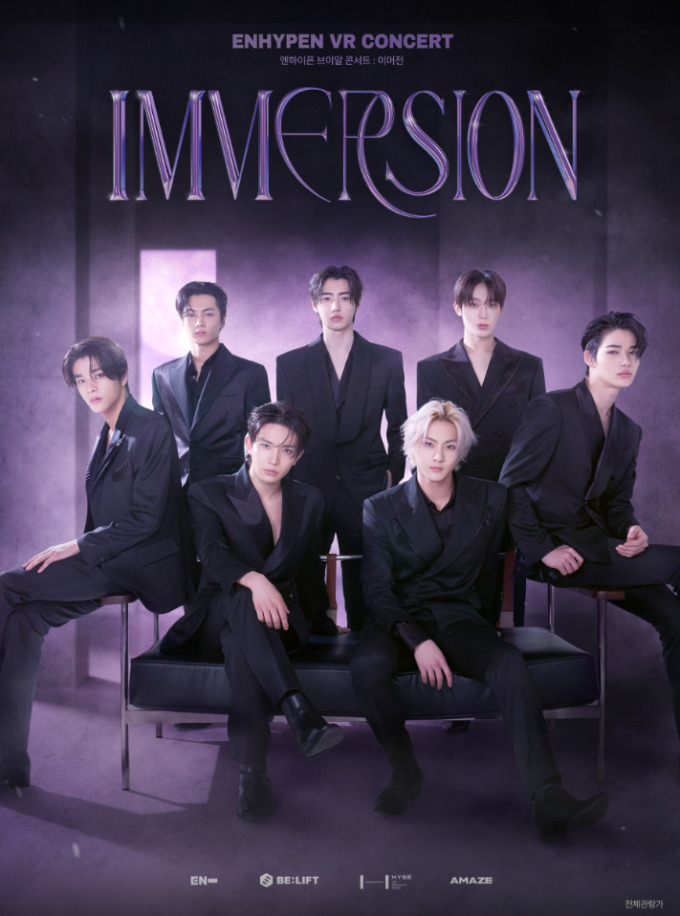미디어 프런티어: K를 넘어서

※ 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AI 오디오입니다.

여기저기 숏폼 관련 행사가 눈에 띈다. 드라마박스와 KT는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 중이고, 중앙 차이나랩도 드라마박스와 워크숍을 진행한다. 미디어 관련 행사라면 어디나 숏폼 관련 내용이 한 꼭지는 들어가 있을 정도다.
이런 관심의 결과일 거다. 지난 6월 국내에서 제작한 숏폼 드라마 ‘구미호, 운명의 짝’이 세계 1위 숏폼 드라마 플랫폼인 릴숏(ReelShort)에서 2억 뷰를 달성했다. 통상적으로 1억 뷰 정도면 손익을 맞출 수 있는 시장이니, 제작비 대비 상당한 수익성을 확보한 셈이다.
그런가 하면 ‘안녕, 오빠들’은 글로벌 차트 주간 1위를 기록했고, ‘19 어게인’이나 ‘나의 시크릿 파트너’의 경우 일본 숏폼 드라마 전문 플랫폼, 칸타(Kanta)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오늘도 바람 드는 당신은 불타오른다’의 경우는 일본 숏폼 드라마 플랫폼인 범프(Bump)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데 모두 외국 플랫폼이다. 숏폼에서도 한국 콘텐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 성과를 보이는 모양이지만, 국내에선 실감이 되지 않는다. 여기저기 세미나장에서만 성공비결을 논한다.

그러다 보니 호기 있게 시장에 진입한 국내 숏폼 드라마 플랫폼은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크래프튼이 1000억원대를 투자해 시작한 비글루를 비롯해서 여러 숏폼 드라마 플랫폼이 2024, 2025년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중국의 숏폼 드라마 시장이 수조원대의 시장으로 성장했다는 점, 북미에서도 열리고 있다는 점이 그들에겐 청사진이었다.

한국 시장이 아직 유료 숏폼 드라마를 수용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애당초 글로벌을 선언했다. 마치 국내 시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처럼 자막과 더빙 그리고 북미 오리지널을 만들 것이라고 호기 있게 외쳤었다. 진입을 고려하는 이들도 최소한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래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그들이 한국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내심 조만간 한국 시장도 중국과 미국처럼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했기에 콘텐트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급했다. 플랫폼은 글로벌을 지향하는데, 제작은 국내 사업자다. 뭔가 엇박자다.
돈이 그나마 몰리고 있는 건 분명하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플랫폼을 해보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그렇다곤 해도 이상하리 만큼 숏폼 드라마 붐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네이버와 다음도 슬그머니 시장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들은 무료다. 왜 이럴까?
![[기자수첩] '케데헌' 글로벌 인기…토종 OTT, 해외 진출 시급하다](https://img.newspim.com/news/2025/08/26/2508261031229680.jpg)




!['귀칼' 180만 관객 돌파…애니플러스 주가는 '무한 롤러코스터'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8/26/2GWRXIZRN3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