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앗은 많지만 꽃은 드물다.”
우리나라 공공 연구개발(R&D) 성과를 두고 흔히 하는 말이다. 세계적 수준 역량에도, 공공 R&D는 논문과 특허라는 씨앗에 머물러 있다. 매년 수십조원 예산이 투입되지만 씨앗이 정작 시장이라는 밭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씨앗 부족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심고 가꾸어 줄 정원사의 부재다. 이제는 우수한 기술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을 산업적·사회적 가치로 길러내고 글로벌 무대에서 꽃피우도록 돕는 새로운 손길, 바로 '기획형 창업'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특히 딥테크 분야는 막대한 초기자금과 긴 검증 기간이 필요해 일반적인 액셀러레이터 모델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방향을 '발굴'에서 '기획' 중심으로, '지원형'에서 '집중형'으로 바꿔야 한다.
최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R&D 예산 투자와 연구생태계 회복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2026년도 정부 R&D 투자 배분 역시 기초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술이 현장에 쓰이고 시장을 바꾸는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공공기술의 기술사업화·창업지원 강화에 적극 투자를 예고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도 '세계를 이끄는 초혁신경제'를 내세우며 초 혁신 아이템에 예산·인력·조직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벤처투자 저변 확대와 중소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핵심 산업과 프로젝트에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공공기술사업화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기획형 창업의 체계화와 정책적 확산이다. 공공 연구성과를 기술이전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 가능성과 글로벌 진출 전략을 연구기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R&D 예산 기획 시 이러한 기획형 창업 요소를 평가 기준에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사업화 연계 지원이나 후속 예산 매칭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실질적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R&D와 투자의 연계 강화다. 창업 초기 3~5년은 시장 안착을 좌우하는 시기다. 이 기간 R&D 지원과 투자금을 통합한 성장자금 풀을 조성해야 한다.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초혁신 스타트업 집중 육성과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이를 실현할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글로벌 실증과 판로 확보다.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는 창업은 한계가 있다. △해외 인증과 실증 기회 조기 제공 △AI 인프라 확충 △규제샌드박스와 특구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메가특구 도입 등을 검토·추진함으로써 기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가치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연계다. 공공기술사업화는 단순 재무성과를 넘어 환경·안전·복지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ESG 요소를 참고·반영한 창업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실험실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성장은 시장에서 완성된다. 이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신속 사업화 총력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 정책 방향과 기술사업화 전략이 결합할 때, 딥테크 기반 스타트업을 신속하게 발굴·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 안착시킬 힘을 얻을 것이다. 공공기술사업화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결정적 열쇠다.
윤기동 한국과학기술지주(KST) 창업기획본부장 kdyoon@kstholding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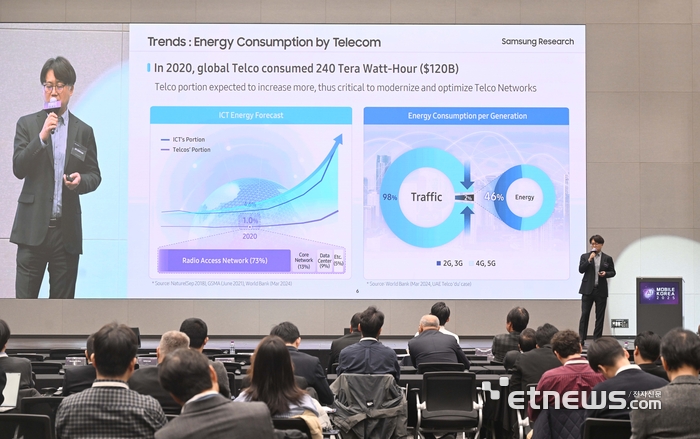

!["中 허페이市 따라 주식 사라"…5.5배 수익 낸 지방정부 실력 [창간 60년-中혁신 리포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7/1d4bcbc9-52dd-4a03-b64f-adc4e3da269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