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이 급격히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소비자 감시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친환경’이라는 마케팅 문구만으로는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과장된 문구를 앞세우던 그린워싱(Greenwashing) 관행이 비용 리스크로 드러나며, 기업들은 홍보보다 ‘운영 시스템’부터 손보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컬리 등 주요 유통사는 포장재 감축, AI 기반 수요 예측, 물류 에너지 효율화 등 눈에 보이는 변화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ESG를 ‘비용’으로만 보던 시각이 ‘운영 효율’과 ‘리스크 방어’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롯데그룹은 조직별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롯데칠성은 무라벨 생수 등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제품을 늘리고, 롯데마트는 협력사 대상 친환경 포장 전환 지원을 확대하며 ‘보여주기’ ESG를 줄였다.
신세계·이마트는 대형 점포 중심으로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과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를 진행 중이다. 기존 점포의 냉난방과 조명부터 바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ESG를 운영 비용 절감과 직접 연결한다.
이커머스 업체는 ‘포장재’가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다. 새벽배송을 진행하는 컬리는 스티로폼·비닐 대신 종이 포장으로 전환하고, 박스·아이스팩 회수 시스템을 도입해 순환 체계를 만들었다. 빠른 배송 구조에서 과도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친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 유지율을 좌우하는 호감도 요소이기 때문이다.
업계가 ESG 전략을 서둘러 재편하는 데는 규제의 압박이 크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는 ‘친환경’ ‘무해성’과 같은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면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2026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포장재 사용량, 탄소 배출량 등 구체 수치를 드러내야 한다. ESG 등급이 떨어지면 투자 비용이 높아지고, 브랜드 신뢰 하락으로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마케팅은 오래 못 간다. 실체가 없으면 규제에 걸리든 소비자에 걸리든 결국 드러난다”며 “이제는 ESG를 비용이 아닌 운영 시스템, 물류 효율, 폐기율 관리 문제로 접근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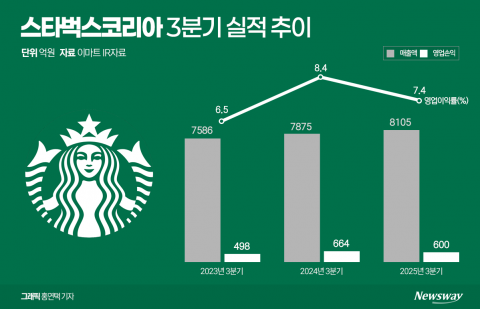



![[비즈 칼럼] ‘착한 기름’ 팜 산업이 지구 살린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586ed8b9-6589-4887-a5ab-a5fa3389c01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