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경상북도 어느 지역의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연수원장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다. 자기 지역의 모 지도자가 거짓 실적으로 포상을 받았다고 고발하는 편지였다. 사실관계보다도 나는 그 편지의 한 문장이 흥미로웠다. 원장에게 이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해 달라며 “선생님의 애국은 바로 각하에게 직언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 부분이다. 이는 신하의 충(忠)을 임금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바른길로 이끄는 간쟁이라고 보던 그 인식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다, 문득 500여년 전 정창손과 세종의 대화를 떠올렸다.
1444년(세종 26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일군의 집현전 관리들은 훈민정음 제작이 부당하다고 상소했다. 세종은 이 중 정창손의 말을 특히 문제 삼았다. “삼강행실을 반포해도 충신·효자·열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그 자질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라 한 발언이었다. 이전에 세종은 “삼강행실을 번역해서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쉽게 깨달아 충신·효자·열녀가 떼로 나올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정창손은 바로 이 말을 논박한 것으로, 그의 말을 쉽게 풀자면, “삼강행실 번역해봤자 소용없어요. 가르친다고 이 우매한 백성들이 충신·효자·열녀가 되겠습니까” 정도가 되겠다. 조선판 ‘백성 개돼지론’이랄까, ‘이기적인 국민’ 운운이랄까. 세종은 정창손의 발언에 “이것이 어찌 선비의 도리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질 선비다!”라며 격분했다.
격분할 만했다. 삼강행실도 반포 교서는 “하늘이 준 바른 덕과 진심, 그리고 천성은 생민이 똑같이 받은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모두 바른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세상이 어지러워져 그렇지 못할 뿐이니 이들을 계도할 책임은 위정자에게 있다, 이 책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는 게 이 반포 교서에 담은 뜻이다. 모든 사람이 바른 품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언설은 성리학의 대전제다. 기독교에서 인간에겐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랄까. 그런데 정창손이 이 대전제를 대놓고 무시했으니, 세종이 저질 선비라고 질타할 만하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는 믿음의 차원이다. 당대인들이 현실 세계에서 보는 하층민들은 밥상머리에서 부모를 패고서도 그게 잘못인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정말로 가르치면 충신·효자·열녀가 떼로 나온다고?
이로부터 200년이 채 되지 않아 외적이 침입하자 수많은 ‘의’병이 봉기했다. 300년쯤 지나자 열녀가 너무 많이 나와서 큰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다. 나라가 망한 후에도 사람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만주 벌판에서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저항을 이어나간 이들도 많았다. 1940년대 그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도 열차 화장실에 “하루빨리 천황을 죽이고 싶다”는 낙서를 남긴 중학생, 조선총독부 청사의 승강기에 “동포여 일어나라 대한독립만세” 같은 낙서를 남긴 승강기 운전수처럼 말이다. 위정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지니고 있었다. 1939년 평안남도의 한 30대 농부는 면화 공출을 설득하러 온 면서기에게 “황제가 나쁘면 국민이 고생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황제가 나쁘니까 전쟁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50여년 전, 시골 농부도 연수원 원장 같은 엘리트에게 “당신의 애국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의 의식을 갖췄다. 21세기 광장에 모인 이들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한다. 그런데 정작 정말 공부 잘했다는, 이른바 이 땅의 ‘엘리트’들은 직언도 못하고, 절개도 없고, 민주주의도 모른다. 그런 주제에 자기들만 세상 잘난 줄 안다. 세종의 말을 그대로 돌려줄까 보다. “이것이 어찌 엘리트의 도리를 아는 자들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질 엘리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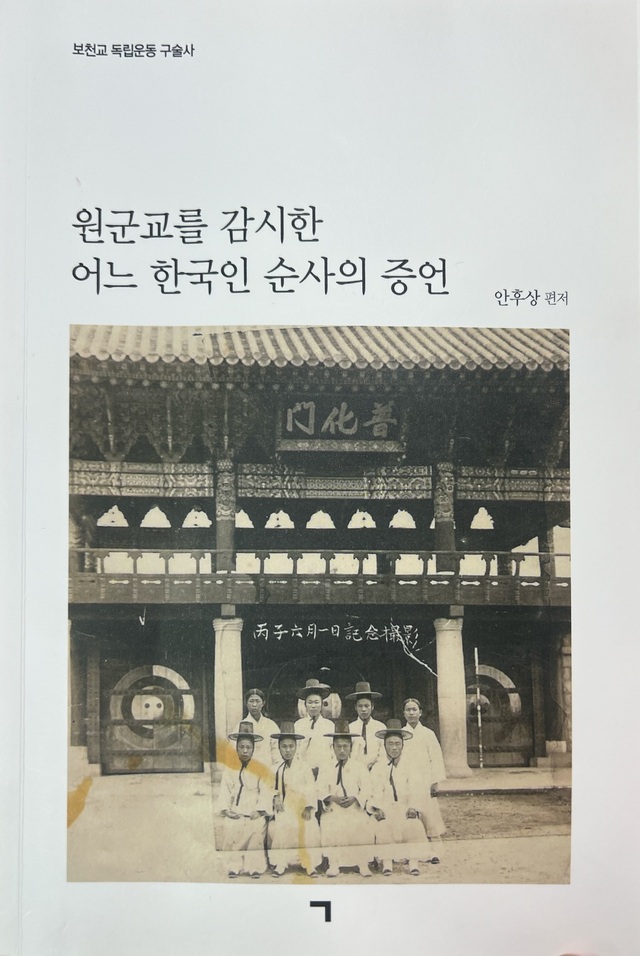

![[우리말 바루기] 푸르른 5월](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현장에서] 흔들리는 법관의 무게](https://img.newspim.com/news/2022/10/04/221004140350788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