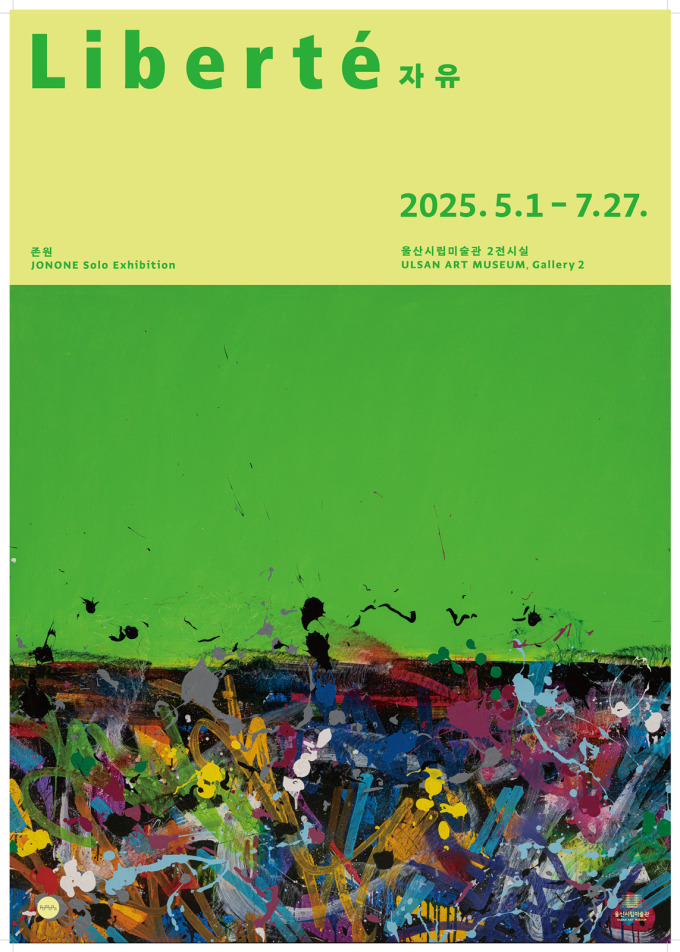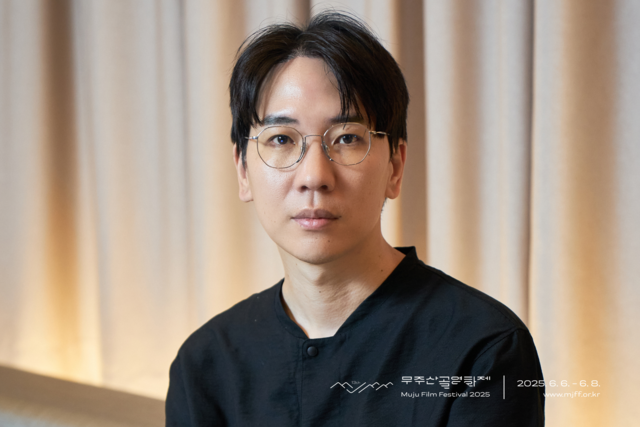막이 내려가며 무대를 전환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내려가던 막이 멈춘다. 막 아랫단과 무대 바닥의 공간은 불과 50~70cm가량. 무용수들은 막 바로 뒤로 다가와 플라멩코의 사파테아도(zapateado·발구름)를 춘다.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닥.” 무용수들의 무릎 위까지는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고 있고, 무릎 아래는 조명을 받아 하얀 다리와 검은색 슈즈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리듬을 탄다.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서울 역삼동 GS아트센터에서 열린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BNE)의 <아파나도르> 공연은 도입부부터 강렬하게 다가왔다.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무대 위는 물론 공연장 전체가 흑과 백으로 뒤덮인다.
‘흑백(black & white)은 언제나 옳다.’ 패션계에서 통용되는 이 말은 특히 사진, 영화 등 영상 예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빛과 어둠, 삶과 죽음 등을 상징하는 흑백은 그만큼 선명한 대조와 대비로 여러 예술의 사랑을 받아 왔다.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전통 춤인 플라멩코와 현대무용을 결합한 <아파나도르>는 콜롬비아 사진작가 루벤 아파나도르의 이름에서 제목을 따 왔다. 그는 플라멩코 무용수들과 무대 안팎을 찍은 흑백 사진집 <집시 앤젤>(2009)과 <천 번의 키스>(2014)를 낸 바 있는데,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안무가가 이 사진을 촬영하는 전후 상황을 무용으로 구현해 무대에 올린 게 이번 작품이다. 안무가는 혁신적인 실험과 독창적 안무로 유럽 공연계에서 각광받는 스페인 출신의 마르코스 모라우. 무용수 출신이 아닌 모라우는 연극적 연출과 환상적 이미지 구현에 독보적인 감각을 인정받는 안무가다. 2019년 한국을 찾아 국립현대무용단과 협업해 호평을 받은 <쌍쌍>도 그의 안무 작품이다.

다시 무대에는 사진을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구현된다. 빛이 카메라와 조명장치와 플라멩코 무용수를 거쳐 만들어 낸 그림자가 하얀 배경 위에 커졌다 작아졌다, 짙어졌다 옅어졌다 춤을 춘다. 그러다 장내가 암전되듯 어둠에 묻힌 상태에서 갑자기 빛이 비춰지면 실제로 공중을 가로지르는 섬광의 줄기가 보인다.

공연은 여러모로 대단히 전복적이다. ‘흑백’이 콘셉트라고 하지만 실상 빛과 무용수의 살갗을 제외한 나머지 의상, 소품, 무대장치 등은 거의 검정이 주를 이룬다. 발레에서 볼 수 있는 하얀색 토슈즈(발레 신발)와 튀튀(스커트 모양 의상)는 찾아볼 수 없고 굽이 있는 검정 구두와 검정색 치마 의상이 주된 의상이다. 전통적인 플라멩코를 상징하는 빨간색 또한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남성 무용수들이 검정 치마를 뒤집어썼다 펼쳤다 하는 동안 그 실루엣이 옷과 겹쳐지면서 뭉개지는 ‘블러’ 효과도 느껴진다.

공연의 백미는 시각예술과 무대 장치를 결합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대목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푼젤>을 연상시키는 듯한 여성이 3층 높이의 베란다에 뒤돌아 서서 긴 머리카락을 땅까지 늘어뜨리고 있고, 그 좌우로 누워있는 남성과 서 있는 남성이 등장한다. 이 사람들을 배경으로 컴퓨터 그래픽이 현란하게 결합한다. 무용수의 손이 ‘가위손’처럼 엄청나게 커졌다가 갑자기 수레를 끈다거나 하는 식으로 현란하면서도 신비로운 이미지를 연출한다.

생후 7개월에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주한 뒤 한국계 최초로 2019년 BNE에 입단한 윤소정(31)도 공연에 출연한다. 공연 중간 그가 연기하는 “다들 어디 갔어”와 같은 한국어 대사도 들을 수 있다.

지난 24일 개관한 GS아트센터는 장르간 경계를 없앤 ‘예술가들’ 기획 공연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아파나도르>는 GS아트센터에서 선보이는 모라우 3연작 중 첫번째 작품이다. 모라우 다음 주인공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각예술가 윌리엄 켄트리지다.

![[영상] 조여정-조보아, 인형이야 사람이야! ‘찐 미모 대전'](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18/art_1746058404195_3eeef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