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화곡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A씨는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보니 술자리가 잦은 편이라 아침 준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주말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점심은 주로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다. A씨는 “주로 혼밥을 하다 보니 주로 패스트푸드나 짜장면과 같은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다”면서 “저속노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서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전체 국민의 18%에 이르러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섭취 부족자란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량(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과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5명 중 1명은 영양섭취 부족자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데다 1인 가구가 보편화하고 있는 점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를 보면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01년 18.5%를 기록한 뒤 점차 줄어들어 2014년 8.4%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10년 17.4%까지 늘어났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21년 16.6%, 2022년 16.4%로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17.9%를 기록 1.5%포인트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큰 상황이다. 소득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2023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21.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늘었다. 5명 중 1명은 제대로 영양섭취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저소득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19년 21.8%에서 2020년 20.9%, 2021년 20.7%, 2022년 19.9%로 낮아졌지만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 상위 20%인 고소득층도 2020년 15.7%, 2021년 14.3%, 2022년 12.0%로 줄었지만 2023년 14.6%로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소년(12~18세)과 65세 이상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은 2020년 26.9%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23.6%, 21.0%로 낮아졌지만 2023년 27.5%를 기록,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고령층도 2020년 24.5%, 2021년 22.8%, 2022년 18.2%로 낮아지다 2023년 19.3%로 증가로 돌아섰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영양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비율이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20년 남성 20.7%, 여성 14.2%로 남녀 격차가 6.5%포인트 였다. 2021년에는 남성 19.9%, 여성 13.3%으로 조사됐고 2022년에는 남성(17.9%)과 여성(15.05)의 격차가 2.9%포인트로 나타났다. 2023년에도 남녀 격차는 2.9%포인트(남성 19.4%, 여성 16.5%)였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건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1인 가구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연구원은 고령자들은 신체활동 감소와 치아결손에 따른 저작 장애로 영양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1인 가구도 생활여건상 결식을 자주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국가통계연구원은 “국민 특성별 식생활 개선 및 영양 증진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일상 생활 속에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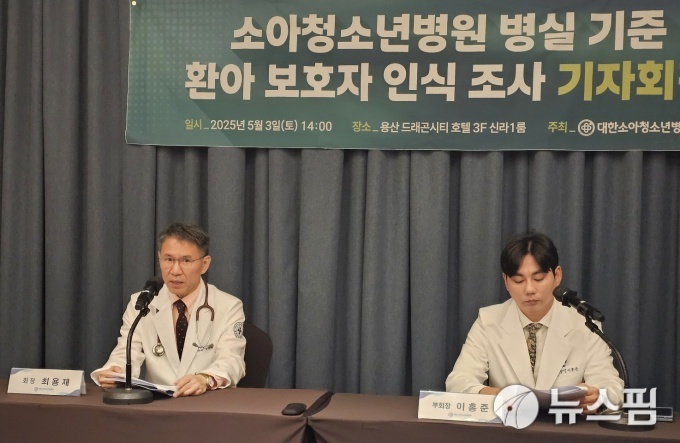

![“사는 게 문제다”… 육아하는 3040의 집 딜레마 [육아동네 리포트⑤]](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5129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