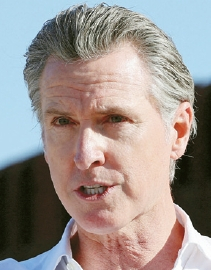마약 정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가 있다. 독일이다. 독일은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던 지난해 4월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했다. 1인당 대마초 25g 보유, 대마 3그루 재배는 합법이다. 단속이 어려우니 차라리 양성화하고, 행정력을 다른 강력 마약 단속에 투입하자는 계산에서였다. 독일인들답게 “대마초는 개인적 자유” 같은 고상한 논리도 곁들였다. 한국의 진보 언론들은 추앙하듯 소식을 전했다.
1년이 지나 성적표가 나왔다. 결과는 처참하다. LSD·합성마약 적발 건이 30~40%가량 급증했다. 음주 운전 대신 ‘대마 운전’이 사회 문제가 됐다. 1억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35.5t 규모의 코카인 거래도 발각됐다. 마약 암시장은 더 번창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1당에 오른 중도우파 기독민주당은 “대마초를 다시 불법화하겠다”고 별렀다. 그러나 사민당에 무릎을 꿇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놀라 연립정부 구성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민당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있다. 표가 돼서다. 대마 농장과 그에 얽힌 산업이 자라버렸다. “불법화는 재산권 침해”라고 아우성이다. 사민당 정치인들도 중독자들에게 여론전을 편다. 사회 실험 수준의 정책은 좌우 정당의 파워 게임으로 비약했다.
덩치를 키운 마약 조직은 수사 기관에 마수를 뻗쳤다. 독일 니더작센 주의 한 30대 검사가 수사정보를 마약 조직에 제공한 사실이 들통났다. 마약 조직에서 매달 5000유로(약 800만원)를 ‘월급’으로 받고, 성과(기밀누설)에 따라 보너스를 챙겼다. 기민당은 주 정부가 사건을 은폐했다고 비난했지만, 사민당이 이끄는 주 정부는 “검사 개인의 일탈”이라 일축했다.
독일의 마약 정책 실패사엔 교훈이 적지 않다. 진보적 가치로 위장한 마약 확산, 마약조차 표로 환산하는 정치 공학, 수사기관의 부패가 상승 작용을 일으켰다. 가장 큰 책임은 마약을 정치 이념화한 정치권에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독일의 뒤를 따라가는 것 같다. 야당은 마약 수사 예산을 통째로 깎고 어깃장을 놓는다. “마약범죄가 5년 사이에 불과 5배밖에 늘지 않았다. 정부가 왜 마약과 전쟁을 하느냐”고 따지는 국회의원도 있다. 검경은 마약사범을 잡고도 질타를 받을까 봐 마음 졸인다. 마약 단속과 수사가 정치 이념의 문제가 됐다.
몇 년 후 외신에서 이런 기사를 볼 것 같다. 첫 문장은 “마약 정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가 있다. 한국이다”로 시작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