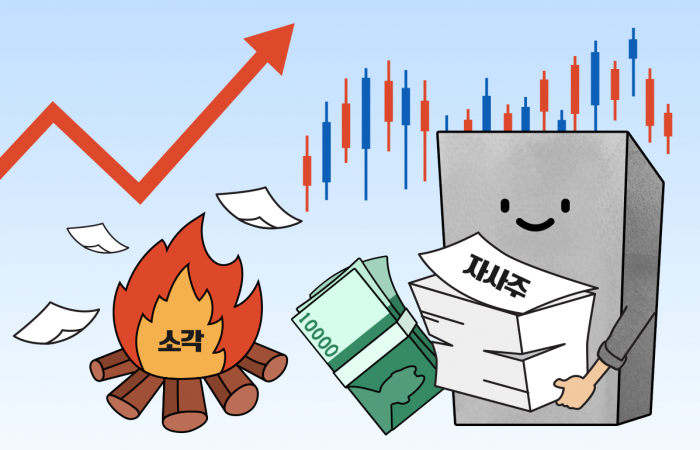
주요 금융지주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초점을 맞춘 주주환원을 강화해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 제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함으로써 일부 기업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들은 소각 시점이 강제되는 등 일률적 소각 제도화는 전략 운용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물음표를 띄우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6년까지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를 검토하는 등 추가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위한 상법 개정이 시장에 자리 잡도록 하고 주주이익 환원을 이끌어낸다는 의도다.
오는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비롯한 주주 환원 정책 등을 주제로 수차례 릴레이 토론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로 거론돼오자 정치권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한 것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자사주의 과도한 보유와 우호 세력에 대한 헐값 매각을 통해 주가가 하락하고 그 피해는 일반 주주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들은 그간 '밸류업 정책'을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주부양책에 집중해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지주들의 소각 규모도 두드러졌다. 대통령 선거 이후 이달 14일까지 신한금융지주는 1154만주(8000억원), KB금융지주 572만주(6600억원)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그간 금융지주들은 자사주를 매입하고도 시장 흐름에 따라 일정 기간 보유 이후 소각 또는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 매입 이후 주가 부양 효과와 소각 시 주당 가치 상승 효과를 끌어내는 주주환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소각 시점이 강제되는 등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금융지주들의 주주환원 전략에는 수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자사주 매입 이후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보유 기간을 조정하는 등 전략적 선택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소각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 금융지주들이 자사주 매입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 이후 유연한 운용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이 사라지게 된다"며 "특히 매입 이후 주가가 과열되거나 자본 비율 부담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단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소각 의무화가 경영권 방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경영권 방어 수단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추후 투기자본의 경영권 찬탈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PBR 묻자 구윤철 부총리 “10”…개미 분노에 기름 끼얹었다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6IUXPJ_1.jpg)

![[국정운영 세부계획] '코넥스-코스닥-코스피' 기업성장단계별로 대수술](https://img.newspim.com/news/2024/07/25/24072515034247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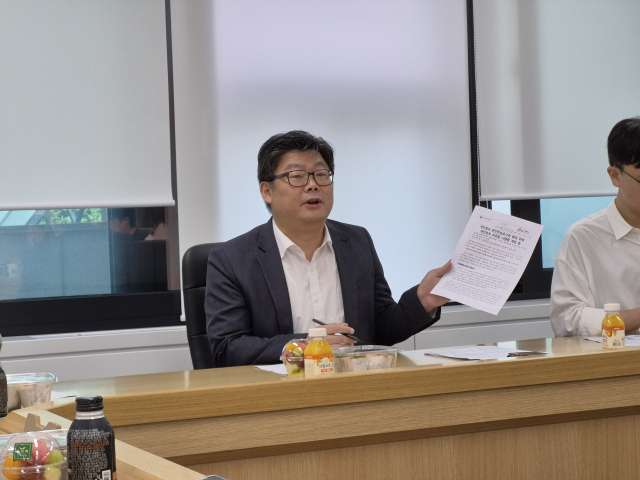
![은행권 “석화업계 자구노력 없인 대출지원 불가”…ETF 경쟁 격화에도 자산운용사들 ‘웃음꽃’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5TNS62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