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히 ‘호랑이 열풍’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까치 호랑이 배지’는 연말까지 온라인 예약판매가 끝났다. 지난 15일 광복절에는 한강 상공에 초대형 ‘드론 호랑이’가 뜨기도 했다.
때아닌 호랑이 열풍은 세계적으로 히트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덕이다. 이 작품에는 조선 시대 민화 ‘호작도(虎鵲圖)’ 속 호랑이를 쏙 빼닮은 귀여운 호랑이(더피)가 조연으로 나온다. 이 캐릭터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덩달아 호랑이 인기가 치솟은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상 속 호랑이’ 얘기다. ‘현실 속 호랑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1급)이다. 국내 서식기록은 1924년이 마지막이다. 지난달 29일이 ‘세계 호랑이의 날’이었지만 한국에선 흔한 기념식이나 축제 하나 없었다.
최근 『호랑이는 숲에 살지 않는다』(사진)는 책을 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임정은 복원연구팀 선임연구원을 만나 ‘오늘날 한국인에게 호랑이의 의미’를 물었다.
-호랑이 인기가 뜨겁다.
“실제 (야생) 호랑이를 못 본 지 100년이 넘었다. 생물학적인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은 희석된 반면, 문화 예술적 호랑이에 굉장히 익숙해졌다.”
임 연구원은 한국인의 지극한 ‘호랑이 사랑’의 예로 올림픽 마스코트를 꼽았다. “한번은 몰라도 두 번 다(1988년 서울 올림픽 ‘호돌이’, 2018년 평창 올림픽 ‘수호랑’) 호랑이였다”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호랑이를 좋아하는지 대변한다”고 했다.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호랑이에 대한 긍정적 관심은 좋지만, 이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야생 호랑이 보전 같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되면 좋겠다.”
-한국에는 정말 호랑이가 없나?
“그간 ‘호랑이 흔적을 발견했다’는 얘기가 몇 번 있었지만 다 해프닝으로 끝났다. 야생 호랑이가 있으면 발자국뿐 아니라, 클로우 마크(발톱 흔적)·분변도 남긴다. 수많은 사람이 휴대폰 들고 등산을 하는데 아무것도 발견 못 했다면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야생 호랑이 수명은 10~15년이다.”

-여전히 호랑이 쫓는 사람들도 있는데
“(호랑이가 남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없는) 호랑이 찾는데 계속 시간과 돈,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까.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
-복원하면 안 되나
“궁극적인 복원을 하려면 한 마리 한 마리 개체가 아니라, 서로 교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체군이 필요하다. 그 최소개체군(MVP)을 50마리 정도로 보는데, 한국에서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까.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하다. 노루·멧돼지가 다시 늘어서 먹이 수준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사람과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

임 연구원은 ‘사람과 호랑이의 공존’이 힘든 이유로, 국립공원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예를 들었다. 개체 수가 늘어난 곰들이 가끔 민가에 내려와 토끼나 염소를 잡아먹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호랑이를 복원했다가 인명 피해라도 발생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는 “반달가슴곰은 잡식이지만 사실상 초식이다. 먹이의 80% 이상이 풀이다. 주로 도토리를 먹는다. 반면 호랑이는 완전 육식이다. 러시아에선 호랑이가 반달가슴곰을 잡아먹기도 한다”고 했다.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보전은 가능한가.
※통상 멸종위기종의 복원(restoration, recovery)은 개체 수, 보전(conservation)은 개체 수와 서식지가 늘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보존(preservation)과는 다르다.
“(보전의) 스케일을 키워야 한다. 야생동물은 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특히나 호랑이는 활동 영역이 넓다. (한국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대의적인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그들이 멸종되지 않게 보전해야 한다.”
호랑이의 활동 영역은 암컷 400km², 수컷 1000km²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서식하는 호랑이 중 약 42%가 국경을 넘나든다. 사람에겐 국경이 있지만, 호랑이에겐 국경이 없는 셈이다. 생물학적으로 봐도 과거 한반도에 서식했던 한국호랑이(백두산호랑이)는 아무르호랑이·시베리아호랑이와 같은 종이다. 결국 러시아·중국 호랑이 보전을 돕는 게 한국호랑이를 보전하는 길이란 것이 임 연구원 얘기다. 러시아·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온 호랑이가 백두대간을 타고 남쪽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그 경우 "비무장지대(DMZ)가 중간기착지나 쉼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러시아·북한 등과 국제 협력이 잘 될까.
“사람의 시간과 자연의 시간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지만, 강산은 10년마다 바뀐다고 하지 않나. 호랑이 복원이나 보전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우리 돈으로 다른 나라 호랑이를 보전하는 걸 사람들이 지지할까
“EU와 미국은 자기 나라에 살지도 않는 동물들을 위해 큰돈을 대고 있다.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다. 한국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물며 호랑이는 한때 우리나라에 살았던 동물이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크게 봤으면 좋겠다.”

임 연구원은 KAIST에서 생명과학을 공부한 뒤 ‘범’에 빠져 전공을 보전생물학으로 바꿨다. 영국·미국에서 석·박사를 하고, 라오스 남엣푸루이, 중국 훈춘(琿春) 등에서 호랑이 보전을 연구한, 국내 유일의 ‘현장’ 호랑이 연구자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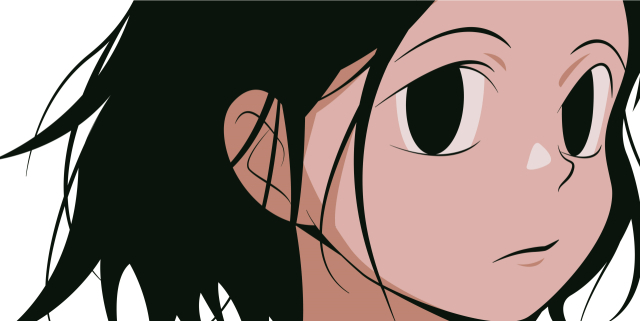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Z세대 소비가 키운 라부부…중국 IP 산업 수출 급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4aae517e-a9ea-4089-b18a-6cf18bf807c1.jpg)
!["벌써 1만장 팔렸어요"…품절 행렬에 ‘국민템’ 농담 터진 ‘이것’ [이슈, 풀어주리]](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B3FC6M_1.jpg)
![[사이언스]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내비게이션 '펄사'](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8/thumb/30155-73593-sample.jpg)
![[소년중앙] 심신 단련부터 자기 보호까지...영화 속 무술, 평소에도 쓸모 많네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25e9f702-3f74-43ac-ba39-437f1b8a0ed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