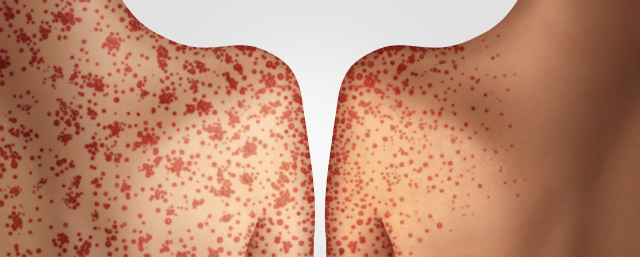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손실을 끼치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라 정의한다. 흔히 ‘공중보건 위기’라면 코로나19 사태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가 떠오른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3만2156명이었다. 당시 사망률은 0.13%였는데, 환자 발생 상위 30개국 중에서 의료시스템이 우수한 한국이 가장 낮았다.
낮춘다던 자살 사망률 더 높아져
법 취지 맞게 인력·예산 확충 필요
자살 예방 대책의 실효성 높여야

같은 시기 한국사회는 자살로 3만9267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한국의 사망률 1위 질환은 암인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암 사망률은 낮고 생존율은 높은 나라다.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효과적인 조기 검진 프로그램과 우수한 의료시스템 덕분이다.
그런데 자살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5위일 정도로 높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439명으로 2017년(1만2463명)보다 약 2000명이 증가했다. 지난 2023년 정부는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1년 10만명당 25.2명인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자살률은 27.9명으로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
‘국가 자살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2019년 논문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계획이 없었던 캐나다·오스트리아·스위스·덴마크보다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한 호주·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의 경우 예방계획 시행 5년 이내에 자살자 수가 감소했다.
암과 감염병에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한국의 공중보건정책이 왜 자살 문제에서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1위인데도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나 친구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19%나 됐다. 즉, 사회적 지지지수가 최하위 수준이다.
자살은 공동체 붕괴의 직접적인 신호의 하나다. 개인의 자살 위기에 대한 지지대 역할을 전통적으로 대가족과 이웃이 해왔는데 이를 대체할 자리가 공백 상태다. 저성장에 빠진 경제, 과도한 경쟁과 양극화, 사회적 편견은 한국을 자살 위험사회로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과 계획만 화려할 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우려를 줄곧 제기해왔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 당시 ‘자살예방 핫라인(988번)’을 도입한 미국은 상담 회선을 늘리고 응급대응팀과 찾아가는 서비스에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호주는 매년 90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사회·학교·병원·경찰·언론·민간단체가 협력하는 모델을 통해 자살 대책 시행 지역에서 자살률이 20% 이상 감소했다. 일본은 코로나19 당시 청소년 자살이 증가하자 ‘아동가족청’을 신설하고, 지자체마다 다학제 응급정신건강대응팀을 조직했다. 위기 청소년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쉼터로 안내하는 민간의 ‘본드 프로젝트’를 국가가 지원한다.
한국은 자살 예방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혁신적인 법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권역정신응급센터는 24시간 자살 시도자를 집중해 돌봐야 하는데, 예산이 연간 3억원이라 인력 투자가 어렵다. 자살 시도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인력은 그대로다. 문자로만 서비스 동의 여부를 물으니 동의율이 20%대에 그친다. 자살예방 교육을 국가와 공공기관·학교·의료복지기관에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온라인 교육만 형식적으로 받는 곳이 늘고 있다.
국가자살예방계획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 들어 있어도 실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만나서 생명을 구할 인력과 예산, 그리고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계획으로만 존재하는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간절하다.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기 어렵다면, 몇몇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한국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에 따른 자살 감소 효과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자살은 이미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다. 그런데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단독] 산모도 의사도 겁난다…3명중 2명 제왕절개 '역대 최고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e8534cce-b189-4d18-bcdd-3e5ddb30ea9f.jpg)


![유방암 치료 이후 늘어난 체중… 꾸준한 체중 관리해야 심부전 발병 위험 ‘뚝’ [필수 건강, 이것만!]](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3/202504235179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