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는 ‘노동시장 참여자 전원 퇴직연금 가입’을 핵심 원칙으로 둔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까지 퇴직연금 납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일정 근속 요건 없이도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계좌가 개설된다. 일회성 근로자나 프리랜서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전체 계좌의 60%가 디폴트 상품인 ‘마이슈퍼’에 자동 편입돼 개인의 투자 이해도나 성향과 무관하게 분산투자가 이뤄지는 체계다. 호주연금협회(ASFA)는 해당 제도를 “가입자 간 수익률 격차를 줄이는 집합 운용 모델”이라고 정의했다.
한 번 적립된 자금은 퇴직 전까지 사실상 움직일 수 없다. 실직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 자금이 장기간 시장에 머물며 누적된 복리 효과를 낸다. 호주건전성규제청(APRA)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10년 사이 약 1조 9000억 호주달러에서 4조 3300억 호주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급여와 고용 형태가 변해도 계좌가 유지돼 복리 운용이 단절되지 않는 점도 성장 배경으로 지목된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경우 적극성과 공격적인 자산 배분이 돋보인다. 통상 호주 연금의 주식 비중은 절반 안팎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채권과 대체투자가 채운다. 인프라·부동산·사모채권·사모펀드 등을 포함한 대체투자 비중은 전체의 20~30% 수준으로 장기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실물투자가 핵심이다. 웨인 설리번 프런티어 어드바이저스 디렉터는 “대체투자는 단기 시황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이라며 “이 자금이 도로·발전소·재생에너지 같은 인프라로 흘러가 산업 전반을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가 연금 자금이 곧 ‘국가 성장 자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낳은 셈이다.

근로자의 생애 주기에 맞춘 ‘라이프사이클’ 투자 구조 역시 일상에 녹아 있다. 젊을 때는 성장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차차 높여가는 방식이다. 45세 이하의 성장 자산 비중은 85%에 달하지만 65세 시점에는 55% 수준으로 낮아진다. 단기 등락보다는 10년 단위의 실질 수익률을 관리하는 장기 투자 원칙이 뿌리내린 셈이다.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가입자들도 제도 안에서 장기 투자 흐름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구조로 퇴직연금이 곧 국가 차원의 자산 형성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머서 호주 법인의 팀 젠킨스 파트너는 “호주 제도의 강점은 자동 가입, 자동 투자가 결합돼 투자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 점”이라며 “단기 매매 대신 일관된 누적 성과를 추구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호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퇴직연금의 적립이 아닌 인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 왓모어 NMG컨설팅 디렉터는 “가까운 미래에 220만~250만 명에 달하는 은퇴자들이 약 1조 5000억 호주달러 규모의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이라며 “퇴직 이후 인출 상품에 대한 경쟁이 호주 연금시장의 다음 10년을 규정할 가장 큰 흐름”이라고 짚었다. 이두원 시드니대 교수는 “호주 연금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높은 주식 비중이 아니라 감독과 정보 공개가 신뢰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며 “한국이 투자형 연금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투명성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데이터·알고리즘으로 장기투자 복리효과 극대화"[퇴직연금 프런티어]](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1ZV49_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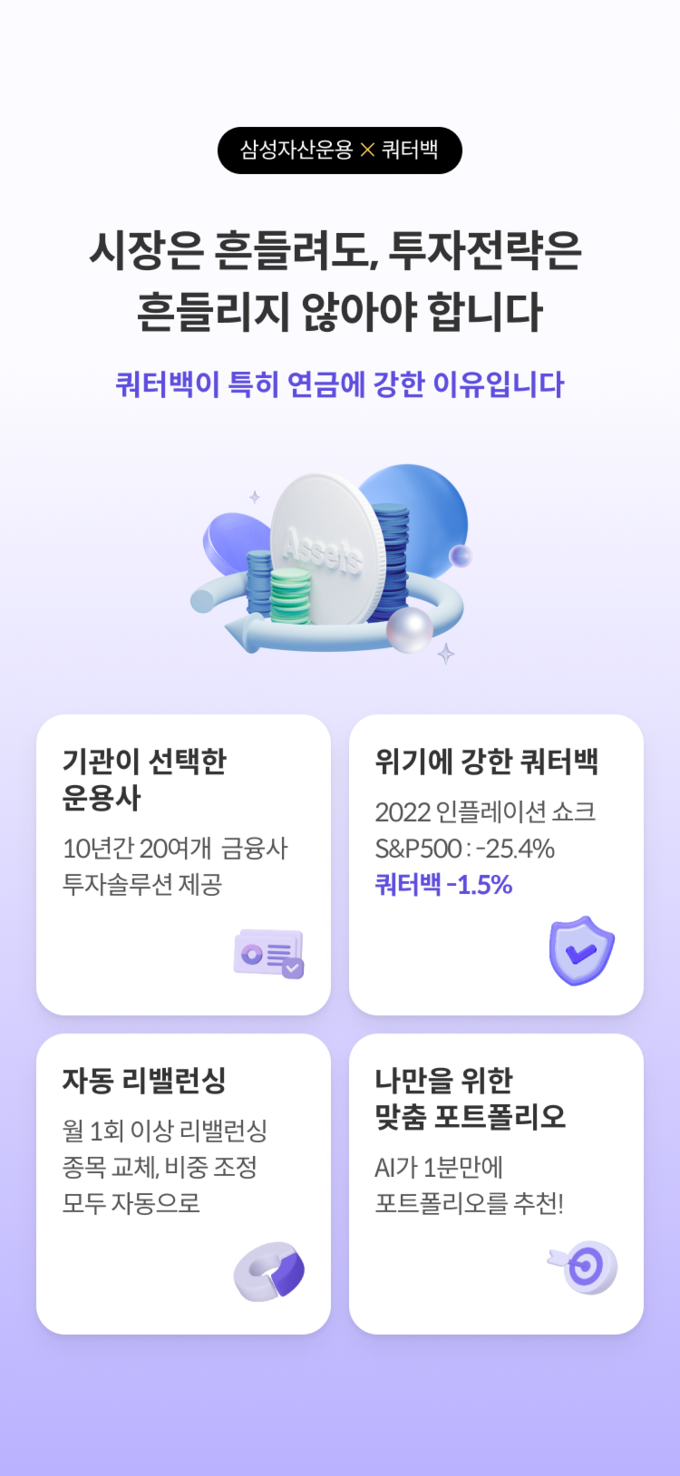

![[투자의 창] 은퇴의 출발, 돈을 쓰는 법을 배워야](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FWOAM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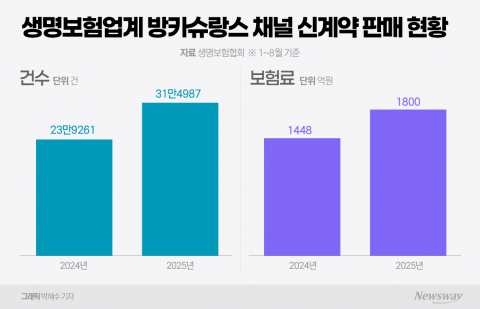

![NH證, 미공개 정보 이용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EV3GRV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