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충격을 중산층이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산층에서 가장 높았다. 가계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도 중산층에서 유독 더디게 늘었다.
중산층 이자 부담 가중
1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에서 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를 기록했다. 3분위는 전체 가구 중 소득 수준이 상위 40~6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다. 소득 대비 이자 비중은 4분위(2.7%), 1분위(2.3%), 2분위(2%), 5분위(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소득도 저소득층도 아닌 3~4분위 중산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을 크게 지고 있었다.

중산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 건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2021년부터다. 소득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지난 3년간 4분위 가구(2→2.7%)와 3분위(2.1→2.8%)에서 크게 늘었다. 고소득자인 5분위(1.6→2%),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1분위(1.9→2.3%) 증가 폭을 크게 웃돌았다. 소득 2분위 가구는 이 기간 2.1%에서 2%로 오히려 감소했다.
원금까지 포함한 원리금상환액은 2023년 3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20.1%를 차지했다. 중산층은 번 돈의 5분의 1 이상을 빚 갚는데 쓴다는 의미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중 역시 3분위 가구가 가장 높았다.
3분위 75%가 “빚 때문에 지출 줄여”
중산층의 팍팍해진 살림살이는 처분가능소득으로도 나타난다. 소득에서 세금‧이자비용 등을 제외해 실질적인 가계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은 3분위 가구에서 증가율이 가장 둔화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5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5분위는 4.9%, 1분위는 4.6%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고소득층은 소득으로 이자를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고, 저소득 가구는 상대적으로 빚이 많지 않다. 중간에 끼인 계층인 중산층이 고금리 파도를 정면으로 맞았다. 실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 3분위 가구의 75.5%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1분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실질 소비지출액이 증가했고, 4‧5분위도 2023년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2‧3분위 가구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했다.
고소득자 임금 상승 못 따라가
주로 대기업 근로자나 전문직이 고소득 가구로 분류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소기업 종사자가 많은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고소득 가구를 따라가지 못 했다. 실제 매출 100대 비금융 상장회사 중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기업은 55개에 달했다. 대기업 위주로 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5년 전(9개 사)보다 6배 넘게 늘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기업 임금이 계속 상향됐지만, 중소기업 임금 상승 폭은 크지 않아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침체로 인한 자영업 부진이 중산층을 집중적으로 내리눌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 중 자영업자는 25%가량을 차지했다. 소득 1~5분위 중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도 중산층인 소득 3분위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자산을 팔거나 소득으로 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대출 총량을 줄여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고소득층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중산층을 주로 구성하는 자영업자와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에겐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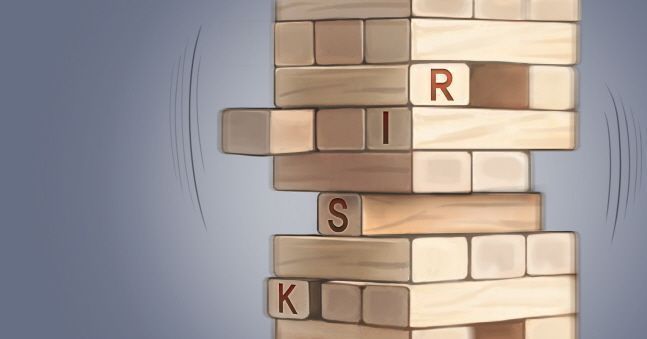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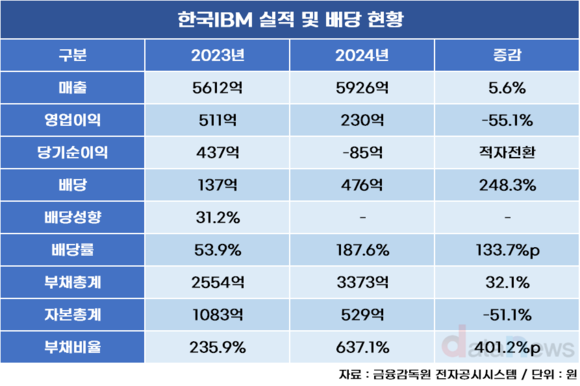
![LH 작년 영업이익 3404억원…순이익·매출 두자릿수 증가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PSUP4Z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