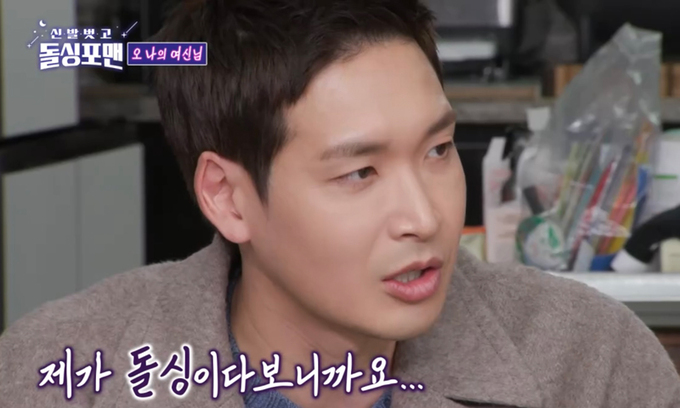70대 레즈비언 커플이 블루스를 춘다. 함께한 세월이 40년 가까운데 어쩌면 이다지 다정한지. 1970년대 파독 간호사로 건너간 이수현씨, 먼저 독일에 정착한 어머니에 초청받아 이민한 김인선씨다. 86년도 한인 기독교 모임에서 처음 만나, 소박한 들꽃 선물이 반생의 사랑이 됐다.
12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두 사람’은 바로 이들의 러브 스토리. 파독 간호사 전시에서 손을 꼭 잡은 둘의 사진 한장(사진)에 반한 반박지은 감독이 3년에 걸쳐 카메라를 들었다. 다큐 속 오붓한 일상사를 보노라면, 권태를 비껴간 사랑의 비결이 궁금해진다.

두 사람은 사실 독일 최초의 이종 문화 간 호스피스 ‘동행’ 설립자로 먼저 알려졌다. 일손이 아쉬울 때 한인 파독 노동자들에게 손 내밀었던 독일 정부는 석유파동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자, 더는 체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들을 내쫓으려 했다. 독일 전역 한인들이 독일 시민들에게 지지 받아, 외국인법 개정을 끌어내며 상황을 뒤집었다. 이후 두 사람은 간호사, 호스피스 지도사 일에 헌신했다. 2005년 전 재산을 털어 동행을 세우고, 파독 광부·간호사, 동아시아 이민자들의 고독한 임종을 지켜왔다. 2008년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감사패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수술을 받은 유방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이어간다. 사랑과 삶이 곧 투쟁이었음에도, 그는 늘 유쾌하게 행복을 말한다. 그의 에세이집 『내게 단 하루가 남아 있다면』(2011)에 담은 호스피스 환자들의 마지막 소원이 배움이 됐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입장에 서준다는 것’ ‘마지막까지 사랑을 주고 싶어요’….
다큐 말미 이씨는 귀띔한다. “아픈데 약 발라주고, 등에 로션 발라주고, (나이 들면) 그게 섹스지.” 황혼 사랑의 지극한 비법이었다.
!['암투병 고백' 서정희 "가슴전절제+자궁적출..살고싶지 않았지만" ('사랑꾼') [순간포착]](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11/202502110051778073_67aa2189a9a8d.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