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국외 부재자 신고를 마쳤다. 6·3 대선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인터넷 신고는 간단했다. 중앙선관위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사이트에 들어가 유효 이메일 계정을 인증한 뒤 이름, 여권번호 등 간단한 개인 정보만 입력하면 끝이다. 5분이 채 안 걸렸다. 인증된 이메일로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증이 발송돼 왔다. 이제 필자는 재외투표 기간인 내달 20일부터 25일 사이 집에서 약 16㎞ 떨어진 주미대사관에서 투표할 수 있는 등록 유권자가 된 셈이다.
재외선거 투표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62.8%. 중앙선관위는 현행 재외선거를 도입한 2012년 총선 이후 가장 높았다고 적극 홍보했다. 대선 투표율은 이보다 조금 더 높다. 2022년 3월 제20대 대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75.2%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은 함정이 있다. 이 투표율은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일 뿐이다. 전체 재외국민 가운데 투표한 사람의 비율은 열 중 하나가 될까 말까 한 수준이다.
20대 대선을 예로 들면 이렇다. 재외국민 전체 유권자 수는 약 215만 명. 이 가운데 재외선거에 필요한 절차인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29만4000명(13.7%)에 그쳤다. 나머지 절대다수인 86.3%의 재외국민은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등록 유권자 29만4000명 가운데 실제 투표한 사람은 22만1000명으로 등록 유권자 대비 75.2%다. 전체 선거권자 215만 명 대비 투표율로 따지면 10.3%라는 초라한 숫자가 드러난다.
유권자 등록을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미국은 드넓은 땅덩어리에 비해 투표소가 차려지는 공관 수가 한정돼 집에서 투표소까지 차로 서너 시간이 걸리다 보니 엄두를 못 낸다는 사람이 꽤 있다. 재외국민 등록 방법 등 정보 부족, 지지 후보 부재 등도 이유로 꼽힌다.
현장 투표만 가능한 재외선거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인터넷·우편 투표 도입, 투표소 확대 등 법 개정 논의가 꾸준히 있었지만, 재외국민 표심을 정략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정당들의 셈법 차이로 번번이 무산됐다.
2007년 6월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을 계기로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된 재외선거. 도입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유의미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단독]민주 "여의도 어슬렁대면 각오"…지역구 대선성적 의원평가 추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30/dd404e15-8b70-4f9b-be81-98edd0d2fbbd.jpg)
![[단독] 대선 끝나면 공약도 ‘끝’… 기록관리 손 놓은 선관위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51627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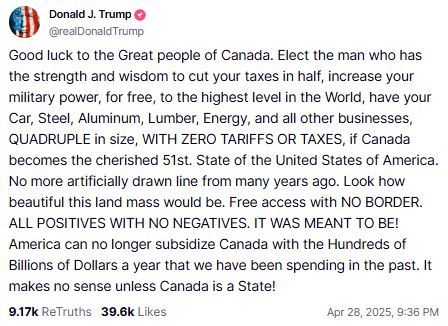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9/72c8bac9-79bb-4f99-82c1-63457b5719e2.jpg)
![[위영금의 시선] 대통령 선거와 북한이탈주민 리더](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8860484859_4b13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