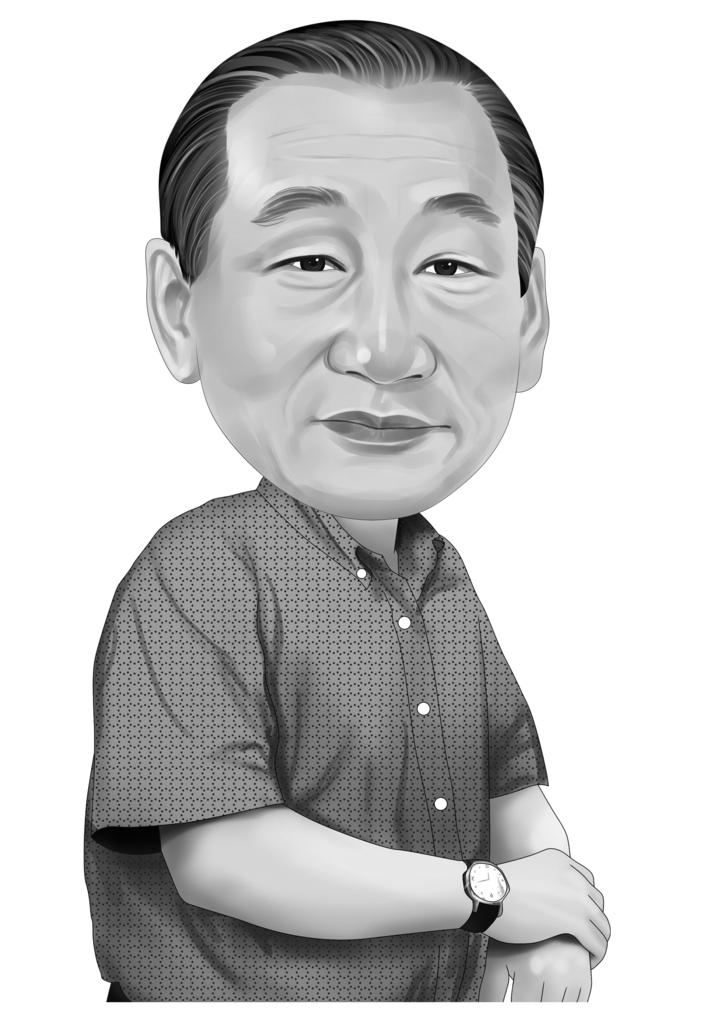대단한 더위다. 날씨도 더운데 관세 협상까지 끓어오른다. 이 불가마로부터 탈출해 6000년 전 선사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떤가.
울산의 암각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반구대와 천전리 암각화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에 고래사냥을 묘사한 암각화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북태평양 연안의 해양어로 문화의 시작을 알려주는 표식이기도 하다.

몇 년 전 나도 그 암각화를 보러 간 적이 있다. 소박한 농막에서 막걸리를 한 잔 들이켜고 익룡의 발자국이 찍힌 암석에 발을 갖다 대기도 하면서 시간을 거슬러 반구대에 도착했다. 하천 너머로 ‘잃어버린 세상’, 고래 떼와 육지 동물들이 새겨진 6000년 전의 생태지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의 심정을 뭐라고 할까. 문자도 없던 선사시대를 석공들의 손으로, 우리 시대의 용어를 빌리자면 예술가들의 손으로 오롯하게 남긴 암각화니 예술의 시원과 만난 심정이었다.
특히 나를 사로잡은 것은 우측 하단의 큰 얼굴 형상.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내게 그 형상은 토템인 고래를 잡을 때 사용했던 가면처럼 읽혔다. 고대인들은 초월적 힘이 필요할 때 가면이라는 상징으로 그 힘을 구체화했고, 이후 탈종교화되는 과정에서 가면은 연극의 상징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은 물론이고 아시아 연극 전통도 대부분 가면극으로 수렴된다. 그러니 그 반구대에서 나는 느닷없이 우리 연극의 기원과 만났던 것이다.
반구천 하류의 사연댐으로 인해 반구대 암각화는 간간이 물에 잠기고, 이번 장마에도 물에 잠긴 모양이다. 암각화를 새긴 선조들은 변변한 도구도 없던 석기 시대에 고래를 잡던 사람들 아닌가. 그들의 후손으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혜와 궁리를 모아 저 선사시대의 절경을 제대로 보존해야 할 것이다.
김명화 극작가·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