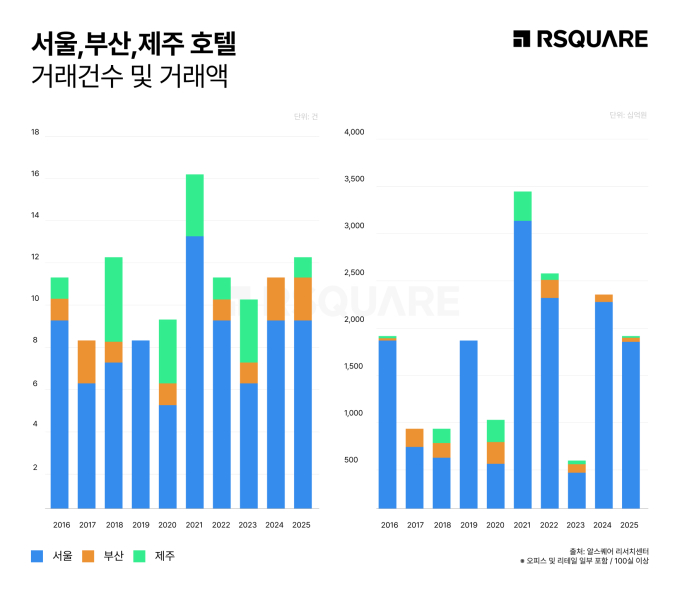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작품을 보지 않았지만, 제목부터 오늘의 한국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이는 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합의해온 '안정된 삶의 기준'에 가깝다.
서울 자가는 자산 가치 하락에 대비한 안전판이고, 대기업은 예측 가능한 소득과 경로를 의미한다. 이는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선택이다. 투자로 치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중수익 전략이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이며, 사회적으로도 오랫동안 미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문제는 이 합리적 선택이 개인의 선호를 넘어, 제도와 평가의 기준으로 굳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기관과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의 기준은 점점 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해 왔다. 정량화된 지표, 비교 가능한 점수, 명확한 기준은 책임을 설명하기에 유리하다. 사후 책임이 중요한 구조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진화이기도 하다.
다만 이 시스템은 동시에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 과거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 평가는 이미 증명된 선택에는 유리하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능성에는 불리하다. 설명 가능한 안전한 선택은 반복되지만, 새로운 시도는 구조적으로 배제되기 쉽다. 그 결과, 제도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장치를 넘어 리스크 자체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같은 평가 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인력·자본 쏠림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효율성을 극대화한 조직은 역할을 세분화하고, 개인을 시스템의 일부로 정교하게 배치한다. 이는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를 축소시킨다. 자기 주도성은 약화되고, 기준에 맞추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금융과 투자 영역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표면적으로 공정한 평가 시스템은 실제로는 유사한 선택을 반복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안전한 선택을 할수록 사회 전체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라는 하나의 모델에 수렴한다.
안정이나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제도와 평가 시스템이 리스크를 제거하는 장치가 아니라, 리스크를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구조로 진화해야 한다. 정량 지표와 함께 정성적 판단이 공존하고 단기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
모든 자본이 모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동일한 기준만을 강요할 필요도 없다. 안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 제도의 역할은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삶의 한 형태다. 다만 그 모델이 제도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순간, 사회는 조용히 활력을 잃는다. 이제는 묻고 싶다. 우리는 안정 위에서 얼마나 다양한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가.

![[기자수첩] '김 부장'은 좋겠다, 서울에 집 있어서](https://img.newspim.com/news/2025/10/22/2510221737047000_w.jpg)

![우리금융이 달라졌다…해외법인장에 젋은 피·계열사 내부승진 [S마켓 인사이드]](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2HR8NG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