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 대학이 마련한 리셉션 만찬장. 공치황(龔旗煌) 총장이 한국 대표단을 위해 만든 자리였다. 의자에 앉으니 곱게 접힌 냅킨이 눈에 들어온다. 펼치니 한시가 쓰여 있었다.
‘친구와 함께한 세월이 길어지니(友朋相伴歲月長), 후덕한 빛이 팔방을 비추네(德厚流光耀八方)….’ 기자의 한자 이름(友德)을 적용해 만든 한시였다. 만찬 참석자 15명 모두에게 같은 ‘서비스’가 제공됐다. 다들 자기 이름이 들어간 한시를 떠듬떠듬 읽으며 즐거워했다. 중국 인문학의 총본산이라는 베이징 대학의 각별한 손님맞이 풍경이었다.

“AI가 만든 것입니다. 수준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백(李白)을 능가할 멋진 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공 총장이 맑게 웃으며 말한다. 베이징대와 SK그룹 최종현학술원(원장 김유석)이 공동 주최하는 베이징 포럼은 지난 1일 그렇게 시작됐다.
정치가 막히니 민간 교류도 끊기는 게 요즘 한·중 관계다. 베이징 포럼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1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열린 양국 합작 학술회의. 중국 지식계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창구이기도 하다.
‘AI 냅킨’은 포럼 세션에도 등장했다. 50여 개 회의 중 가장 뜨겁게 토론이 벌어진 분야가 바로 AI였다. 관련 세션에는 여지없이 학생 청중이 몰렸다.
스탠퍼드대학의 그라함 웹스터 연구원은 ‘AI 식민주의(Colonialism)’를 제기했다. AI 기술을 이용해 저개발국가의 정보를 착취하고, 정보를 지배하는 ‘디지털 식민지 침탈’에 대한 우려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의 시각은 다소 달랐다. “AI 기술은 미국이 앞섰다. 중국은 추격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흉내 낼 수 없는 경쟁력을 갖췄다. 제조업 응용력이 그것이다. 중국 공장의 AI는 미국을 능가하기에 충분하다.” 베이징대 레이샤오화(雷少華)교수의 발언이다. 그는 AI 분야 미·중 협력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미국을 이길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세계 AI 기술은 미국의 길과 중국의 길로 나뉘어 발전할 것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포럼에 참가한 백서인 한양대 교수는 “중국 학자들의 ‘AI 열정’에 놀랐다”고 말했다. AI 인프라 건설,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등을 말하는 그들의 눈에서 간절함을 봤다고 했다. 간절함은 혁신을 낳기 마련이다. 베이징 포럼에서 본 ‘AI 냅킨’은 그 간절함의 표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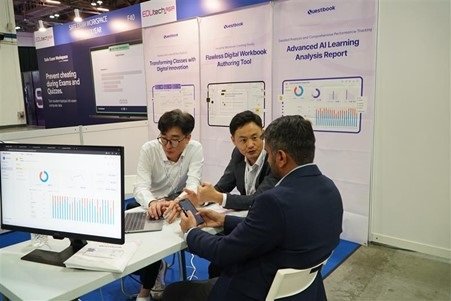






![[에듀플러스]재능교육 '코코블', ASOCIO DX 어워드 에듀테크 부문 수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3/news-p.v1.20241113.2a85fb46997b4234b79e6c1b963fdcca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