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흔히 미래를 이야기할 때 긍정적 회로를 돌리기 위해 드는 근거가 바로 기술 발전과 인간 역량이다. 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전해 편리해지고, 잘 살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려면 그 기술을 구현할 인력이 필요한 건 당연지사다.
기술이 만들어지려면 우선 계산이 필요하다. 세상 모든 것은 수(數)로 표시할 수 있다. 그 수를 계산해 편리해지려는 목적을 찾고, 계산식을 형상화시키는 작업(工)을 거쳐 인간에게 온다.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현대의 우리는 '이공계(理工界)'라 부른다.
주지하다시피 인류 발전은 이런 이공계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왔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고대 철학자부터 피타고라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거쳐 근세의 아이작 뉴턴,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 아인슈타인, 근래의 스티브 잡스까지. 하나같이 이공계들이다. 물론 여기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들이 없었다면 인류 삶은 수렵·채취 시절 만큼 불편하고 위험했을 것이다. 이런 천재들과 수많은 평범한 이공계 사람들 덕분에 우린 현재의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다.
다시, 지금부터 조금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이공계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이공계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염려, 사회적 기여에 못미치는 저평가에 떠밀려 끝간데 없이 위축되고 있다. 최근 의·약계에 밀려버린 이공계가 앞으로 10년, 20년 뒤 우리나라를 기술적으로 지탱할 수 있을지 조차 의심받고 있을 정도다.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보면 이런 현상이 숫자로 확인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교 공학·자연계 학생수는 75만2981명으로 지난 2000년 73만3766명에서 2.6% 늘어나는데 그쳤다. 사실상 정체된 숫자다. 반면, 의·약계열 학생수는 2000년 5만9580명에서 지난해 14만268명으로 135%나 급증했다.
같은 통계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원 공학계열 입학생수는 2만9999명이었다. 그러나 석·박사 졸업생수는 2만444명에 그쳤다. 약간의 시차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원 석·박사 학위 이탈률이 무려 32%에 달하는 셈이다. 학계 정설로는 해외 유학이나 학위 취득을 선택한 쪽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의·약 계열 쏠림과 이공계 기피는 단순히 의·약 계열의 유망함 만으로 설명이 안된다. 의·약분야의 안정적인 고소득 기대가 이러한 현상에 한 몫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공계로 가지 않으려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존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 적은 것이 더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공계 기피가 앞으로 10년 더 진행된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최근 20년 동안 별다른 성장동력을 만들지 못했던 시간이 10년 더 늘어나는 것과 같다. 점점 더 뒤처지는 사회, 일자리·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산업 모두가 이공계 기피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인공지능(AI)사회에서 의료 진단은 AI가, 수술은 로봇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공계 인력의 AI 기술 개발과 진화 노력은 AI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일이다. 20만명, 100만명의 AI 인력을 키우겠다는 말 보다 우리 사회 저변의 추락해 버린 이공계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국가적 책무다.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성장시키는 일, 이공계 되살리기에 달렸다.
이진호 논설위원실장 jholee@etnews.com
![[기고] 연세대, 양자 컴퓨팅 상용화 박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2/3ee07fac-e2b0-49d3-8343-9c6868a2c472.jpg)

![[ET단상]기술 패권 시대,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4/news-p.v1.20250514.dcd86371b252488d82ca42e64a4aa7d1_P3.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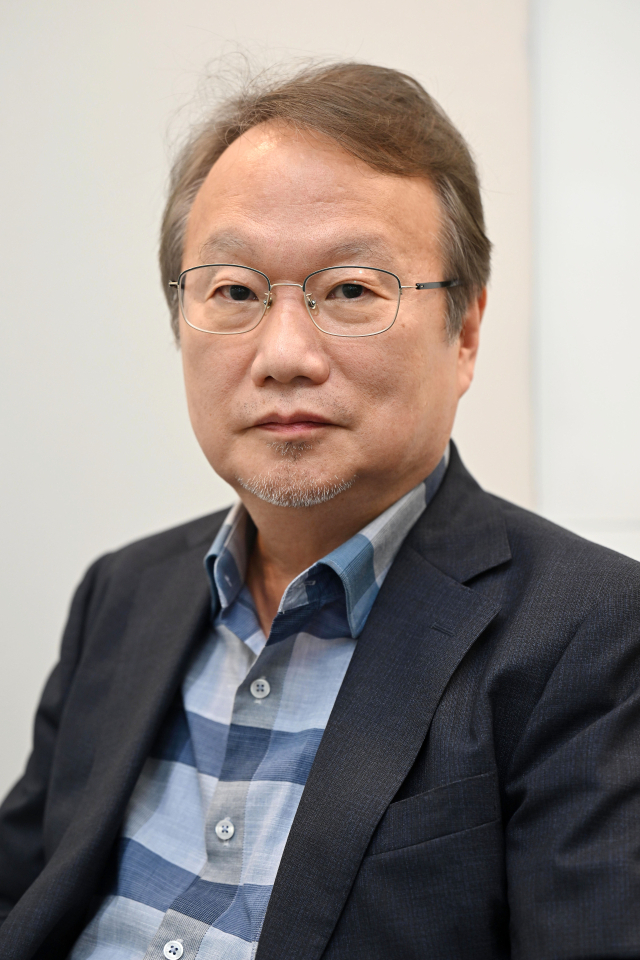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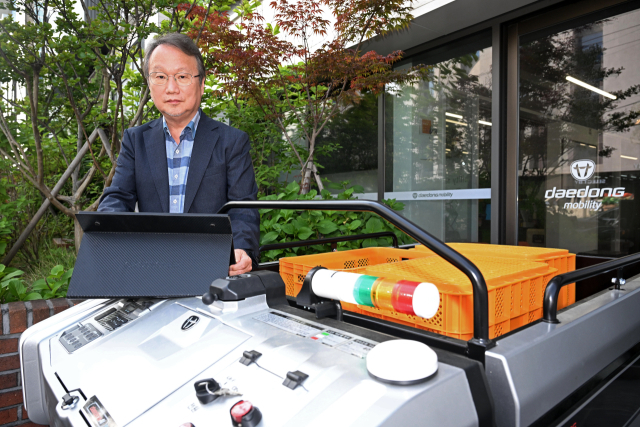
![[타인적인 일상] 말에 올라탄 인생](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859450158_fa1fd6.jpg)
![[김주한 교수의 정보의료·디지털 사피엔스]딥시크와 딥페이크, 다들 '딥'해지는 사연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3/28/news-p.v1.20240328.f4631e4ac6b34679ba383ed76117328d_P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