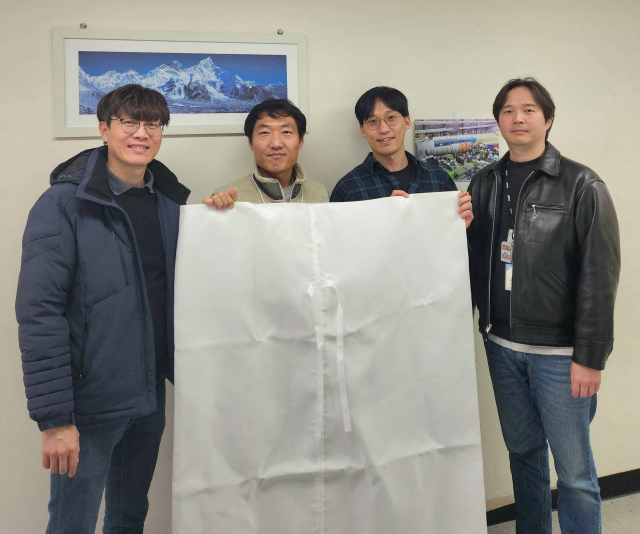“나무에 설치한 8개 센서를 통해 수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게 확인되면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산불 피해목을 살리기 위한 연구를 하고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정유경 박사가 2일 ‘전기저항단층 촬영’ 진단 기법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전기저항단층 촬영은 나무 수액의 흐름을 파악해 상태를 진단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지표면에서 30㎝ 높이 나무 부분에 센서 8개를 설치하고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이때 수액이 흐르면서 전기 저항이 생기는데 순환이 활발해 저항이 크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저항이 약하면 빨간색이 나타난다. 파란색일 경우 생존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 진단 기법은 현재 활용성 검증 단계다.
정 박사는 해당 진단 기법을 오랜 기간 산불 피해지에 적용해 실험을 해왔다. 강원 강릉과 정선 산불, 경북 울진 산불 피해 지역에 1곳씩 실험지역을 지정한 뒤 산불 피해목 고사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실험지역은 나무 피해 강도가 '경'인 지역으로 지정했다.

명승 제26호 안동 개호송 숲 소나무 세척 중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나무 피해 정도를 ‘심(深)ㆍ중(中)ㆍ경(輕)’으로 분류한다. 심의 경우 나무의 잎과 가지가 시커멓게 탄 것을, 중은 잎 전체가 갈변한 상태를, 경은 불이 스치고 지나가 대부분이 푸른 것을 말한다.
정 박사는 “전기저항단층 촬영 진단 기법은 나무마다 일일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피해 현장보다는 천연기념물 같은 보호수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불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26호인 개호송 숲 일원이 산불에 휩싸였는데 현재 수목치료업체에서 까맣게 탄 소나무를 세척하고 있어 이 같은 현장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박사는 “산불 피해 평가가 철저할수록 복원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산불 후 소나무의 고사 여부 진단예측방법과 함께 현장에 적용하면 피해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다양한 진단 기법 개발
앞서 국립산림과학원은 2017년부터 ‘산불 후 소나무의 고사 여부 진단예측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진단 기법은 ‘흉고직경(DBH)’과 ‘그을음 지수(BSI)’로 고사율을 알 수 있다. 흉고직경은 나무의 둘레를 말하는 것으로 두꺼울수록 생존확률이 높았다. 그을음 지수 산출 방법은 산불 피해목을 동ㆍ서ㆍ남ㆍ북 4개 면으로 나눈다. 면별로 그을음 흔적의 높이와 비율을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측정해 나온 값을 고사율 표에 대입해 생존확률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직경 44㎝에 잎이 푸르고, 지표면에서 동 1.8m, 서 1.8m, 남 0.8m, 북 1m 높이까지 그을린 나무의 경우 고사율 표에 대입하면 생존확률이 95~96% 수준으로 예측됐다. 해당 연구는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마친 상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7년 5월 6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산불로 765㏊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된 삼척시 도계읍 점리의 해발고도 800m 한 야산에 3개 구역(AㆍBㆍC)을 실험지역으로 선정한 뒤 잎이 타지 않은 353그루를 대상으로 해당 진단 기법을 적용해 실험했다. 현재 실험 대상 나무 중 80% 정도가 살아있다.

이번 산불 피해 영향구역 4만8000여㏊ 추산
이 진단 기법은 2022년에 개정된 ‘산불피해지 복구 매뉴얼’에도 포함돼 산불 피해목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객관적이면서도 수월해졌다고 한다.
강원석 목포대 원예산림학부 교수는 “이번 산불 피해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작은 ‘경’ 지역에 해당 진단 기법을 적용하면 많은 나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숲을 조성하는 건 1~2년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숲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경남과 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의 산불 피해 영향구역은 총 4만8000여㏊로 추산됐다. 통상 ㏊당 1000그루가 넘는 나무가 심겨있는 만큼 4800만 그루가 산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삼척ㆍ대전ㆍ안동=박진호ㆍ김방현ㆍ김정석ㆍ안대훈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글로벌 AI 특허 출원 동향]센세넷, AI 기반 산불 조기 감지 및 예측 기술 공개](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1/news-p.v1.20250401.ceb2c1e5a61c4a28ad3905709bff2d13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