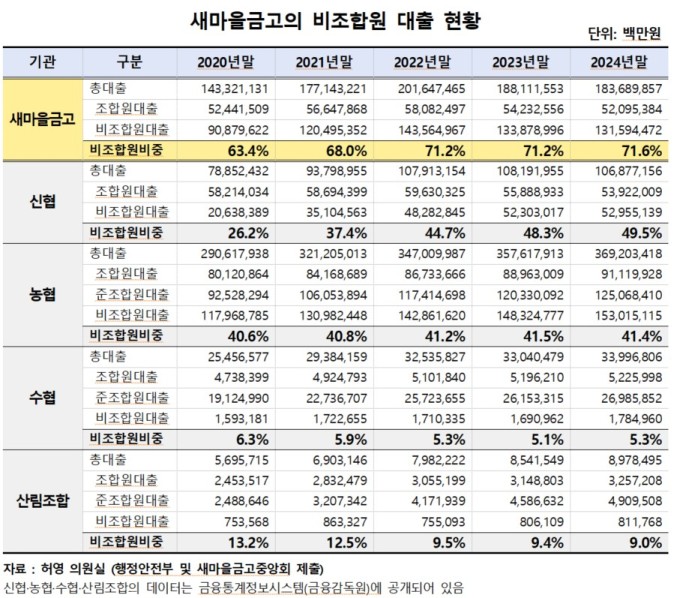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세대출 제도가 무분별하게 운영되면서 전세 사기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매매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금융기관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능력이나 임대주택 권리관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고 있다”며 “보증기관도 반환보증이 불가능한 주택에 보증을 발급하는 등 안일하게 운영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세보증금 규모는 약 1100조원이며, 이 가운데 약 15%가 전세대출로 조달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도 공개됐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트하우스에 입주한 강모 씨는 보증금 1억원 중 8000만원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했으나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해당 주택은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만 26억원이 설정돼 있었고, 감정평가액은 18억원에 불과한 전형적 ‘깡통전세’였다. 또 다중주택 구조에 불법 취사 시설까지 설치돼 있었지만 대출은 아무 문제 없이 승인됐다.
강 씨는 “집을 구할 당시 ‘중기청 가능 매물’이라는 문구를 보고 안심했다”며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까지 고민하는데 은행은 이자만 챙겼고 정부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토로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전세대출 구조를 원금은 임대인이, 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정하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