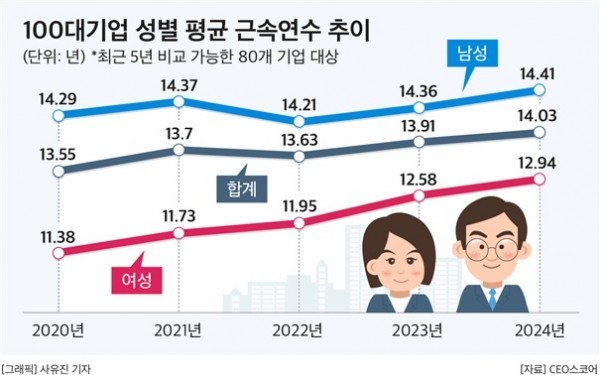이병철의 소병해, 이건희의 이학수, 정주영의 이병규….
과거 재계 총수의 비서실장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까다로운 회장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실행할 뿐만 아니라 회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실세 중의 실세, ‘왕(王)실장’으로 불린 이유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같은 재계 3세로 내려오면서 비서실장 자리는 빈칸에 가까워졌다. 비서실 같은 조직을 두지 않거나, 있더라도 총수 일정을 관리하고 의사소통 창구 정도로 간소하게 운영해서다. 그런데도 대기업 비서실은 사내에서 여전히 “승진이 보장된 엘리트 코스”란 부러움과 “비서인데 권력을 가진 줄 착각한다”는 질투를 동시에 받는다. 2025년 현재 ‘회장님의 비서실’을 들여다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호원 없이 혼자 다닌다. 실무진이 보안 차원에서 수차례 의전을 권유했지만, 이 회장이 거부했다고 한다. 해외 출장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해외 출장지에서 이동할 때 삼성 관계사 차량이 아닌 렌터카를 쓴 적이 있을 정도다. 이건희 선대 회장이 이동할 때마다 가까이에 비서진은 물론이고 경호 인력까지 대동한 것과 대비된다.

1. 대기업 총수 비서실 ‘다이어트’
중앙일보가 자산 규모 재계 30위 안팎 대기업 중 16곳을 설문한 결과 총수 비서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간소화’였다. 삼성·현대차·포스코·GS는 “직제상 비서실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서진을 두더라도 5명 이하로 운영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에 이르렀던 과거 대기업 회장 비서실 위상에 비해 초라할 정도다.
비서실 업무도 총수의 주요 의사 결정을 돕는 ‘경영지원’보다 ‘실무형’으로 축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취재 대상 기업 대부분이 ‘일정 관리’ 혹은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비서실의 주요 업무로 꼽았다.
비서실을 진두지휘하는 비서실장도 실무형으로 바뀌는 추세가 뚜렷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인 SK·LG·롯데·한화·신세계·CJ·두산·효성 등 8곳만 임원급을 비서실장(비서팀장)으로 두고 있었다. LS·DL은 차장급이 비서진 선임이다. 사장급을 비서실장으로 두기도 한 과거보다 격세지감이다. 다만 4대 그룹의 한 대관 담당 A전무는 “비서실장은 설령 부장이더라도 임원급으로 봐야 한다. 회장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인력이라 사내 입지가 일반 사업부 부장과는 비교 불가”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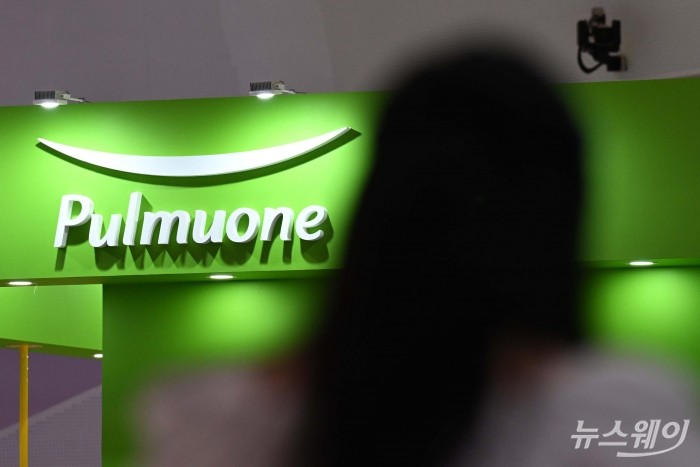
![[대선레이더] 양향자 “삼성은 기술로 승부하라” 기흥사업장 방문 아쉬움 피력](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7043602516_2090c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