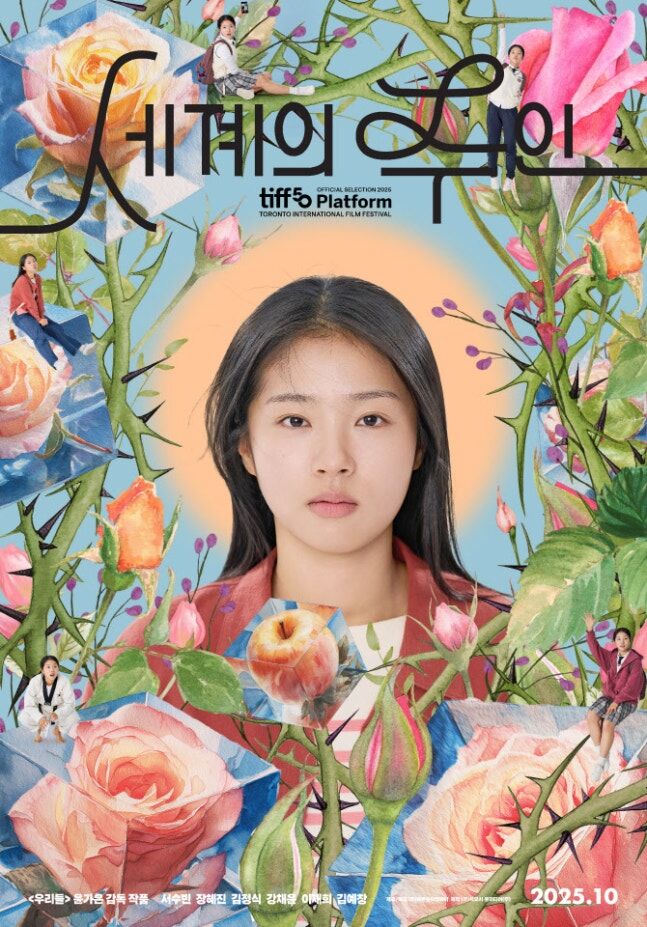미디어 프런티어: K를 넘어서

※노트북LM AI로 생성한 팟캐스트입니다.
AI로 만든 영화 ‘중간계’가 극장에 걸렸을 때, 반응은 놀라움 반, 당혹감 반이었다. 강윤성 감독이 단 7명, AI 비전문가들과 함께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SF 단편을 완성했다는 사실 자체는 꽤 충격적이었다. 몇몇 장면의 비주얼은 “AI가 이 정도까지?”라는 감탄사를 자아냈고, 치솟는 제작비에 신음하던 영상 업계엔 ‘비용 절감’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관객들의 최종 평가는 냉정했다. “신기하긴 한데, 재미는 없다.” 기술적 성취에 대한 잠깐의 호기심이 영화적 재미로 이어지진 못한 것이다. ‘중간계’는 AI 영상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기술은 분명 놀랍도록 발전 중이지만, 그게 곧 '볼 만한 콘텐츠'는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지금 영상 시장의 화두는 단연 AI다. 해외 AI 영화제에선 한국 작품들이 상을 타고, TV 방송사들은 너도나도 AI 앵커를 등장시키거나(MBN 등) EBS처럼 ‘AI 단편극장’ 같은 실험작을 내놓는다. 업계 곳곳의 ‘AI 전도사’들은 장밋빛 미래를 외치고, 유튜브와 릴스에는 AI표 영상들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숏폼 영상 업로드 통계는 정확히 없지만, 정말 어마어마하다.) 일부는 혁신인 양 AI 숏폼 드라마를 내세우기도 한다.
기술 발전 속도는 확실히 눈부시다. ‘원모어펌킨’으로 AI 영화제 대상을 탔던 권한슬 감독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캐릭터 한 걸음 떼게 하려고 수백 장 이미지를 뽑는 ‘노가다’를 했지만, 이제는 프롬프트 몇 글자면 된다”고 말한다. “라떼는 말이야...”를 읊기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AI가 영상 산업의 ‘구원투수’가 되어주길 바라는 기대감은 커져만 간다. 살인적인 제작비 속 비용 절감은 지상 과제고, AI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보자. AI 기술을 파는 ‘기술 기업’과 그 기술을 사서 써야 하는 ‘활용 기업’(방송사, 제작사 등)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기술 기업은 미래 시장을 약속하는 황금알이기에 가능성을 부풀려야 하지만, 활용 기업은 당장의 쓸모와 안정성이 증명되어야 하는 도구로 AI를 본다. 기술 기업에겐 “오늘이 가장 싼 날!”일지 몰라도, 활용 기업에겐 “내일이면 반값!”일 수 있다. 매일같이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니 말이다.
영상 산업은 명백히 AI ‘활용 기업’이다. 쓸모와 안정성 확보와 도입 속도 사이에서 현명한 줄타기가 필요하다. 자칫 AI라는 마법에 홀려, 상품 가치도 없는 어설픈 결과물, 이른바 ‘워크슬롭(workslop)’만 양산하며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

그럼에도 다들 AI를 ‘만능 맥가이버 칼’처럼 여기는 듯 하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써보니 별거 없다”, “오히려 일이 늘었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핵심은 실험실과 시장의 구분이다. 새 기술 탐구는 당연하지만, 그 실험은 실험실 안에서 끝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방송 시장에선 쓸모와 안정성이 검증 안 된 실험실 수준의 생성형 AI(Gen AI) 결과물들이 버젓이 상품 행세를 하고 있다. 임상시험도 안 거친 약을 “일단 잡숴봐” 하는 꼴이다. 소비자는 완성품을 원하지, 돈 내고 베타테스터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AI에 대한 불신과 실패 사례는 쌓여만 간다. KPMG 조사에선 AI 검색 결과를 믿는 사람이 8%뿐이었고, 가트너 보고서는 절반 이상이 불신과 오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맥킨지 연구에선 생성형 AI 도입 기업 80%가 “본전도 못 찾았다”고 했고, MIT 연구에선 대기업 AI 시범 프로젝트 95%가 ‘폭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