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글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펼치면서 한글이 만들어진 후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변해 왔는지뿐만 아니라, 한글이 쓰이고 변하는 맥락을 짚으면서 한글을 어떻게 생각하고 한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왔는지를 보여 준다.
체제 유지의 도구에서 해체의 도구로
세종은 성리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쉽고 간편한 한글이 삼강오륜의 이치를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도구가 되리라 기대했겠지만, 한글은 동학, 천주교 등 삼강오륜의 이치에 반하는 지식과 사상조차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글자였다.
한글은 백성을 가르칠 글자이면서 백성이 자신의 뜻을 펴는 글자이기도 했다. 한글을 배운 백성은 자신의 뜻을 펴는 데 한글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한글을 창제한 후 6년이 지난 시점에 한글 벽보가 나붙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한글 벽보뿐만 아니라 한글 투서도 횡행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정조 임금은 민심이 동요하는 국면마다 한글로 유지를 내려 백성을 안심시켰다.
한글은 상하 계층이 공유할 수 있는 문자로 사용자가 가장 많았기에, 조선 사회의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됐다.
한문을 교육하는 데도, 과학 기술의 성과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데도 한글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자였다. 중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널리 보급된 한글은, 근대화의 압력이 거세지는 시기, 근대 사회를 여는 강력한 도구로 새롭게 등장했다.
백성에게 삼강오륜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문자로 깊이 뿌리 내린 한글이 삼강오륜으로 상징되는 중세적 질서를 해체하고 근대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공론장의 주류 문자가 되었던 것이다.
상처입은 민족의 자존심을 치유하다
한글은 그 기대의 방향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세종은 자신이 창제한 문자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세종을 포함하여 당시 사람들은 진서(眞書) 혹은 문자(文字)로 불렸던 한문과 한자에 대비하여, 훈민정음을 ‘언문’(諺文)이라고도 불렀다. 근대에 오면서 언문은 ‘국문’(國文)이 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곧 일본에 병합됐고, 국문과 국어는 일문과 일본어를 뜻하는 이름이 되었다. 우리말과 글이 주류 영역을 벗어나면서 조선인들은 ‘국문’을 대신할 이름을 찾았고, 이에 ‘한글’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한글’은 대한제국의 글 또는 문자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한문’(韓文)을 풀어쓴 것이었다. ‘국문’에 대비된 비주류 문자의 이름이었지만,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한글’은 독립의 의지를 일깨우는 이름이기도 했고 민족의 얼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했다.
‘대한제국의 문자’라는 의미는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상처 입은 민족적 자존심을 치유하기 위해 ‘한글’에는 ‘큰’, ‘위대한’ 또는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덧붙었다.
1894년, 고종이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을 혼용한다”는 칙령을 내린 뒤부터 한글 글쓰기는 무한 확장됐다.
한글 글쓰기는 한글 신문의 연대기 속에서 구체화됐다. ‘독립신문’에서 시작하여 ‘대한매일신보’에서 분명해진 한글 신문의 가능성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거쳐 ‘한겨레신문’에서 꽃을 피운다.
한편, 이 책은 이외에도 외래어 표기의 연대기, 어문규범 제정의 연대기, 국어사전 편찬의 연대기, 한국어 세계화의 연대기, 한글 기계화의 연대기, 한글 응용의 연대기, 한글날 제정의 연대기 등 다각도로 한글의 역사와 그 의미를 치밀하게 분석한다.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39〉AI 도시의 가치 창출 메커니즘(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0/news-p.v1.20251010.d6e5e40f620b4fad9d322bee230cdd3e_P3.jpg)
![[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1인 "법률 조문의 명확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야"](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657_903730_514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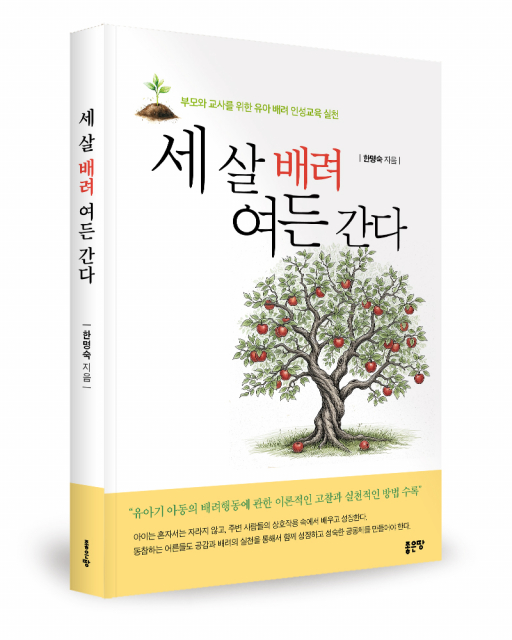
![[동십자각]숏폼 너머 AI의 가치를 찾아서](https://newsimg.sedaily.com/2025/10/12/2GZ5G50IEI_1.jpg)
![[알쓸비법] 온라인 모욕, 고소할 수 있을까?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A to Z](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488-74343-sample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