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찾아 인도·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미 AI 보급률이 높은 선진국보다 시장의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무슨 일이야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AI 기업 딥시크는 최근 화웨이클라우드와 협업해 아프리카에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시도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아프리카의 많은 기술 기업인들에게 중국의 경량·저비용 AI 모델은 제품을 구축하는 데 있어 최상의 선택지”라고 평가했다.

오픈AI·구글 등 AI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빅테크들도 저렴한 유료 구독 요금제를 앞세워 동남아시아·인도 등의 지역으로 사업을 뻗어나가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8월 인도를 시작으로 월 약 4.5달러(약 6000원) 수준의 ‘챗GPT 고’ 요금제를 출시했다. 무료로 사용할 때보다 메시지나 이미지를 10배 정도 더 업로드 할 수 있는데, 가격은 기존 유료 요금제(챗GPT 플러스·월 20달러)의 25%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 지난 9일에는 아프가니스탄·베트남·태국·필리핀 등 40개 국가로 시장을 확대했다.
구글도 이와 유사하게 월 5~6달러(약 7000원)로 저렴한 요금제인 ‘구글 AI 플러스’ 요금제를 내놨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 먼저 공개한 후 9~10월에 걸쳐 필리핀·네팔·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와 이집트·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 77개국에 추가로 출시했다.
아시아 국가 중 인도는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주요 투자처이기도 하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인도 남부에 5년간 150억 달러(약 21조원)를 투자해 총 1GW(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오픈AI는 인도 뉴델리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 1GW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아마존도 2030년까지 인도에 127억 달러(약 18조원)를 투자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게 왜 중요해
AI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투자를 늘리는 건 이 지역이 지닌 잠재력 때문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 높아지는 스마트폰 보급률에 비해 아직 AI 보급률은 낮은 편이다. 이미 AI 사용이 보편화 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지난 9월 오픈AI가 챗GPT 사용 행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와 지난해 4월을 비교했을 때 1인당 GDP 1만~4만 달러 국가들은 고소득 국가들보다 챗GPT 성장률이 더 높았다.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건 높은 가격이다. 주요 빅테크들이 이들 국가에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한 요금제들을 내놓는 이유다. 실제 오픈AI는 지난 8월 인도에 챗GPT 고 요금제를 출시한 이후 유료 구독자 수가 2배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딥시크 등도 낮은 가격을 무기로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의 AI 기업들도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노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합작 법인을 세우며 중동 지역과 협업하고 있는 네이버가 대표적이다. KT 또한 태국의 자스민그룹과 협력해 태국어 LLM(대형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한 가지 언어도 여러 갈래로 분화돼 있어 미·중 주요 기업들이 일일이 현지화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 시장을 한국 AI 기업들이 틈새 시장으로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팩플] 오픈AI ”한국의 AI, 자체 기술 확보와 글로벌 협력 함께 가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d065dc5c-1dd6-4a6a-b49b-a453f20850f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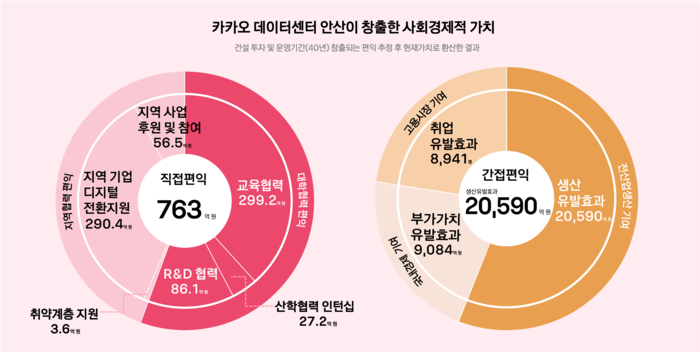

![[ET특징주]지니너스,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 전환 기대에 상승세](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3/news-p.v1.20251023.17b8551c168341d08ac24da915db1db3_P1.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