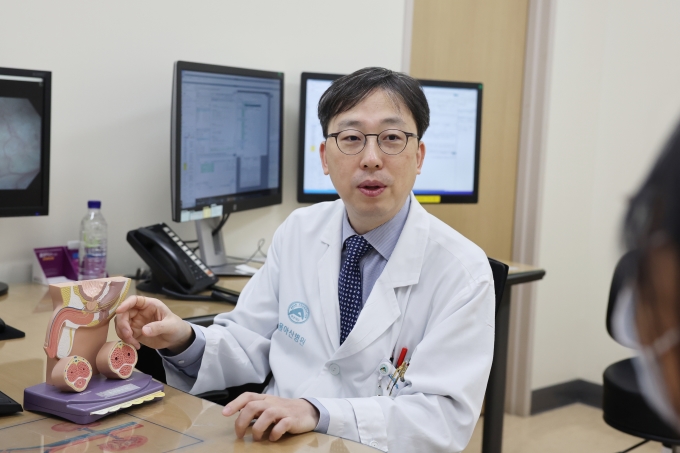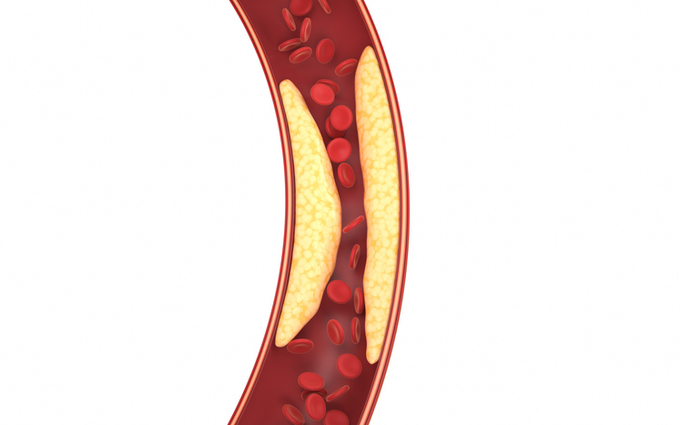환자 골든타임 연장할 수 있는 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뿐
병원 응급실 경험…20년 베테랑
“더 많은 생명 살리고 싶어 전직
병원과 소방 사이 가교역 하고파”
“중증외상, 심정지, 뇌졸중 등 생명이 걸린 부상과 질환의 경우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곳은 병원이 아니에요. 구급차 안입니다. 초동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되면 병원에 도착해도 손을 써볼 수 없어요.”
제주소방안전본부 김민정 소방위(사진)는 지난해 12월 응급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19 구급대원 재직 중 이 자격을 취득한 이는 김 소방위가 처음이다.
응급전문간호사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시술 및 처치를 시행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390여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PA(진료지원) 간호사로 활동한다.
그만큼 자격 취득이 쉽지 않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대학원 석사 과정 이수 자격이 부여되고, 과정 이수 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응급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감내한 이유를 지난달 23일 김 소방위에게 물었다. 그는 “중증응급환자의 생사는 구급대원이 하는 역할에 따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최소한의 제한 시간) 내에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느냐가 생사를 결정해요. 골든타임을 연장할 수 있는 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뿐입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119 구급대원들은 모두 간호사 면허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인 간호사조차도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상황에서 기관절개술 같은 특정 응급처치는 물론 약품의 투약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만 가능해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의사들에게 전화나 영상통화를 먼저 걸어야 합니다.”
응급전문간호사는 응급처치 중 특정 분야에 한해 의사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는다.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과거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던 시기, 도서 벽지 등에서 의사를 대신해 응급 진료를 하기도 했다.
실제 조만간 특정 업무에 한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2024년) 간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 상반기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내부에선 구급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자체 역량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방은 화재 진압이 1순위 전문 분야이다. 의료 영역인 구급 업무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소속기관과 업무 주무 부처가 다른 이런 구조는 구급대원들에게 종종 애로사항을 안긴다. 그중 하나가 교육·훈련이다. 한 소방청 관계자는 “간호법상 전문 간호사의 중요 업무 중 하나가 ‘교육’”이라며 “다른 구급대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성뿐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갖는 자격”이라고 설명했다.
병원과 소방의 가교 역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김 소방위는 말했다. “자격증이 주는 권위라고나 할까요?(웃음) ‘응급실 뺑뺑이’ 중 일부는 병원이 환자에 대한 구급대원의 중증도 판단을 신뢰하지 않아서 생기기도 해요. (전문간호사 자격은) 이런 경우를 줄일 수 있고, 반대로 병원의 입장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는 올해로 20년 차인 베테랑 구급대원이다. 구급대원이 되기 전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병원에서는 구급차로 실려온 환자는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응급처치가 잘 안 됐어요. 내가 여기(응급실)에 있는 것보다 저기(구급차)에 있는 게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떠나 소방서에 왔고, 수년간 모든 휴가와 비번일을 포기해가며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동료와 선후배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왔고, 지금의 ‘119 구급대’를 만들었습니다.”
![[르포] "아파 죽겠는데 한참 기다려야 한대요"…넘치는 환자에 마비된 응급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5/art_17384757094618_8a072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