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달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을 제안했다.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얘기가 한창이던 2023년에도 논의가 이뤄졌던 만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오지선다형 시험으로는, 변하는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를 수 없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논·서술형 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정약용처럼 공부하고, 박지원처럼 생각하세요.
고전학자 정민 한양대(국어국문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다산의 일기장』 『비슷한 것은 가짜다』 등 조선시대 지식인의 삶과 공부법 등을 연구한 책으로 유명한 그는 “과거 시험이야말로 논·서술 시험의 원형”이라고 했다. “다양한 책을 두루 읽으며 습득한 지식에 자기 생각을 더해 논리적으로 써야 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다산 정약용과 연암 박지원의 공부법에 주목했다. 이들의 공부법은 21세기에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논·서술형 시험엔 그 어떤 공부법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공부법은 대체 뭐가 달랐을까? 지난 4일 정 교수를 만나 직접 물었다.

Intro. 논·서술 시험? 과거시험에 답 있다
Part 1.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라
Part 2. 질문을 바꿔라
Part 3. 소리 내서 읽어라
📚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라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 신선한 재료가 필요하듯, 좋은 글을 쓰려면 양질의 지식이 필요하다. 챗GPT에 물으면 1초 만에 답을 알 수 있는 시대라 해도 마찬가지다. 아는 게 많을수록 더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물을수록 더 좋은 답을 얻기 때문이다. 여전히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하는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정 교수는 “무조건 외우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만의 지식으로 소화해서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식을 자기만의 관점으로 계열화하고 정리해서 습득하는 공부법의 1인자는 다산 정약용”이라고 했다.
다산도 주입식 공부를 했다는 얘긴가요?
다산은 ‘문심혜두(文心慧竇)’를 강조했어요. 문심은 글을 읽는 마음, 혜두는 슬기구멍을 뜻해요. 슬기구멍은 정수리 윗부분 정중앙을 말하죠. 갓 태어났을 때는 이 구멍이 말랑말랑한데 크면서 딱딱해져요. 옛사람들은 고집이 생기고 놀기 좋아하면 이 구멍이 막힌다고 생각했답니다. 슬기구멍을 열려면 열심히 글을 익히고, 외워야 한다고 했죠. 다산은 책을 읽고 또 읽어 외우게 되면 슬기구멍이 뚫려 공부머리가 터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많은 책을 다 외웠나요?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69〉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어려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9/news-p.v1.20250219.053bcabacb4b4367b3dc47614f9a4919_P3.jpg)
![[북스&] 외부자 비율 3분의1 넘으면 변화 유발…‘매직 서드’가 세상을 바꾼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1WUGN_1.jpg)
![[북스&] 학습능력 차이, 뇌 활용에 달려…복습·토론 등 '인출연습'이 중요](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9XECE_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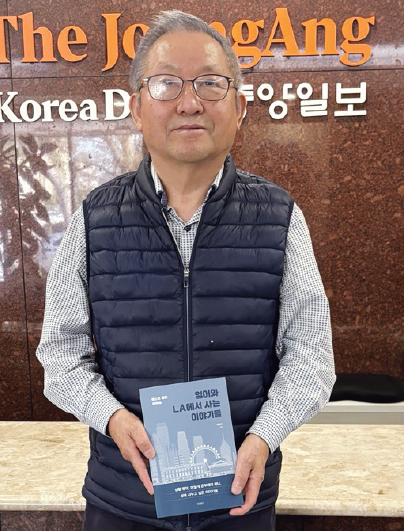
![[북스&] 간결하게 꾸밈없이…자신을 위해 써야 '좋은 글'](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EHSTH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