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면1 2014년 11월 25일 삼성그룹의 방산기업 삼성테크윈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그룹 수뇌부로부터 “한화에 회사를 매각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삼성테크윈 사외이사였던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말고 할 게 없었다. 그룹 수뇌부에서 매각을 결정해 통보했기 때문”이라며 “당시까지 삼성테크윈은 자금 흐름이 견조하던 회사였다. 반도체 산업에 집중하려는 것이 그룹의 매각이 이유였지만 아쉬움이 컸다”고 술회했다. 돈 잘 버는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에 시장은 냉담했다. 삼성테크윈 주가는 ‘빅딜’ 공식 발표(11월 26일) 전날(종가 3만4531원) 대비 이듬해 1월 7일(종가 2만1798원) 37% 하락했다. 내부에서는 “삼성 직원이 더는 아니다”는 낙담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장면2 “그때 DSME(대우조선해양)를 인수했다면 우리는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22년 인수한 직후 거제조선소에 들어가 보니… 참 말을 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 재무상태하며 도크 상태가 처참했거든요. 22년간 주인 없는 회사였으니 오죽하겠어요?” 익명을 원한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 후신) 임원은 이런 말을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2008년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써낸 금액은 6조3000억원. 금융위기 탓에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인수를 접었다. 전화위복이랄까. 한화는 14년 후 3분의 1 가격인 2조원을 내고 인수에 성공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가장 주가가 많이 상승한 글로벌 50대 기업’에 선정된 두 기업 얘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는 3위(시가총액 310억 달러, 164% 증가)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32위(시가총액 170억 달러, 57% 증가)를 각각 기록했다. FT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재무장 후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며 “한화오션은 미국의 해군 함정 수주를 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50대 기업 중 이 둘을 제외한 국내 기업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해운기업 HMM이 유일하다.

괄목상대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걸까. 군용 화약 중심의 부품과 소재 방산 포트폴리오를 지녔던 한화는 2025년 현재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방산그룹으로 거듭났다. 2014년 당시 주력 방산기업이던 ㈜한화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은 5158억원이었지만, 2024년 그룹의 종합방산 핵심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은 1조7319억원으로 3배가 넘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영업이익을 3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가 자신감을 갖는 배경은 무엇일까. 과연 이러한 성장은 지속할 수 있을까.
1. ‘굿 페어런츠’ 이론
삼성 미래전략실은 2014년 당시 삼성테크윈 등 4개사 매각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한화의 요청부터 협상 타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3개월. 삼성테크윈 지분 32.4%(8400억원), 삼성종합화학 지분 57.6%(1조600억원)를 한화에 넘겼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사업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한화그룹의 핵심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한화엔 자주포, 항공기·함정용 엔진, 레이더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의 기술력이 절실했다. 소모성 탄약을 만들어서는 방산기업으로서 미래가 없었다. 1952년 한국화약으로 시작해 1974년 정부에서 방위산업체 지정을 받은 한화는 방산을 주력으로 삼았지만 2012년까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선정하는 글로벌 방산업체 100위권 밖을 맴돌았다. 하지만 빅딜 직후인 2015년 50위로 도약한 데 이어 2023년에는 30위로 성장했다.

2022년 한화그룹은 방산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했다. ㈜한화에서 물적 분할된 방산 부문을 인수했고, 100% 자회사인 한화디펜스를 흡수합병하면서다. “2030년까지 한국형 록히드마틴이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7월 유상증자(2조9188억원)를 통해 해외 생산능력 구축(1조3000억원) 등 미래를 위한 투자금도 마련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올해부터는 미국에 조선소 2곳을 둔 호주 오스탈 지분 확보전에도 나섰다.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남았다면, 이 같은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했을까. 조명현 고려대 교수는 “반도체 중심인 삼성그룹에서는 적자(嫡子) 취급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굿 페어런츠, 즉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식의 상황이 달라지듯이 한화그룹에서 방산기업이 적장자 대우를 받았기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굿 페어런츠’ 이론
경영학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정식 명칭은 ‘코퍼레이트 페어런팅 이론(Corporate Parenting Theory)’이다. 특정 사업부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개념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에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정도로 측정된다.
예컨대 중공업 기업인 두산은 2006년 식품기업인 ㈜대상에 ‘종가집 김치’를 1050억원에 매각했다. 두산으로선 종가집 김치를 운영해 수익을 얻는다고 해서 사업 시너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가집 김치는 2010년대 김치 수출이 늘면서 대상그룹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2. ‘육·해·공’ 컬렉션
![[GAM] ① 미국 자동차 딜러 산업, 하반기 먹구름 드리우나](https://img.newspim.com/news/2025/07/21/250721115418303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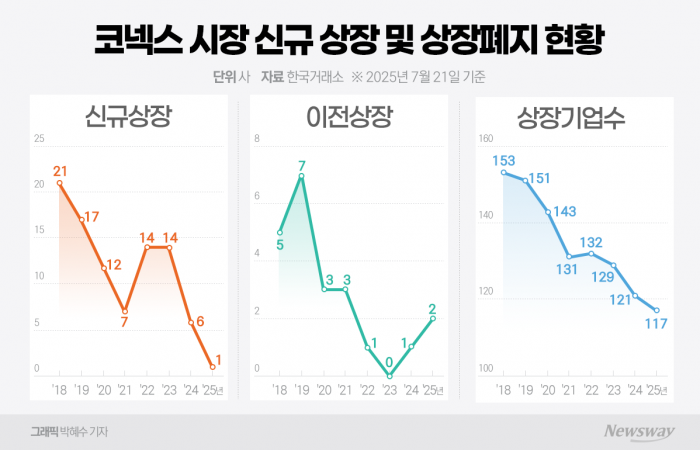

![‘밸류업의 역설’ 자사주 매입 압박에 투자 여력 위축 … 삼성메디슨 상반기 매출 3400억 달성 ‘역대 최고’[AI 프리즘*기업 CEO]](https://newsimg.sedaily.com/2025/07/22/2GVG5SEK13_1.jpg)



![[특징주] 엘에스스팩1호, 코스닥 상장 첫날 +127%대 급등](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8448_877499_1949.jpg)
![가진 돈 16조인데 자사주 매입에 10조 쓴 삼성전자…투자 실탄 마른다[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R9FPOI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