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는 우주보다 복잡하다.’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돼 온 말이다. 인간의 뇌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뉴런)와 100조 개가 넘는 시냅스(뉴런 연결 부위)로 구성된다.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뇌를 비롯한 인체의 신경계통을 연구하는 학문인 신경과학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너무나 많다.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고 화성에 탐사로봇을 보내며 우주의 신비를 벗겨내는 시대가 됐지만 정작 우리 머릿속의 거대한 우주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 이 신비로운 기관의 정체는 언제쯤 밝혀질까. 2013년은 뇌과학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해 4월 집권 2기의 핵심 국정과제로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를 발표했다. ‘뇌 활동 지도(Brain Activity Map)’를 완성하는 연구에 10년간 총 3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10억 유로를 쏟아부어 ‘인간 뇌 프로젝트(Human Brain Project)’의 시동을 걸었다. 21세기 뇌지도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다만 두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전혀 달랐다. 미국은 살아 있는 뇌 속에서 수백억 개의 뉴런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유럽은 더욱 야심 찬 꿈을 꿨다. 슈퍼컴퓨터 안에 인간의 뇌를 통째로 복사해 그대로 옮겨넣는 이른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중국도 뒤늦게 이 흐름에 올라탔다. 2022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중국 정부가 신경과학에 대한 야심 찬 목표 아래 5000명의 연구진을 총동원한 ‘중국 뇌 프로젝트(China Brain Project)’를 개시했으며 향후 5년간 50억 위안(약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과학이 전 세계 경제와 외교·국방을 뒤흔들 거대한 전략 자산이 돼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거대한 흐름에서 한국은 여전히 관중석에 머물러 있다. 2016년 필자를 포함한 국내 연구진이 대규모 뇌융합 챌린지사업을 기획했지만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한국뇌연구원이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은 100억 원 남짓으로 글로벌 흐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뇌지도 구축이 인류에게 가져다줄 미래는 단순한 기술 혁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스위스 로잔연방공대 연구팀은 인간 뇌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디지털 뇌지도를 기반으로 척수마비 환자가 다시 걷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뇌와 척수 간 통신을 무선 디지털 방식으로 다시 연결한 것이다. 개인별 맞춤형 뇌지도가 완성되면 질병 예측, 가상현실 뇌수술 시뮬레이션, 인공지능(AI) 맞춤 치료법 제안이 가능해진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유럽의 인간 뇌 프로젝트는 당초 목표인 ‘인간 뇌 전체 시뮬레이션’을 달성하지 못한 채 2023년 종료됐다. 일각에서는 “돈만 축내고 실패했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오늘날 정밀의학의 토대가 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도 초기에는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받지 않았던가.
뇌는 인류의 마지막 프런티어이자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축이다. 86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가 만드는 경이로운 소우주를 이해하려면 전 인류의 지혜가 필요하다. 더는 관중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김치 유산균 지도가 있듯이, 한국인 고유의 뇌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우리만의 뇌지도 구축에 나서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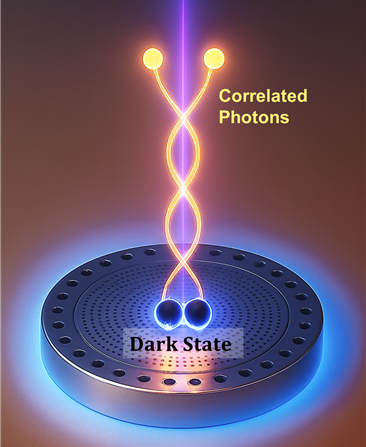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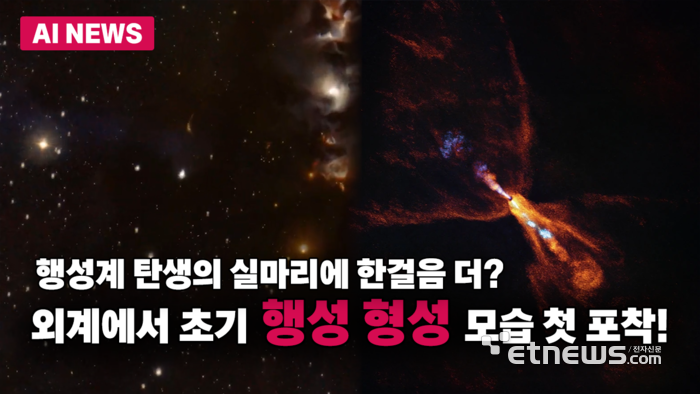


![[ET시론]미중 AI 패권, 기술에서 거버넌스로](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1/news-p.v1.20250801.3a7d0d514d8a4852a3e501b67c5bd53a_P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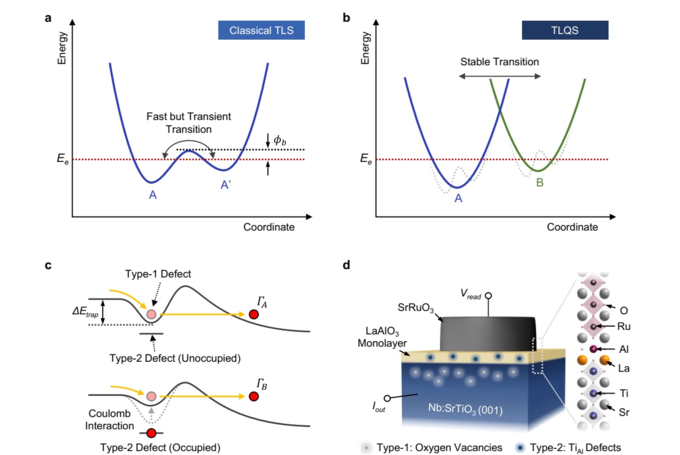

![다 알면서도 방치해온 과학입국 걸림돌[최준호의 사이언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4/6e5d7fc8-210b-4b86-ba0b-702bb5e4d6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