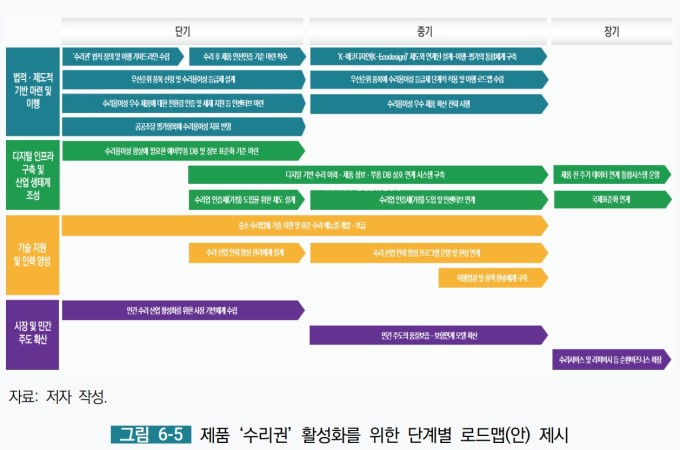농촌진흥청

2024년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가에 큰 피해를 준 벼멸구 대발생은 기후변화 시대 병해충 피해로 인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한국은 지구 온난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다. 1912년 10.5도였던 평균기온이 2020년 13.8도로 3.3도 상승했으며, 2050년에는 16.0도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변화는 국내에 존재하던 병해충의 발생 예측을 어렵게 한다. 국내에는 240여 종의 도열병균 계통이 존재하는데 이들 계통이 각각의 품종과 대응하면서 병 발생에 좋은 기상 조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국제교역과 농산물 교류 확대로 외국의 병해충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 유입된 병해충 35종이 2000년 이후 들어왔다. 기후변화에 더해 새로운 병해충 유입 증가가 국내 농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2015년에 유입, 충주에 대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과수화상병의 예측과 진단, 방제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수행했다. 이를 통해 맞춤형 화상병 예측 모델 K-Maryblyt 및 웹 기반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서비스를 개발했다. 또한 4종의 박테리오파지를 혼합한 화상병 방제용 방제제를 개발했다. 개발된 박테리오파지 제제를 사용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를 4분의 1만 사용하고도 비슷한 수준의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시대 병해충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단계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1단계에서 구축한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 식물병원체 연구 시설(BL3 연구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올해부터 5년 동안 총 496억 원을 투입해 산학연 공동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과수화상병 등의 피해 경감 기술 실용화다. 둘째, 최근 많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큰 병해충의 현장 대응 기술 개발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병해충 디지털 예보시스템 개발이다. 이 사업에서는 병해충 발생 정보 자동 수집 기술, 병해충 고정밀 예측 모델 및 개발지원시스템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 식물병방제과 이세원 과장은 “개발된 기술을 조기에 현장에 적용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병해충 관리에 박차를 가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고] 흙 속까지 읽어내는 스마트 농업](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211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