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로봇수술 대국이다. 2005년 첫 도입 이후 약 37만 건의 수술이 이뤄졌다. 하나의 절개 부위로 하는 단일공 수술은 지난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했다. 기술의 진보를 의료에 적극 활용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 로봇수술 시장을 키운 건 의료적 필요도만은 아닌 듯하다.
로봇수술은 ‘첨단’ 이미지 덕분에 최근 환자 선호도가 높아졌다. 보기 힘든 수술 부위를 크게 확대해 보여주고, 손 떨림을 보완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환자 안전, 비용 효과성 검증은 아직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34개 로봇수술 분야 중 일반수술 대비 효과가 낫다고 입증된 건 전립선암 등 10개뿐이다. 그런데도 일반 수술과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의 로봇수술도 급증하고 있다.

로봇수술 비용은 병원이 정하기 나름이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같은 갑상샘암 수술인데 A 병원은 850만원, B 병원은 3800만원을 받았다. 건보 적용되는 일반 수술은 11만원(환자 부담금)에 불과했다. 결과에 차이가 없는데도 비용은 최대 340배나 차이 난다. 실손보험이 비용을 보장하니 병원도, 환자도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병원 입장에선 수익이 높은 비급여 로봇수술을 늘릴 유인이 크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주요 암 수술이 16% 줄었지만, 로봇수술은 약 30% 늘었다. 의료 현장에서 수익 보전을 위한 ‘고가 수술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과에선 “수련할 때부터 로봇수술 위주로 배워 갈수록 일반 개복수술이나 내시경수술을 못하는 의사가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독점 구조도 문제다. 국내 로봇수술 시장은 사실상 한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인튜이티브의 ‘다빈치’가 유일한 표준처럼 굳어졌다. 한 회사의 장비와 소모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공급이 끊기거나 가격이 올라간다면 필수 수술이 중단될지 모른다. 기술의 독점이 의료의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로봇수술을 20년째 거의 방치하고 있다. 비급여라는 이유로 관리·평가·가격 통제 모두 하지 않고 있다. 그새 의료현장은 로봇수술 만능주의에 젖어간다. 국민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관련 의료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더이상 시장에만 맡겨선 안 된다. 이제는 적절한 테두리를 치고,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비싼 값을 하는지 평가하고 과학적 근거하에 이뤄지게 해야 한다. 로봇수술이 병원의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닌, 진짜 의료 혁신이 되려면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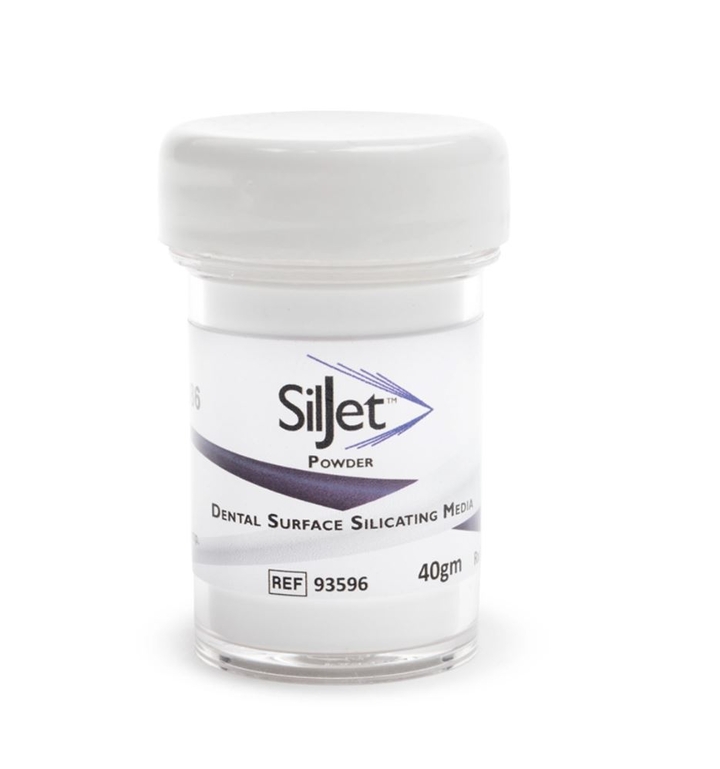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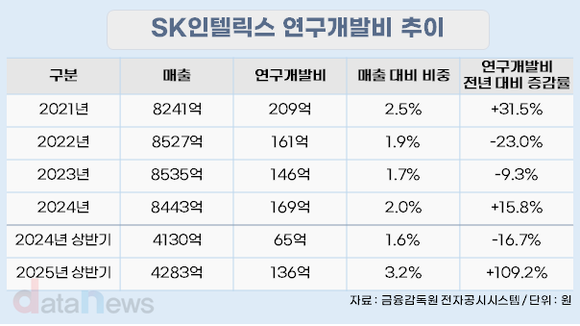


![[전문가칼럼] 자궁경부이형성증,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금 지급 가능성](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shp_175255818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