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
욕실花
김동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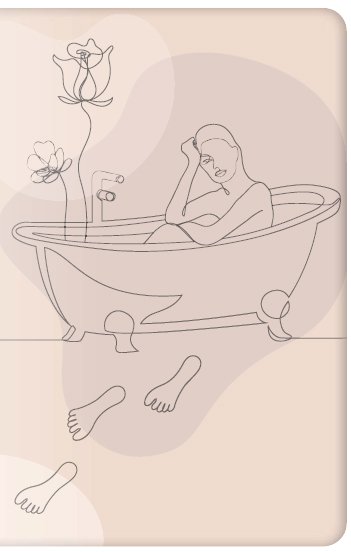
젖은 날에 갇혀서 마른 이름 피어난다
발자국만 맴도는 무명의 한 평 남짓
무대 위 오르는 꿈은 매일 씻겨 나갔다
몸이 마를 틈도 없이 소낙비 내리는 날
밖을 향해 뛰쳐나갈 길고 긴 연습 생활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문다
바닥을 견디면서 부드럽게 휘어지면
뒤집히는 날에도 꿋꿋하게 버텨내
구멍 난 어둠 속에서 내 모습 지켜낸다

차상
캉캉비
허은주
빗물은 힐을 신고 캉캉춤을 추고 있다
치마에 풍경 꼬여 다리가 엇박치면
스텝이 옮겨질수록 초목들은 휘어진다
절규 같은 비의 리듬 타투로 새겨질 때
흘러내린 급경사에 불면 끝은 날카로워
고독은 흙탕물 튀는 꿈길만 다독인다
발목에 프릴 달고 몰려오는 새벽 빛
겹겹이 젖은 마음 훌러덩 뒤집으니
여명은 알고리즘으로 빙글빙글 날 당긴다
차하
철면피
전형우
그곳에 멈춰버린 자동차 스키드마크
타르가 밤을 탐해 감쪽같이 덮으면
뒤엉켜 깊게 팬 자국
가볍게 지워진다
불빛보다 붉어져 포효하는 아스팔트
말 없고 귀도 없는 모퉁이 커브 길에
현수막 뺑소니 찾는
글자만 살아 있다
이달의 심사평
올해의 마지막 응모작과 마주하는 이달은 양적 질적으로 빈약했다. 여전히 시조의 형식에서 한참 먼 작품들, 시적 대상에 대한 천착 없는 피상적 넋두리나 육화되지 않은 감정을 시의 표면에 그대로 노출한 작품들이 많았다. 시는 상상력과 직관력을 필요로 하며, 특히 운문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시조는 시적 메시지를 유추할 수 있는 압축과 함축의 언어 부림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달의 장원으로 ‘욕실花’(김동균)를 선했다. 좁고 어둑하고 젖어 있는 욕실이라는 공간과, 그곳에서만 신는 욕실화를 통해서 절망과 좌절을 거듭하는 시적 화자가 처한 녹록찮은 상황에 ‘꽃’이라는 소망과 갈망의 정서를 대비하여 그려내고 있다. 흡인력 높은 첫 수 초장의 도입과 전개가 인상적이다. 제목을 한글로 썼더라면 ‘신발(靴)’과 ‘꽃(花)’의 중의적 의미로 시가 더 풍성해졌을 것이다.
차상에 오른 ‘캉캉비’(허은주)는 발상의 새로움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비가 내리는 상황, 빗속을 급히 뛰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캉캉 춤으로 보았다. 통통 튀는 경쾌함을 전면에 배치하면서도 “불면 끝”이나 “고독” 같은 비가 주는 우울의 정서를 살짝 깔아 둔 것도 시적 효과를 거두는데 한몫하고 있다. 마지막 수에서 맞춤한 묘사를 찾는데 좀 더 고민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차하로 뽑은 ‘철면피’(전형우)는 흔히 볼 수 있는 도로 위의 스키드마크와 그것을 쉽게 지워버리는 타르작업에, 용납 못할 잘못이나 부정을 묵인, 혹은 묻어버리는 사회적 현실을 빗대고 있다. 첫째 수의 종장 “지워진다”와 마무리의 “살아 있다”가 돌올(突兀)한 대구를 이루면서 입체적 효과를 꾀한 점은 좋은 작법이라고 하겠다. 제목이 내용보다 무거운 듯하여 불안정한 느낌이 드는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 이 지면이 내년에는 더 풍성하고 알찬 시조의 경연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심사위원 서숙희(대표집필) 정혜숙
초대시조
궁체 쓰는 가을날
이화우
가지런히 세로획이 옥판지에 들어서고
비질하는 청묵 속에 발묵으로 오는 단풍
앞서서 돌돌 마르며 바삭이는 자음들
가느다란 협서挾書 끝에 매달려 피는 주사朱砂
아득히 멀어지다 귀에 모인 안부인가
깊숙이 처마에 드는 가을날의 잰걸음
◆이화우

경북 경주 출생, 2006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등단. 이호우시조문학상 신인상 수상. 시조집 『하닥』, 『동해남부선』, 『먹물을 받아내는 화선지처럼』.
가을은 누구에게나 각별하게 오는 것 같다. ‘비질하는 청묵 속에 발묵으로 오는 단풍’ 이라니, ‘가지런히 세로획이 옥판지에 들어서고’ ‘앞서서 돌돌 마르며 바삭이는 자음들’로 가을을 묘사하는 한 행 한 행이 독자를 상상 속으로 끌고 간다. ‘궁체 쓰는 가을날’, 이 제목이 주는 고전의 가을 이미지가 특별하다.
사전을 꺼내놓고 ‘옥판지’와 ‘청묵’ ‘발묵’‘협서’와 ‘주사’가 무엇인지 알고 난 후에야 다시 이 작품을 대면한다면 시인이 느끼는 가을의 풍경이 얼마나 그윽하게 행간을 넓히며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고전적 용어가 주는 가을의 궁체를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발묵’은 먹물이 번져 천천히 스미게 하는 산수화법의 하나이며 ‘청묵’은 소나무 등을 태울 때 생기는 그을음을 아교로 굳혀 만든 송연묵인데 약간 청색을 띈다고 청묵으로 불린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비질하는 청묵 속에 발묵으로 오는 단풍’이라는 비유와 ‘깊숙이 처마에 드는 가을볕의 잰걸음’이 주는 시각과 청각의 묘한 조화가 우리의 눈과 귀를 그윽하게 만들 것이다.
‘가느다란 협서挾書 끝에 매달려 피는 주사朱砂’ 는 독자들의 손끝에서 피어나길 바라본다.
시조시인 손영희
![[詩가 있는 아침] 늙은 호두나무 연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4986263479_e06ecf.jpg)
![[오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 미망(未妄)과 미망(迷妄). 그리고 미망(彌望)의 관계에 대하여](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496572766_1f2f03.jpg)
![[신간] 이시카와 다쿠보쿠 단카집 '내 머릿속에 절벽 있어서'](https://img.newspim.com/news/2024/11/25/2411251332332160.jpg)
![[소년중앙] 첫눈엔 귀여운데 뜯어보면 기이한 독창적인 판타지 세계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5/32d8be77-15a6-46da-8cc4-1d26dd3fa67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