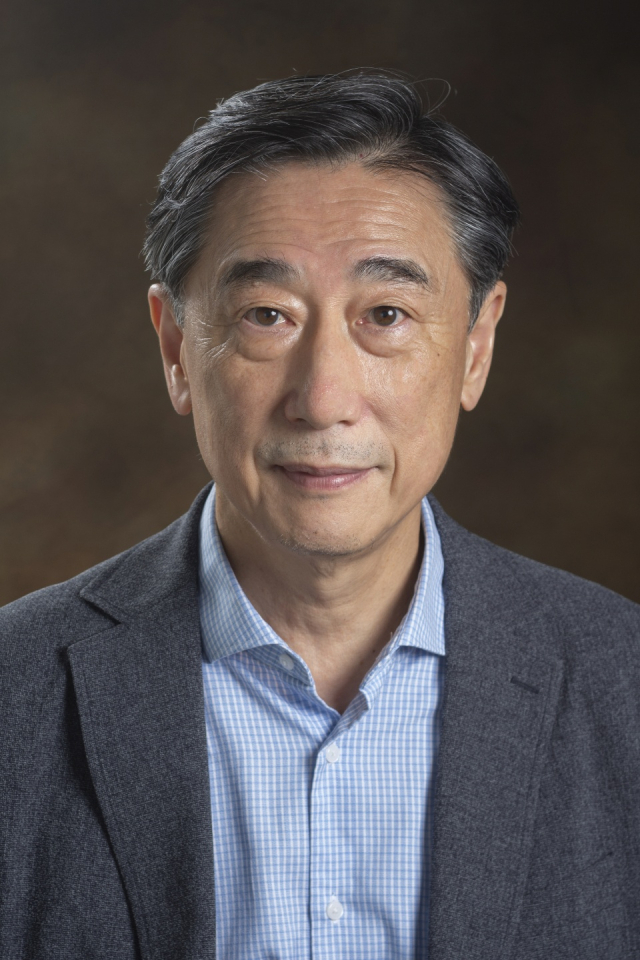
외교관 시절 첫 해외 근무를 위해 1985년 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아침에 ‘뉴욕타임스’를 읽는데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너럴모터스(GM) 시장점유율이 이제 50%밖에 안 된다’는 제목이었다. 어떤 상품이든 점유율이 50%면 대단한 일인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읽어 내려갔다. 수십 년간 캐딜락·올스모빌 등 GM의 5대 브랜드는 미국 자동차 시장을 석권했었는데 5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뉴스거리였다. 지난해 GM의 미국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17% 수준이고, 그중 절반 정도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제조됐다.
이렇게 된 것은 물론 미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일본·독일·한국 등이 가격 대비 품질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면서 자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축소된 것이다. ‘값싸고 품질 좋다’는 조건은 자본주의경제의 무서운 키워드다. 값이 싸거나 품질이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쟁을 통한 문명의 발전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직 포뮬러’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사람을 쥐어짜는 비인간적 게임 규칙이다.
과거에 모든 분야에서 최고이던 미국으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론적으로는 정보기술(IT)과 우주항공처럼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집중하면서 현실에 적응하는 게 정답일 것이다. 하지만 ‘적응’에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계층이 있게 마련이고 이들을 지원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장기적 국익보다 단기적 이해에 집중하게 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그러면 관세를 부과해 수입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과거 우리의 외국영화 수입 규제처럼 어떤 경우에는 국내 산업 보호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과 같이 특정 국가의 수입품 전체에 징벌적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회복 계기를 마련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미국의 리더십과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역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기적 국익과 정치적 고려 간의 갈등은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투표를 통해 임기가 정해진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 사회에서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몇십 년 후 인류의 미래보다는 몇 년 후 선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앞날에 중요하지만 눈앞의 경제적 비용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는 데는 소극적이다. 국제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대방의 이익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게 당연한데 마치 우리에게만 성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다. 삶이 어려운 국민들은 거시적 비전보다는 당장 소득을 높여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후보에게 표를 준다.
오늘날 전 세계 국가의 70% 정도가 부분적으로라도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는 오랜 시민 정신에 바탕을 둔 경우보다 신흥 민주 사회가 더 많다. 따라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성숙한 민주국가들이 보다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단기적 이기주의는 결국 모두에게 손해라는 교훈을 체질화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관세전쟁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남겨주고 끝나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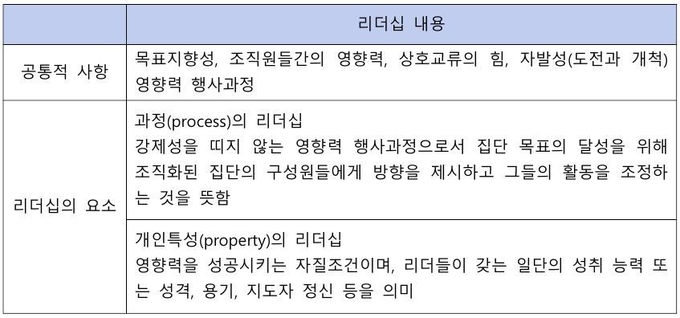

!["中 벗어나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개발 '맞손'…“약값 59% 인하” 트럼프에 신약은 ‘부담’ 시밀러는 ‘기회’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5/13/2GSS5F7NR8_1.jpg)


![[사설] 드론얼라이언스에 기대 크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3/news-a.v1.20250513.42a2b34898b04b439aa066693480afea_T1.jpg)
![[목요일 아침에] 리콴유·세종대왕의 행정 혁신 리더십](https://newsimg.sedaily.com/2025/05/14/2GSSNR4QVS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