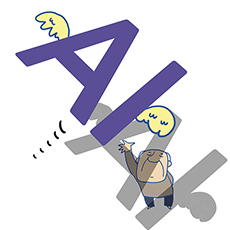
세상이 온통 AI(인공지능) 얘기다. 일상생활에서부터 교육이며 산업현장, 미디어, 의료, 투자결정에 이르기까지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없다. 음식점에서 키오스크 주문을 못하면 ‘밥도 굶게 생겼다’는 우스개 말이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그건 고전이다. 챗GPT 같은 생성형AI가 나오고, 한 걸음 더 나간 피지컬AI가 거론된다. 요즘 전주시내에는 피지컬AI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홍보가 요란하다.
노인들 입장에선 세상이 어지럽다. 눈만 뜨고 일어나면 확 달라져 있어 무서울 정도다. 그 속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얼마 전까지 손만 흔들면 잡을 수있던 택시도 이제 호출앱을 깔지 않고 타기 힘들어졌다. 노인들이 많이 타는 시내버스 요금도 현금 결제 비율이 1%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년층을 비롯해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은 더욱 소외되고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19일 공개한 ‘1차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조사’는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9∼10월 만 18세 이상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내용은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측정했다. 예컨대, ‘카카오톡으로 받은 온라인 청첩장 확인해 결혼식장 찾아가기’ ‘기차표 앱으로 부산에서 서울 가는 표 예매하기’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 주문하기’ ‘은행 앱으로 송금하기’ 등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을 수준1부터 수준4까지 4단계로 구분했다.
수준1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을 어려워하는 수준’이며 수준4는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해 다양한 문제 해결이 원활한 수준’이다. 조사에서 ‘수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2%였다. 100명 중 8명이 디지털 문맹인 셈이다. 전체 성인 가운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40.4%였는데, 60대 이상이 77.7%였다. 학력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디지털 문해능력이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개인의 디지털 역량 차이는 소득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의 건전성과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초중고 교육은 물론이려니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졌다. 노인복지관이나 거점 경로당, 대학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해 AI와 디지털 교육을 지원했으면 한다. 학습장과 강사 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표방했다. 이 목표도 디지털 격차를 극복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조상진 논설고문)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령층 #AI #디지털
조상진 chosj@jjan.kr
다른기사보기
![[열린마당] AI시대, 무엇을 잃고 있는가](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0/20250820516582.jpg)


![[기고] 창업생태계 혁신을 위한 AI 멘토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9/news-p.v1.20250819.aeefb91895e1425db000544b4d826231_P3.png)

![[IITP 리뷰원]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기술 '공간오믹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0/news-p.v1.20250820.e6109d158da04a53aa69800e1ce58ff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