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전 영국에서 유학할 때였다. 지도교수에게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독일인으로 영국 땅에 와서 교수가 되었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프로페서가 되었기에 그가 어떤 학위논문을 썼는지 궁금했다. 그는 런던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논문 제목이 “센티멘털리즘에 대하여”였다.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파이낸스와 법 대학원의 교수가 되었다는 점도 그렇고, 센티멘털리즘에 관한 학위논문을 쓰고서 지적 재산권 분야 저명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이 당시 나로서는 적잖이 충격이었다.
인공지능이 만능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다. AI를 투영하지 않은 분야는 없는 듯하다. AI리터러시, AI와 학문, AI와 사회복지, AI저널리즘, AI시대의 창작, AI기반 광고전략, AI로 PR하기, AI와 디자이너의 변화, AI시대 소통의 기술, AI시대의 번역, AI와 철학의 전환 등 출간된 책 제목들을 보아도 세상의 창은 AI가 되었다. 그 뿐 아니다. ‘AI윤리에 대한 모든 것’,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가’,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4차 산업혁명시대 AI와 일자리 경쟁 그리고 공존’ 등 인공지능 시대를 진단하며 AI로 인해 도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책들도 앞 다투어 출간되고 있다.
AI가 우리 삶에 밀착되면서 ‘리버럴 아츠(Liberal Arts)’에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배우는 학문으로 일컬어지는 리버럴 아츠는 원래 고대 그리스 시대의 자유시민을 위한 학문이었다. 문법과 변증법, 수사학, 산술, 음악, 천문, 기하학의 일곱 과목이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여 고정관념이나 생각의 틀을 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오늘날 리버럴 아츠를 교육하는 학부과정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인문학과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도 가르치며, 다양한 전공으로 학문적 융합을 시도하기도 한다.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방대한 지식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게 된 지금, 왜 사람들은 리버럴 아츠에 관심을 갖는 것인가? 각 분야마다 AI와의 융합을 모색할수록 AI의 미래와 실체는 더 모호해지고,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된 것은 아닌지.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이자 철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넥서스」(2024)에서 인류 역사를 정보 네트워크로 분석함으로써 AI의 실체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우리가 과연 호모 사피엔스인지 질문하며, 왜 우리는 정보와 힘을 축적하는 데는 뛰어나면서 지혜를 얻는 데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는지 생각하게 한다. 우리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해 온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대규모로 유연하게 협력(nexux)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AI 등장으로 인해 우리는 유기적 정보 네트워크에서 비유기적 정보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동안은 인간의 뇌에 의존해 정보를 처리해왔지만,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난 3월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강연한 유발 하라리 교수는 AI는 인간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AI는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역사는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역사는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AI시대를 열어가는 지금, 리버럴 아츠를 통한 인간의 상상력과 사고력, 감수성과 창의력이 어떻게, 왜 중요한지 공감하게 되는 대목이다.
![[에듀플러스][선배에게 듣는 진학상담]〈54〉성균관대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기술 통해 새로운 문화 트렌드만들고 상업화하는 법 배워”](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31/news-p.v1.20250331.a2ac65fbe3674256b01e5f88e814fdf9_P1.jpg)
![프리윌린, 수학 넘어 언어·자격증까지…AI로 출제영역 확 넓혀[스케일업 리포트]](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UKKUQL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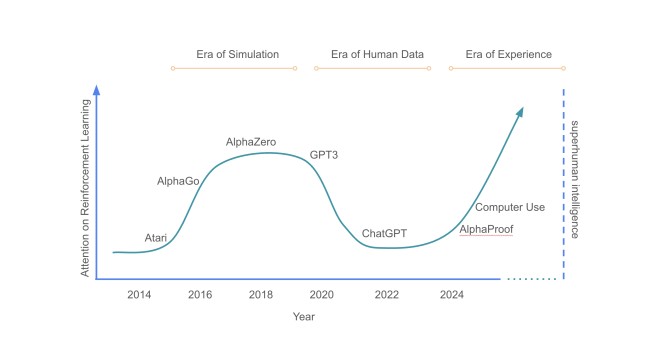
![[에듀플러스]교사가 직접 쓴 에듀테크 활용 지침서 나와…에듀테크스쿨·에듀플러스 '교사들의 에듀테크 활용 바이블' 발간](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23/news-p.v1.20250423.4571e4f54b064cea81ad5e31f45c6027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