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지난 겨울, 감기약 하나 구하기 어려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약국마다 품절 사태가 이어졌다. 감기약, 해열제, 일부 항생제 등 특정 의약품이 지역별로 동나면서, 환자들은 병원을 돌며 약을 찾아다녀야 했다.
문제는 단순한 수요 폭증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업체는 대부분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의약품은 해외에서 제조된 완제품에 가까운 형태로 공급된다.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이슈로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국내 약국에서 곧바로 약이 사라지는 이유다.
국내 완제의약품 자급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하며, 수익성이 낮은 품목의 경우 제조사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특정 업체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 시스템도 부족하다. 결국 일선 약국에서는 처방된 약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환자가 약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일이 반복된다.
공급망 구조 자체도 취약하다. 대부분의 생산과 물류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한 곳에서 병목이 발생하면 전체 공급이 지연된다. 산업공학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산형 재고 시스템, 다원화된 공급처 확보, 우선순위 기반 재고관리 등의 전략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약국 단위의 자동 발주 시스템이나 재고 분석 시스템도 일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수요 예측은 여전히 제약회사 중심이고, 실제 복용자 수나 처방 트렌드 같은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유행, 계절 변화, 고령화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민첩하고 정교한 수요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약국에서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은 단순한 소비자 불편을 넘어선다. 이는 공공의료 체계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감기약 하나를 둘러싼 물류 시스템의 허점은, 우리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제는 병목을 해소하고 유연한 공급망을 설계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 청년서포터즈 8기 박서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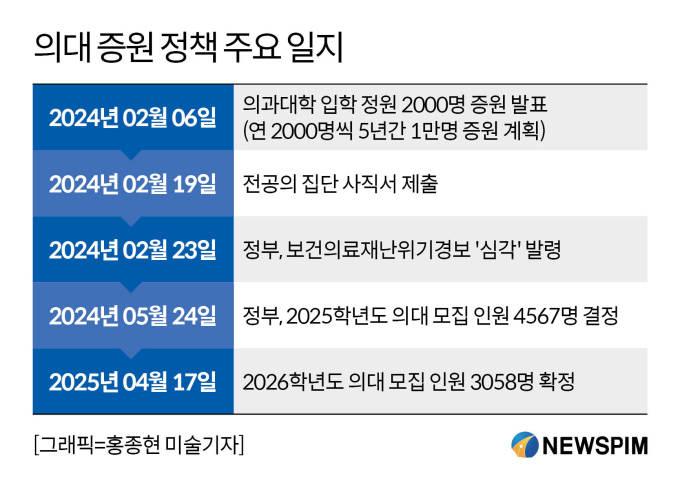
![[에디터 프리즘] 트럼프의 항복? 시진핑의 항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4/19/c075d05f-c130-4f17-9fd3-ad544d0101f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