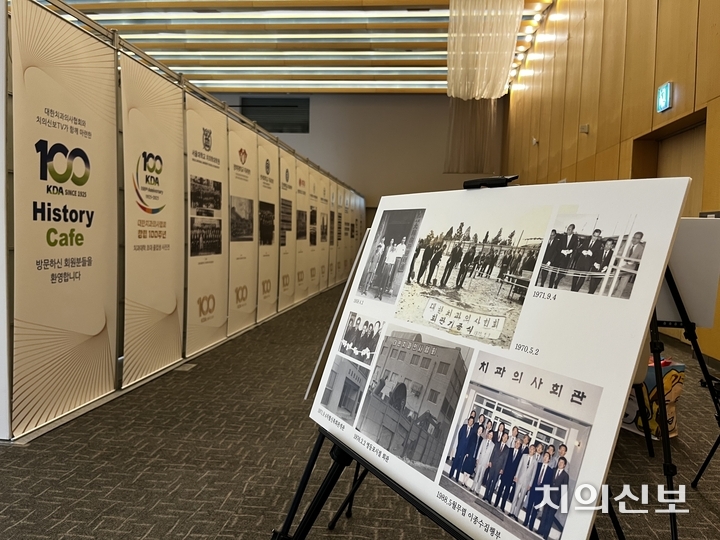출연: 전호태, 최미선
2025년 3월부터 울산저널TV 유튜브 방송에 <인문톡쇼>가 신설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전호태 울산대학교 명예교수와 인문학 운동가 최미선 한약사가 만나 매달 한 차례씩 깊이 있는 지식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유튜브 영상은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미선(이하 최): 안녕하세요. 다양한 주제의 역사와 인문 지식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인문톡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호태(이하 전): 네, 안녕하세요.
최: 네. 누구신지요?
전: 예, 저는 전호태라고 합니다.
최: 네. 저는 최미선입니다. 오늘은 ‘눈’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과 나눠볼까 하는데요. 눈 하니까 저는 교수님의 최근 나온 사진에세이 생각이 나거든요. 표지에 있는 감은 눈에 불상 같지만 불상이 아닌 듯한 그런 표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책에 관해 얘기해 주세요.
자기의 내면을 향한 눈, 전호태와 르동의 <감은 눈>
전: 이게 제 사진에세이 시리즈의 5번인데요. 5번에 시작한 시가 <감은 눈>이에요. 감은 눈의 주제는 표지하고는 달리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모셔져 있는 반가사유상을 굿즈로 개발해서 커다란 인형을 전시장 옆에 딱 두 개를 설치해 놨는데, 감은 눈의 이미지가 거기서 확 닿아서 일종의 명상하는 자세이잖아요.
자기의 내면을 향한 그 눈의 이미지를 책의 제목과 닿게 하는 다른 작품이 있을까 하다가, 박물관의 사유방 근처에 인도 동남아시아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13세기 캄보디아의 크메르 왕국 당시에 자야바르만 7세라는 유명한 왕이 앙코르와트를 본격적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놓인 상 중의 하나가 힌두교의 우마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 우마 여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그걸 표지로 넣었죠.
최: 저는 감은 눈 하면 르동이라는 화가의 <감은 눈>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을 보고 나서 감은 눈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뜬 계기가 되었거든요.
전: 그 작품도 역시 그 눈은 자신의 내면으로 향했겠죠?
최: 그렇죠. 그 작품 앞에 섰을 때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전: 왜요?
최: 눈을 감고 자기만의 세상에 빠진 그 작품 앞에서 저는 소외가 되었다는 느낌과 함께 어디에 가 있을까, 이 가문의 사람은.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 감은 눈이라는 작품들을 많이 찾아보곤 했었는데 마침 교수님의 이 <감은 눈>이라는 에세이가 나와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눈을 통해 세상과 진실을 본다는 의미에서 눈은 신앙의 대상
전: 눈의 이미지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바로 유적 유물과 연결이 되는데. 이 눈이라는 게 인간이 인지가 발달하면서 신앙 대상으로 삼았던 특정한 신체의 부분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기원전 3700년경에, 지금부터는 거의 6천 년 전이네요, 그 시기에 시리아의 텔브락이라는, 유전 지대이기도 한데, 그 일대에 아주 오래된 신전, 브락 신전에서 눈 모형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돼서, 한 1천 개 정도가 발견됐거든요.
최: 그게 뭘 의미하죠?
전: 눈 신상(神像)인 거죠. 그래서 그 사원의 이름도 ‘눈 사원’이라고 불러요.
최: 특별히 눈을 이렇게 신성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 눈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본다는 게 안다는 것과 직결하고 있잖아요. 안다는 그 사실로부터 신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면 신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든가 그와 연관된 신께서 진실을 볼 수 있게 해 주신다. 진실을 보는 예언자의 눈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그다음 시간대에 어떤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최: 지켜보는 것?
전: 예. 지금도 터키에 가면 (나자르) 본주라는 부적이 있어요. 눈 모양으로 만들었죠. 처음 보는 사람은 굉장히 낯설고 두려운 느낌이 있는데, 눈 자체를 펜던트처럼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녀요.
최: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전: 그렇죠.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최: 일차적으로 눈이 보이는 것, 보여주는 것, 아는 것, 이런 걸 상징한다면 눈을 감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지식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고.
전: 최 대표는 감은 눈과 관련된 거로 다른 게 또 떠오르는 게 없나요?
오이디푸스의 감은 눈은 처참한 진실을 마주한 명민한 인간의 선택
최: 저는 감은 눈 하면, 오이디푸스가 마지막에 자기 눈을 찌르잖아요.
전: 아, 그렇죠.
최: 그 오이디푸스가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명민한 인간이잖아요. 이성적인 사유. 스핑크스가 낸 문제를 척척 알아맞히고 스핑크스가 자살해.
전: 처음으로 유일하게 맞췄죠.
최: 자살하게끔 만든 인간이 바로 오이디푸스잖아요. 그렇게 명민한 인간이 그 명민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얽혀진 비밀을 하나둘 풀어나가다 보니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진실을 마주하고 나서,
전: 자기의 신탁을 알게 된 그거?
최: 그렇죠. 자기 눈을 찔러버리죠. 그리고 가장 똑똑한 인간이었던 이 사람이 신성을, 눈을 찌름으로써 획득하거든요.
전: 아, 그런 면도 있겠네요.
최: 그래서 이 눈이 가지는 것, 눈 뜬 자와 눈을 감은 자, 이렇게 대비되는 선명한 이미지를 가진 게 오이디푸스였거든요, 저한테는.
전 세계의 신화에서 눈을 신앙 대상화, 반면 눈은 두려운 대상이기도
전: 그렇군요. 눈 하면은 유적 유물에 나오는 눈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제가 암각화를 연구하면서 상주 물량리에서 눈을 아주 강조해서 눈 외에는 몸이 다른 부분이 잘 보이지 않게 그렇게 암각화를 새긴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도 썼는데 그런 걸 보면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사회가 눈을 신앙 대상화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는 오랜 기간 많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사례들이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신화에, 북유럽 바이킹 신화부터 우리 한국까지 눈과 관련된 신화적인 이미지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의 마음속 깊이, 심상 깊이 새겨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 한편 눈 하면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전: 악마의 눈도 있어요.
최: 악마의 눈도 있고 감시의 눈도 있고.
전: 그런 것들. 빅브라더 같은.
최: 그렇죠. 곳곳에 CCTV. 이게 우리를 감시하는 눈처럼 여겨지잖아요.
전: 실제 그렇죠.
최: 그래서 눈 하면 이미지가 결코 선명하고 맑고 깨끗한 이미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점점점 우리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아.
전: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실제 눈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그 역할도 매우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예술 작품에서 보는 눈에 대한 생각도 한 번쯤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의학에서 눈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진단 수단
최: 한의학적으로는 눈 하면 건강 상태를 바라보는 진단 수단으로 보거든요. 진단의 창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진단의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 역할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눈을 통해서 건강 진단을 많이 하는데 특히 간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게 눈이 아주 좋은 진단 수단이다.
전: 예전에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모든 것들이. 눈이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눈이 그의 영혼과 잇닿아서 그대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눈이 맑아서 아주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본인이 하기 나름이겠죠.
눈에 관한 다른 것들을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공작을 보면 공작의 꼬리 깃털이 눈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백 개의 눈이라는 이미지인데, 그런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 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신의 눈으로 보인다. 이런 이미지가 기독교부터 힌두교까지 모든 종교에 다 담겨서 결국은 그것이 상당히 많은 유물에 나타나요.
그리스의 오래된 토기, 지금부터 3천 년 된 토기 이런 데도 보면 눈이 또렷하게 표현돼 있고 이집트의 오래된 상형 문자 같은 데도 눈들이 나타나 있어요. 바이킹 신화 같은 데서도 눈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미지로 여전히 우리들 속에 남아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마 최 대표가 봐왔던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도 실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눈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최: 많이 있죠. 저는 그래서 천 개의 눈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 인간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 개 눈은 500명의 눈인데 이 천 개의 눈을 가져야만 무엇인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전: 그거 불교 얘기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 중에 천수 천안 보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세음보살이 자신의 신격을 드러내는 방식 중의 하나예요. 천 개의 손에 천 개의 눈이 있어요. 그걸로 모든 세상 사람, 이른바 중생이라 불리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아쉬움,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태들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3의 눈이라든가 외눈박이라든가, 이런 눈과 관련된 신화, 전설의 관례들이 상당히 깊숙이 현재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천 개의 눈을 가지기 위해 독서 토론을 하자. 책에는 수많은 눈이 모여 있다
최: 저도 천 개의 눈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심안이 열려 있으면 됩니다.
최: 천 개의 눈을 가지기 위한 방식으로 저는 독서 토론을 제안하거든요. 책 한 권을 읽고 수많은 눈이 모여서 자기가 읽었던 바를 얘기하다 보면 내가 가지지 못했던 다른 눈들을 가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우리가 천 개의 눈을 가지는 방법은 이렇게 모여서 담론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 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 눈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
전: 그러죠.
최: 재미있었습니다, 교수님.
전: 네.
이민정 기자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오기의 문화기행] 압셍트](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410/p1065622156699578_706_thu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