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의 마침표를 찍자마자 다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꾸려졌다. 이번에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 하면서 미뤄뒀던 구조개혁을 서두르자는 취지다. 구조개혁은 간단치 않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완전히 다른 제도들을 아울러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만드는 작업이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제도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수개혁 못지않게 기나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이 자동으로 바뀌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의견이 크게 갈린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추진하면서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해 기존 수급자의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방식의 자동조정장치를 넣으려 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자동삭감장치’라며 맞섰다.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타가는 수급자는 급증하는 추세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고, 쌓인 기금을 헐어 쓰면서도 기존 수급자의 연금만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또박또박 올려줄 수는 없을 것이다. 개혁 과정에서 가입자들이 부담을 더 진 만큼, 수급자들도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정부 주장처럼 자동조정장치를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러야 2036년에나 가동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입법화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위기만을 논하지만, 공무원·군인연금 재정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기금이 거의 바닥났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기준 연금으로 내줄 급여액(21조9458억원)보다 보험료 수입(14조5407억원)이 7조4051억원이나 모자랐다. 군인연금은 2조158억원 부족했다. 1년간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내주려면 약 10조원의 국민 혈세를 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재정 파탄 위기인 특수직역연금은 놔두고 왜 국민연금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하느냐”(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국민연금에 앞서 공무원·군인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먼저 도입해보자는 일각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다층적 연금제도의 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자동조정장치는 당장 막대한 국고 보전금이 들어가는 공무원·군인연금에 적용해보자는 것이다.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묘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연말에 나오는 실손보험, '갈아타기' 수요 얼마나…보이지 않는 '묘수' [5세대 실손]](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505706_1480207_m_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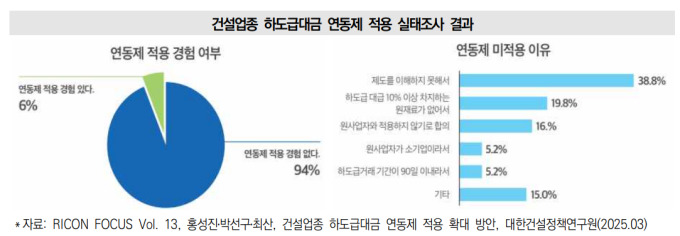
![[데스크 칼럼] 신뢰를 잃고 전략 없이 성공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689456317_0d576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