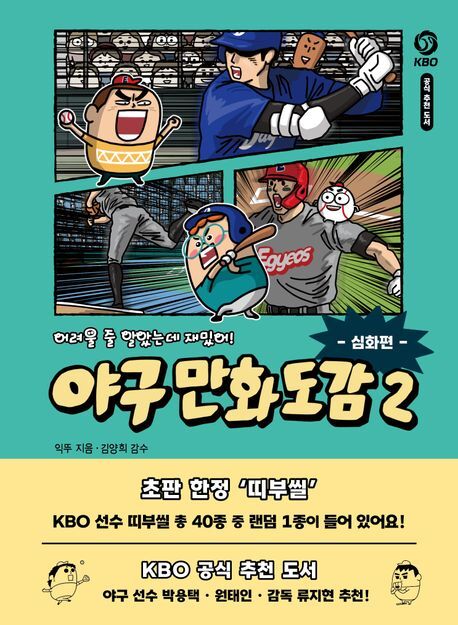미디어 프런티어: K를 넘어서

※AI로 생성한 팟캐스트 오디오입니다.

그저 또 하나의 인기 만화려니, 별것 아니라 여겼던 관객들마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스크린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객석의 불이 켜지자 서로의 붉어진 눈시울을 확인하고 멋쩍게 웃으면 눈인사를 주고받는다.
한국에서만 400만을 넘어섰다. 기실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 폭발적인 흥행 뒤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전환이 가장 늦었던 나라’ 일본의 아날로그식 IP 육성 시스템이 있다. 한때 낡고 비효율적이라 여겨졌던 이 견고한 시스템이 글로벌 디지털 시장과 만나자, 그 어떤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IP 괴물’을 탄생시키며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 웅비(雄飛)하고 있다. ‘귀멸의 칼날’은 그 시스템의 가장 완벽한 결과물이자, 동시에 그 시스템을 한 단계 진화시킨 혁신의 아이콘임에 분명하다.

철옹성 같던 日 IP 성공 공식: 단행본이란 절대 반지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은 출판 제국에서 시작됐다. 챔프와 같은 만화 잡지가 대표 사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단행본 사업이 그들의 핵심 사업이었다. 잡지는 단행본으로 제작할 만한 작품을 선별하는 과정이자, 단행본을 할 만한 것들을 키워내는 일종의 R&D 플랫폼이었을 뿐이다. 잡지로 적자를 보지만, 단행본으로 이익을 챙기는 구조였다. 그러기에 실패할 작품을 조기에 걸러내기 위해 독자 엽서와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잔혹할 정도의 승강제를 실시했었다.
서너 번 기회를 주었지만, 독자들의 반응이 좋지 못하면 바로 퇴출하는 시스템, 그래서 우린 종종 채 스토리가 진행되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마무리되는 작품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신진 작가와 1:1로 매칭된 담당 편집자의 주된 일이 혹독한 담금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숙련된 편집자는 단순 교정자를 넘어 스토리의 방향을 조언하고 작가의 성장을 관리하는 프로듀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 혹독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이 곧 단행본의 가치였고, 수익의 담보였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 공고한 잡지 - 단행본 시스템도 디지털 전환의 파고 앞에서 스러지는 듯 보였다. 실제로 종이 잡지 판매 부수는 급감했다. 주간 소년 챔프의 경우 1995년 주간 653만 부가 판매되었지만, 2023년에는 110만 부에 불과할 정도다. 그러니 디지털은 강력한 유통 채널로 등장했다. 2005년 5864억 엔이었던 전체 만화 시장 규모는 2024년 6937억 엔으로 늘었다. 이 중에서 디지털은 4830억 엔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디지털 만화 플랫폼을 통해 종이책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 독자에게 단행본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종이 시장의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며 출판 제국의 기반은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다. 이 상황에서도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작품을 걸러내는 혹독한 프로세스는 오히려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