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을 부르는 물건’의 진화
새해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조리(쌀을 씻을 때 잔돌을 걸러내는 대나무채 도구)를 새로 사서 ‘복조리’라고 부르고 쌀알만큼 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벽에 걸었다. 그리고 새해 선물로 ‘복주머니’를 가족·친지와 주고받았다. 둥그런 두루주머니나 각진 귀주머니에 장수와 부귀를 뜻하는 글자와 십장생·모란 무늬 등을 곱게 수놓았다. 또다른 새해 선물로 세화(歲畵)도 있었다. 도화서에서 그려 바친 상서로운 그림을 임금이 신하들에게 하사했다고 하는데, 세화 선물 풍속은 민간에도 퍼져 민화의 발달을 촉진했다. 오늘날에는 이런 전통이 얼핏 사라진 듯 보이지만 그 바탕에 있는 기복(祈福)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은 생활용품 가게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운 상승 그림” “복을 부르는 상품”을 판다. 전통의 묘한 진화인 셈이다.

14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한 인테리어 소품 가게. 소위 ‘이발소 그림’이라 불리는 무명 화가의 장식용 그림 액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런데 유난히 해바라기 그림이 많다. 근처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모방한 것일까?
답은 “재물과 행운을 부르는 그림”이라는 가게 푯말에 숨겨져 있다. 유튜브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그림을 걸어두세요” “집안에 이런 그림을 두면 나간 돈도 들어온다” 같은 제목의 ‘풍수 인테리어’ 영상을 보면 해바라기 그림이 단골로 나온다. 정작 ‘해바라기의 화가’ 반 고흐는 평생 가난하고 불행했다가 사후에야 영광을 얻은 예술가의 대명사임을 생각하면 얄궂다.

“해바라기는 본래 우리 전통에서는 언제나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에 충신의 의미로 쓰였는데 현대에 와서는 다른 의미가 혼합된 것 같다”고 미술사학자 정병모 전 경주대 교수는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나 복(福)을 부르는 그림을 사거나 선물하는 것은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즘 민화 그리기와 함께 세화(歲畵)도 다시 유행하고 있다.” 그는 현재 온라인으로 민화 대중 교육을 하는 한국민화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선 후기 김매순이 한양의 세시풍속을 집대성한 『열양세시기』(1819)에 따르면, “도화서에서 (임금께) 세화를 바치면 금갑신장(금갑옷을 입은 두 장군의 화상)은 궁전 문에 붙이고 선인(仙人)과 닭, 호랑이 그림은 벽에 붙이고 혹 외척과 신하의 사가(私家)에도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때 금갑신장 그림은 ‘문배(門排)’라고 하며 재앙을 막는 벽사(辟邪)의 기능을 한다.
정 교장은 “궁중의 세화 풍속이 민간에 퍼지면서 조선 후기 민화가 발달하게 하는 기폭제가 됐다”며 “하지만 민간의 풍속도 궁중 문배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미 통일신라 시대 집집마다 대문에 용왕의 아들 처용(處容)의 얼굴 그림을 붙여 역병의 신을 쫓았다는 『삼국유사』 기록이 있다.
조선 민화 기폭제 된 ‘세화 풍속’

또한 “세화의 기능은 본래 벽사였다가 복을 부르는 길상(吉祥) 기능을 더하며 다양한 주제를 취하게 되었다”고 정 교장은 설명했다. 궁중 세화의 가장 오래된 자취는 ‘고려 말 이색이 몸이 아파 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십장생도(十長生圖)를 꺼내 보며 장수를 기원하고 성은에 감사했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물·소나무·학·거북 등을 묘사한 십장생도는 장수를 기원하는 그림이다.
십장생도는 오늘날에도 연하장 단골 그림이다. “사실 예전의 세화가 바로 연하장이었다. 왕이 도화서를 시켜 수백 장 대량 생산 하도록 했다”고 정 교장은 설명했다.

세화의 또 다른 인기 테마는 모란이었다. 북송 시대 유학자 주돈이는 “모란은 꽃 중에서 부귀한 자이다”라고 했다. 그 뒤로 모란은 언제나 부귀의 상징으로, 그림은 물론 도자기와 옷의 단골 문양이 되었다. “그림을 통해 행복을 기원하는 것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정 교장은 설명했다. 수박·석류·포도 등의 그림은 자손이 많음을, 맨드라미·책·잉어 등의 그림은 출세를 기원한다.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은 해마다 설이 되면 고운 비단 바탕에 모란·십장생·석류 등을 수놓은 복주머니를 선물했다. “정월의 첫 해일(亥日)이나 첫 자일(子日)에 복주머니를 차면 일년 내내 좋지 않은 기운을 쫓고 만복이 온다고 하여 이날 친척이나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풍습이 성행하였다.”(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러나 오늘날 복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그림이나 물건을 통해 복을 기원하는 풍습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MZ세대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무속인과 상담을 하고 인공지능 챗GPT에게 사주팔자를 물어보는 요즘, ‘풍수 인테리어’ 관련 콘텐트도 성행하고 있다. 이런 콘텐트에서 ‘재물과 행운을 부르는 그림’으로 추천하는 것은 주로 해바라기·모란·사과·폭포 등의 그림이다. 이중 모란은 동아시아 전통을 이은 소재이지만 다른 소재는 생소하다.

“아마도 ‘복을 부르는 그림’으로서의 사과 그림은 윤병락 작가의 그림이 원조일 것”이라는 게 김윤섭 아이프 미술경영연구소장의 말이다. 사과의 고장 경북 영천의 과수원 집 아들로 태어난 윤 작가는 지난 20여년 동안 독특한 스타일의 사과 그림을 그려 ‘사과 화가’로 자리매김했다. 궤짝에 담긴 탐스러운 사과 무더기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실물보다 크게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리는 스타일이다. 김 소장은 2022년 작가의 아카이브 전시를 기획한 바 있다.
김 소장은 “윤 작가가 노화랑에서 개인전을 할 때 화랑에서 ‘햇살을 머금은 잘 익은 사과가 우리 인생의 완성과 가정의 복과 연결된다’는 컨셉트로 연출을 했고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어필했다”며 “그전에도 사과는 정물화의 단골 소재였지만 그 뒤로 윤 작가처럼 사과를 클로즈업해서 그리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를 모방한 제3시장 그림, 소위 ‘이발소 그림’들도 대거 등장했다”고 했다. 김 소장의 말대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 상가에는 윤 작가의 그림을 모방한 그림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21세기 복은 ‘돈에 대한 욕망’ 일관

‘풍수 인테리어’에 단골로 언급되는, 또 다른 ‘복을 부르는 물건’은 ‘달항아리’다. 조선 후기에 출현한 백자 달항아리는 21세기 들어서 ‘한국 미(美)의 정수’로서 각광 받고 있다. 그런데 달항아리에 붙는 찬사인 “신(新)유학의 이상인 청빈의 구현”(런던 영국박물관), “마음을 비운 무욕의 아름다움”(사진작가 구본창)과 달리 “그 풍만한 형태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는 속설로 달항아리 작품을 사는 사람도 많은 게 사실”이라는 게 익명을 요구한 한 아트딜러의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 컬렉터도 조선시대 달항아리는 워낙 구하기 힘드니 권대섭 같은 이름난 현대 도예가의 달항아리를 산다. 또 최영욱 같은 중견 화가들의 달항아리 그림을 산다. 좀 더 주머니 가벼운 사람들은 달항아리 판화나 프린트를 구입한다.”

그리고 더욱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을 위해 저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는 2023년에 “복을 선물하세요”라는 광고와 함께 2000~5000원에 이르는 ‘복을 담은 달항아리’ 6종을 출시했다. 지난 14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점 다이소에는 “복을 부르는 상품”이라는 푯말 아래 달항아리에 해바라기 조화가 꽂혀 진열되어 있었다.

이렇듯 이미지를 통해 복을 기원하는 풍습은 21세기 한국에서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아쉬운 점은 21세기의 복은 철저히 ‘재물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민화학교 정 교장은 “민화가 기원한 행복에는 부부금슬 등 사랑도 있어서 대담하고 해학적으로 애욕을 표현한 그림들이 많다”고 했다. 반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목격한 것은 반짝이가 박힌 황금색 해바라기 그림부터 금색 찬란한 ‘돈나무 그림’에 이르기까지 돈에 대한 간절한 욕망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이것이 ‘21세기 버전 기복 민화’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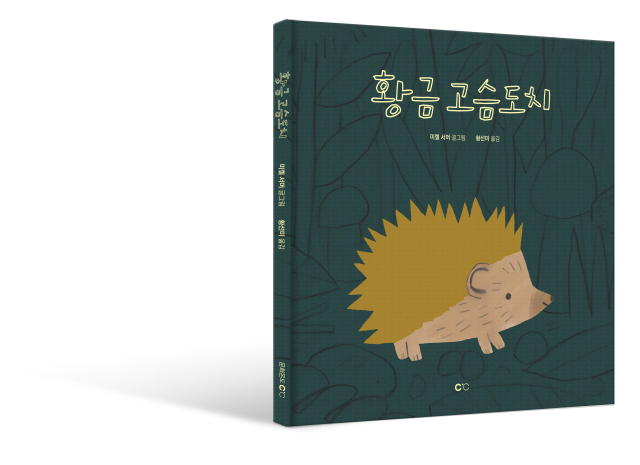




![[르포] "어서와, 소원 성취 팝업은 처음이지"…해외 '빙그레 메로나' 맛보기는 '덤'](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147640778_a7668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