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이 국내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 외국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더러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하지만, 5년 전만 하더라도 다들 AI가 국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당시 AI는 한 페이지 분량의 문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말은 눈이 몇 개인가”라는 상식적 질문에 “4개”라는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했다. 그래서 혹자는 AI를 그저 “확률적 앵무새”라 폄하하기도 했다. AI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인간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고작 5년이 흘렀다. 격세지감이 크다. 이러한 발전 속도가 이어진다면, 수년 내로 AI가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대등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일반지능’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하지만 AI의 미래를 바라볼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지금까지의 AI 발전이 꼭 우리가 예상해 온 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예술·학술 분야 AI 침범 활발
몸 쓰는 작업은 아직 못 따라와
인간에 쉬운 일 어려워 할 수도
긴 관점에서 AI 위치 살펴야

AI 발전이 본격화되기 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상상해 왔다. 블루칼라 육체노동이 가장 먼저 자동화된 다음, 화이트칼라 지식노동이 자동화될 것이다. 예술이나 학문과 같은 창작적 작업은 자동화가 불가능하거나 가장 더딜 것이다.
그러나 정작 AI 발전은 정반대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지금 AI가 눈에 띄게 활용되는 영역 중 하나는 예술 창작이나 학술 연구이다. 이제 AI는 화이트칼라 노동의 상당 부분까지 자동화하고 있다. 반대로 AI가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AI 발전은 왜 이렇게 거꾸로 된 순서로 이루어질까. 이 문제에 답하는 한 가지 흥미로운 방법은 그 능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화해 왔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세상을 지각하고 근육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지능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다들 갖고 있다. 고생물학에 따르면 이러한 능력은 5억 년도 더 전부터 발전해 왔다고 한다. 몸을 쓰는 일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것이다. 수억 년에 걸친 감각과 운동 능력이 진화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AI로 구현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
화이트칼라의 지식노동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협력하는 데 필요한 일이다. 계획을 세우고, 상호 협상하고, 집단적 지식을 축적하는 등 고차원적 능력이 필요하다. 인류가 이러한 지능을 발전시켜 온 것은 현생 인류 등장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어림잡아 수백만 년에 이를 것이다. 지금 AI의 발전은 바로 이 단계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그러면 예술과 학술 활동은 어떠한가. 인류가 상징적 사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마도 수만 년 전, 길어야 십수만 년 전부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자와 기록을 활용해 체계적 학문을 시작한 것은 고작 수천 년에 불과하다. 다른 능력과 비교할 때 예술이나 학문은 훨씬 짧은 기간 동안 발전해 왔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AI가 발전해 온 순서가 수긍이 간다. 우리는 은연중에 다른 동물과 달리 인류만이 보유한 지능, 즉 예술적·학문적 능력이 가장 우월한 것이라 여겨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능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발전해 왔을 뿐이다. 그래서 AI로 가장 먼저 모방·생성하기에 쉬운 영역이었을 수 있다.
AI 미래 전망에 있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인간과 AI를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인간은 몸을 쓰는 일을 자연스럽게 해내지만, 예술이나 학문적 능력은 따로 어렵게 배워야 한다. 하지만 AI는 그 반대이다.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AI에는 쉬울 수 있고, 인간에게 쉬운 일이 AI에는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두고 ‘모라벡의 역설’이라 부른다.
법률 AI가 변호사 시험 합격점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다른 분야에서 AI가 인간 수준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것이다. 인간은 수년간 훈련을 거쳐야 겨우 해낼 수 있는 일을, AI는 어느 날 갑자기 척척 해내는 듯 보일 수도 있다. 그럴수록 AI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금방이라도 인간을 뛰어넘을 것만 같은 불안감이 퍼져갈 것이다. 하지만 모라벡의 역설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공포는 실제보다 과장된 것일 수 있다.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넓게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거대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지능은 감각과 운동, 협력과 언어, 상징과 추상, 그리고 예술적 상상력까지 수억 년에 걸쳐 층층이 쌓아 올린 진화의 산물이다. 그리고 지금의 AI는 그 복잡한 지능의 문턱을 이제 막 넘어서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러니 AI를 둘러싼 과도한 공포나 경계는 잠시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 AI의 위치와 가능성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자세가 중요한 때다.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생성형 AI 넘어선 ‘물리적 AI’ 시대 온다… AI 로봇이 현실로 [트랜D]](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e0e8f60b-c69e-4992-9792-a27f039af255.jpg)
![[김위근의 언론 돞아보기] AI 활용 언론사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3077148075_27ce56.jpg)
![젠슨황, 두 달만에 무릎 꿇렸다…“치매도 고친다” 양자컴 진격 [양자 충돌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1/c3c140f8-c610-4f43-a3af-f5600833355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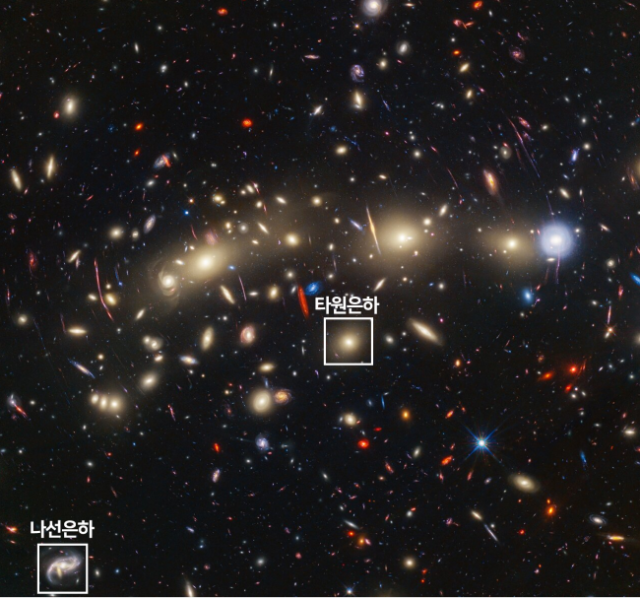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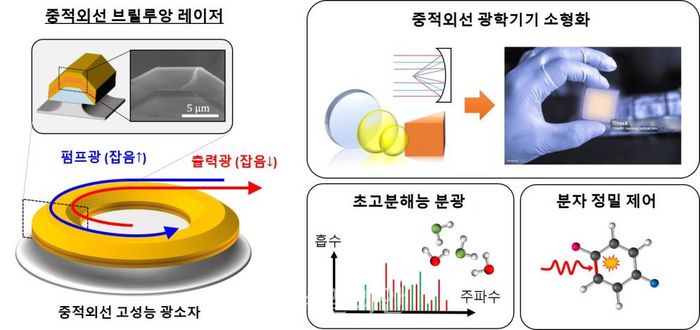
![[헬로BOT] 로봇 가동에 ‘생명력’ 불어넣다...ADI가 추구하는 로보틱스 혁신법](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0314/art_17433844194867_3b2e6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