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남자가 거리를 걷다 인터뷰한다. “내 이름은 존 배티스트. 당신을 모르더라도 당신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해야 하는 모습일 테니까요.” 세상 물정 모른다고, 너무 순진한 발언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남자는 진짜로 그렇게 한다. 그에게 뮤지션의 의무란 음악으로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다.
존 배티스트(사진)의 성취는 찬란하다. 2022년 <위 아(We Are)>로 그래미 올해의 앨범을 거머쥐었고, 애니메이션 <소울>로 2021년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다. 직접 출연한 다큐멘터리 <아메리칸 심포니>로는 2024년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는 교향곡이 클래식 진영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도발적으로 묻는다. 고향 뉴올리언스에서 익힌 거리의 대중음악과 전당의 고전음악 모두 미국의 교향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흑인 창작자에 대한 고정관념에 묶이거나 카테고리화되는 게 싫어요.” 카테고리의 어원은 그리스어 ‘카테고리아’다. ‘공개적으로 죄를 묻는다’라는 뜻이다.
어떤 영역에서든 인간은 카테고리를 나누려는 경향이 있다. 역사를 봐도 오직 피아(彼我)의 카테고리로만 세계를 파악하려 했던 자들이 초래한 비극이 넘쳐난다. 그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의 교향곡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클래식, 포크, 재즈 등 모든 장르가 어우러질 공간이야말로 바로 미국이에요.” 비단 미국만은 아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성별, 인종, 국가 등의 카테고리를 뛰어넘어 사랑하자고 노래한다. 분열된 세상에 공동체 정신을 불어넣으려는 그의 대표곡 ‘위 아(We Are)’가 증명한다.
존 배티스트는 신곡 ‘린 온 마이 러브(Lean On My Love)’에서도 존재론적 너그러움으로 듣는 이를 품에 안는다. 그렇다. 소셜미디어 대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 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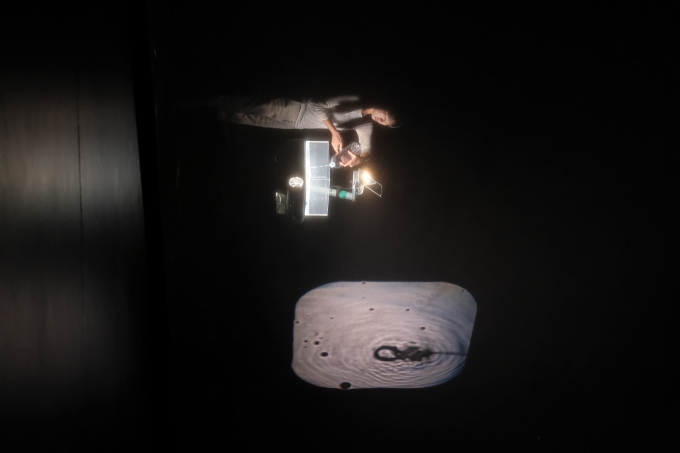





![‘단군 이래 최고의 성취’부터 ‘심각 넘어서 처참’까지 최휘영 장관이 본 문화 현실은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https://newsimg.sedaily.com/2025/09/06/2GXSRN0F8P_5.jpg)

![[새 아침을 여는 시] 나이-김영진](https://cdn.jjan.kr/data2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