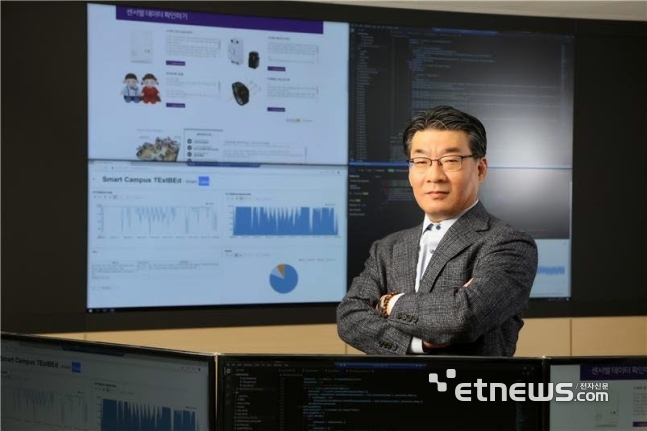
인공지능(AI) 기술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왔다. AI 기술은 전 산업계에 혁신과 효율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부메랑은 던졌던 이들, 즉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되돌아와서 '황금기'라는 빛나는 기회와 '취업난'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동시에 가져다 줬다.
알파고에 이어 생성형 AI의 등장은 인류의 미래를 AI가 좌우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컴퓨터공학과로 몰려들었다. 정부와 대학은 이에 화답하듯 정원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졸업생들의 심각한 취업난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이른 바 '성공의 역설'이다. 그런데, '역설'이란 결코 의외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지개를 좇는 데만 집중하느라고 중용(中庸)에서 말하는 시중(時中),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때'와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하고 조화로운 '중'의 지점을 찾아 실천하는 것을 외면했음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기술의 유행, 산업의 성쇠, 심지어 직업까지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한다. 이를 불교에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판타 레이(panta rhei)'라며 모든 것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도 했다. 일견, 우리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대처를 함에 매우 민첩했다. 다만, 더 광대하고 심오한 진리를 놓쳤다. '제법무아(諸法無我)',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의 '나(我)'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연기(緣起)'의 원리에 따라 외부의 모든 변화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 컴퓨터에 관련된 직업과 직무도 포함된다. AI 기술로 인해 다른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정작 이런 모든 변화의 원인(原因)인 컴퓨터 분야에서의 직업과 직무의 변화만은 독립변수로 설정했었던 결과가 지금과 같은 취업난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취업난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 년 후에는 컴퓨터 분야 전문인력의 공동화(空洞化)로 나타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정보기술(IT)에 기반하여 성과를 보여 왔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위기 상황을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 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젊은 인재들이 모두 사라졌는가?
우리의 대학들을 보라. 우리 사회는 '전문인력'이라는 변수를 독립적 존재로 정치(定置)시킴으로써, 한 국가 전문인력 양성의 본산인 대학을 수도 없는 제약(制約) 속에 가두어버렸다. 이렇게 가두어진 채 손과 발이 묶여 있는 대학들이 어찌 이토록 유능한 젊은이들을 조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 기업들의 외면 속에 인력양성에 대한 책무를 오롯이 떠안은 채, 우수한 교수진, 교육환경, 교육과정 등을 갈구하면서 그저 빈 지갑만 뒤적이고 있다. 머지않아 대학들은 캠퍼스의 높은 곳에 게양하기 위한 흰 깃발을 준비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인력양성 파이프라인을 면밀하게 정비해서 AI 대전환이라는 호랑이 등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AI 3대 강국'이라는 꿈은 '대학 3대 강국'과 '기업 3대 강국'을 최우선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나브로 'AI 3대 강국'이 되어 있을 것이며, 이후 지속가능성도 보장될 것이다.
'성공의 역설'은 첫 번째로 겪는 커다란 시험대에 불과하다. 시련을 통해서만 더욱 강한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 다만,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변화를 기회 삼아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용기야 말로 진정한 지혜다.
이강우 동국대 컴퓨터AI학부 교수 klee@dongguk.edu



![[헬로즈업] “현대화 없이는 성장 없다” 몽고DB, AI 시대 핵심 과제 제시](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0936/art_17569556814853_6042b0.jpg?iqs=0.9944603658138867)
![위대한 경제학자 6인, 불평등의 렌즈로 들여다본 경제사상의 역사[BOOK]](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09c3ca9a-f635-42aa-b619-12f3a52009aa.jpg)


![[GAM]사이버보안 게임체인저 센티넬원 ① 싱귤래리티 강점은](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