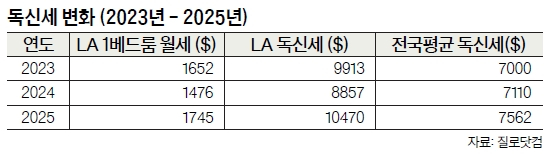건설사들 잇따라 시니어 타운 사업 뛰어들어
돌봄 친화 서비스, 사회적 교류 제공 등이 관건

최근 몇 년 사이 ‘시니어 타운’이 건설사들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고령화로 시장성이 높아졌다 판단해 앞다퉈 나서고 있지만 노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돌봄과 간병 서비스, 사회적 교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한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니어 주택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부터 검토에 들어가 서울 은평구에 아동·노인복지시설인 ‘은평 시니어레지던스’ 사업을 시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롯데그룹도 신성장 전략으로 고급형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VL’을 런칭해 올해 서울에 ‘VL 르웨스트’, 부산에 ‘VL 라우어’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역시 데이케어센터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건설사들이 시니어 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건 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 노인 수는 2023년 기준 1만9369명(보건복지부)에 그쳤다. 1000만명이 넘는 전체 노인 인구의 0.1% 수준이다. 고령화로 노인의 생활방식을 반영한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시니어 주택 사업이 앞으론 기업화·대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니어 주택 사업이 노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돌봄이나 간병 서비스, 사회적 교류 없이 단순히 시설만 ‘좋은 공간’만 제공해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니어주택의 노인특화형 의료 서비스 내실을 따져보면 식사 제공이나 혈압 체크 등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75세 이상이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퇴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곳들도 상당수다. 건강한 노인 입장에선 또 굳이 집을 떠나 시설에 입주할 유인이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유지될 경우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은 전체의 87.2%에 달했다.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은 4.7%에 그쳤다.
2000년대 초반 우후죽순 생겼던 분양형 실버타운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설사들이 건물을 짓고 분양을 통해 수익을 회수하는 데만 집중했을 뿐 운영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는 결국 ‘방치’ 논란을 불러왔다.
강효진 케어닥 시니어하우징 디자인연구소장은 “많은 기업이 구매력있는 액티브 시니어를 보고 시니어 주택 사업에 뛰어들지만, 정작 휠체어 친화적 설계나 돌봄 서비스 강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DNA] 청약 A to Z ③ 가점 vs 추첨 어떤 게 유리할까](https://www.fetv.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0971767389_2162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