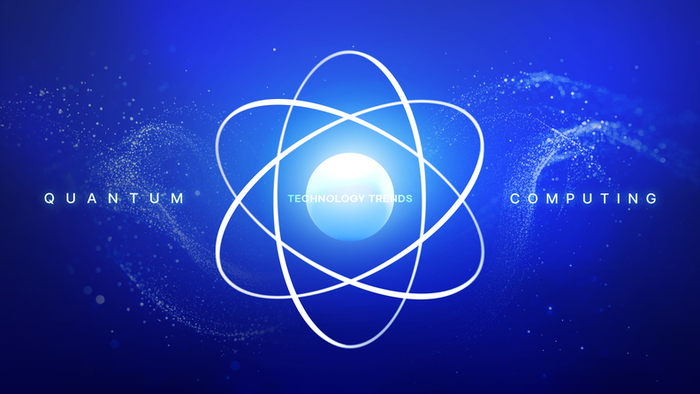국방부가 북한의 드론 위협 등에 대비해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젝트를 띄웠지만, 국내 산업 기반 미비와 예산 확보 문제로 내년부터 중국산 상용 드론 1만여대가 군 부대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드론의 핵심 부품인 영상 데이터 송수신 모듈(데이터 트랜시버)은 국내 생산이 전무한 상태로, 악성코드 감염이나 해킹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비해 야전부대의 드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재 드론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의 드론 여단 외에 전술 제대에 드론 부대가 없다"며 "50만 드론전사를 양성해서 더 깊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프로젝트는 1인칭시점(FPV) 소형드론을 전 부대에 보급한다는 국방부의 구상이다. 저가·소모형 FPV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가성비 무기'로 떠올랐다. 북한도 드론 부대를 별도로 양성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소형드론을 전 장병에게 숙달시키겠다는 게 군의 계획이다.
국방부가 국방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내년부터 교육훈련용 상용 드론 1만 118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드론 구매에만 190억 1300여만원(전문 교관 양성비 포함시 20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지작사 예하 부대(7396대)를 포함 제2작전사(602대)·수도방위사(208대)·특전사(588대)·미사일사(21대) 등 육군의 전 야전부대와 교육 기관에 분대당 1대 이상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약 6만대를 투입하고, 해·공군 부대에도 순차 보급한다.
전직 군 관계자들과 업계에 따르면 FPV 드론은 저렴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드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문제는 "국내 상용 드론 시장의 90%가 중국산"(국방부 답변 자료)이란 점이다.
여기다 내년 예산에 맞추려면 대당 단가를 170만원에 끊어야 한다. 드론 산업 양성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국산화 드론 13종의 부품 가운데 비행제어기(FC)만 국내 제품을 쓸 수 있는 수준이다. 배터리·모터제어기(ESC)·조종기·위성항법장치(GPS)·광학 카메라 등 12종은 중국산으로 채워야 한다. 안 장관도 국감에서 "현재 예산은 중국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국산 부품을 최대한 늘린 드론(부품 13종 중 12종 국산화)은 대당 최소 294만원(국토부 추산), 총 33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기준 146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드론 기체에서 촬영하는 영상을 조종기에 전달하는 핵심 장비인 데이터 트랜시버는 현재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전무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트랜시버는 영상디지털송신장치(VTX)·안테나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백도어(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악성코드)’ 등 보안 위해 요소가 발생하면 군사 기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각 부대는 스마트폰 반입 시에도 카메라·녹음 등 주요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깔도록 할 정도로 철저한 보안을 중시한다. 또 부대 특성에 따라 오산공군기지와 같이 미군과 사실상 기지를 같이 쓰는 부대도 있다.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에 민감한 미군 측의 반발을 부를 여지도 있는 셈이다.
국방부는 “트랜시버의 경우 국토부 주도로 3년 내에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6년도 사업에선 해당 부품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한 뒤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해킹 등에 취약한 데이터 저장 방식이 아닌 실시간 스트리밍만 가능한 트랜시버를 써서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맞더라도 아직 국내 업계의 준비가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문발차’식으로 중국산 드론을 부대에 대거 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와 관련, 안규백 장관은 국감에서 “국내 산업은 바닥 수준”이라면서도 “국방부가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한미군 임무는 대북 억제…중국 임무 동의 안 해"
한편 이날 국감에선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대중 견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주한미군 전력 증강과 관련한 질의에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제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한미군의 임무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하는 것"이란 미군 관계자 발언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과 바꿀 수 있다면 무리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안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앞서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 "오로지 산업 경제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