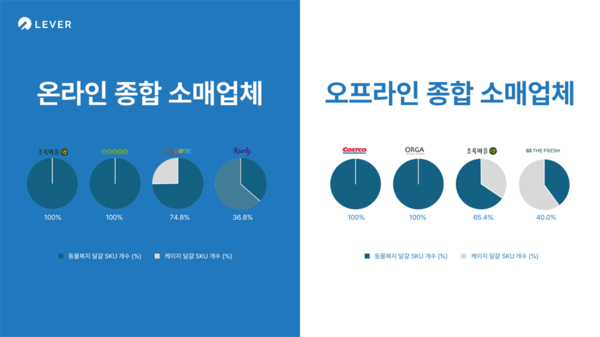지난달 경남 창원 지역에 문을 연 A 식자재마트는 오픈 기념 행사로 이달 초까지 계란 한판(30구)을 3580원에 팔았다. 정상가 7980원짜리 특란과 대란을 반값에 하루 2000판 한정 판매한 것인데, 입소문을 타고 소비자가 줄을 섰다. 40대 주부 김모씨는 "전단지에서 가격을 보고 바로 사러 갔다”라며 “오픈 특가로 저렴하게 파는 삼겹살, 과일, 과자 등도 함께 샀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 식자재마트가 새로운 유통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식자재마트는 식당, 카페, 급식소 등 기업간거래(B2B) 위주로 업소용 식자재를 대량으로 파는 곳을 말한다. 주 고객은 자영업자이지만 식재료와 생활용품 등을 싸게 살 수 있어 일반 소비자까지 대거 빨아들이고 있다.
계란, 콩나물, 육류 등 특정 제품을 40~50%씩 싸게 초저가로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는 곳이 많다. 식자재마트가 이처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대부분 중앙 물류를 거치지 않는 산지 직매입 방식이라서다. 운송비 등을 절감하고 당일 현금 구매로 가격을 낮춘다. 마진을 낮게 가져가는 박리다매식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식자재마트 사업체는 1803개로 추산된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점포 수가 지난해 말 기준 368개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수준이다. 최근 불황 속 오프라인 유통업이 고전하는 가운데에서도 장보고식자재마트, 세계로마트, 식자재왕도매마트 등 '빅3' 식자재마트의 2023년 매출은 1조원을 돌파,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기간 마트 3사의 매출은 6.5% 증가했다.
식자재마트의 급성장으로 최근 파열음도 일고 있다. 일부 식자재마트가 할인 행사를 위해 원가 이하의 납품을 강요하는 후려치기 관행이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지역 한 식자재마트에 계란을 2년간 납품한 계란유통상인은 “5000원 정도 받아야 하는 계란을 3600원에 납품하게 하고 마트는 카드 수수료 명목의 마진을 일부 붙여 3980원에 팔았다”라며 “1억 넘게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했다. 이 상인은 “납품처를 갑자기 바꾸기 어렵고 계란은 오래 보관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콩나물, 쌀 등을 납품하는 상인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식자재마트가 대형마트와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매출액과 매장 면적이 법에서 정의하는 기준에 못 미치다 보니 대형유통업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의무로 하는 표준계약서 작성이나 의무휴업 지정, 영업시간 제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 틈에 초저가 마케팅으로 인근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몸집을 불려올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근 야당 중심으로 대형마트 규제 관련 강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식자재마트도 법 테두리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자재마트 측은 일반 고객들도 이용하지만 업소 고객이 많은 만큼,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 관계자는 “전통적인 식자재 취급 매장은 식당 고객 구매 비중이 50% 전후로 높게 나타난다”라며 “외식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식자재 구매 선택 기회가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미국 ‘레스토랑 디포’와 유럽 ‘메트로’ 등 자영업자가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식자재마트를 전문화·대형화하는 추세”라며 “일부 불공정 거래가 있다면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하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왜 이렇게 싸?"…구름 인파 몰린 미래형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가보니 [르포]](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1UVDIK_6.jpg)

![[팩플] 컬리 손잡은 네이버…신선식품 보강해 쿠팡 추격](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6a74b603-b0b8-4747-9dfd-a34f1f32d0f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