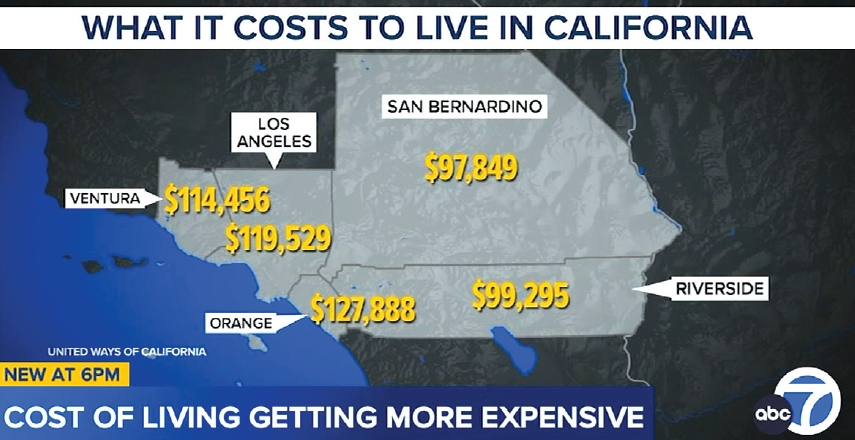최근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며칠째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목소리에서는 제법 연륜이 느껴지는 어르신이었다. 질문은 짧고도 명확했다. “메디칼이 있는데 장례를 해 줘요?”
순간 당혹감과 함께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메디칼(연방 메디케이드의 가주 정부 프로그램명)’이라는 정부 의료지원 프로그램이 장례 비용까지 책임지는가? 이민 와서 사는 어르신들의 장례 문제를 왜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노후 생활은 물론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메디칼 혜택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제외된 한인들의 억울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민 초창기부터 ‘코메리칸’으로서 고된 낮과 밤을 견디며 수십 년간 우체국, 공장, 혹은 적은 임금의 직장에서 일했던 많은 한인들은 대부분 격주로 빠듯한 급여를 받았다.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에서 사회보장세까지 떼고 나면 생활은 더욱 팍팍했다. 그 돈으로 렌트 내고 자동차 할부금을 갚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이제 은퇴하여 받는 사회보장 연금은 여전히 빠듯한 수준이지만, 서류상 ‘중산층’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폭넓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 나라에서 오랜 세월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낸 이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최근 이민 와서 일한 기록이나 사회보장세 납부 기록이 없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메디칼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리는 이들을 보며 쓰린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는 토로를 종종 듣는다.
미국의 정치사는 곧 이민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의 복지 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1964년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빈곤 없는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대대적인 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존슨 대통령은 취임 후 수백 가지의 대통령 직권 명령을 내렸는데, 그중 핵심적인 것이 바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건강 의료보험 제도였다. 미국 경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은 공장에서 일하며 회사 단체 보험으로 의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65세에 은퇴하면 의료비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이나 가족에게 돌아갔다.
이에 노인 복지를 위한 국가적인 의료보험, 즉 메디케어가 탄생했다. 동시에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과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국가 지원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도 함께 도입되었다.
교사 출신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가난한 학생들이 식사조차 거르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극빈자 대상 푸드스탬프 제도도 이때 시작되었다. 흑인 아동의 백인 학교 입학 허용 등 교육 제도가 정비되었고, 전 국민의 투표권 보장 제도가 강화되었다.
이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백인 중심이었던 이민법도 개정되었다. 존슨 대통령은 영국과 서유럽 국가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타민족 이민을 억제했던 국가별 이민 쿼터 제도(1924년 이민법)를 폐지하고, 가족 초청 및 전문 인력 중심의 이민(1965년 이민 및 국적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완화했다. 이 역사적인 정책 덕분에 우리 한국인들이 1970년대 초부터 미국으로 대규모 이민을 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메디케이드는 이처럼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추구했던 ‘위대한 사회’ 정책, 즉 대대로 소외되어 그늘진 곳에서 살아온 흑인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던 미국 시민들을 구제하고, 가난과 궁핍을 물리치며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 나라에 느즈막히 이민 와서 일하지 않고 인생 후반을 보내면서 당연하다는 듯 받고 있는 혜택을 넘어 본인의 장례까지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을까 기웃거리는 일부 한인들의 발상이 불편하고 안타깝다.
이효섭 / 동서장례 대표


![[기획] 시장 중심 의료, 미국 공공의료 도전과 변화](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501/p1065579160485216_187_thum.jpg)